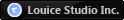일기를 뒤져보니 이사온 지도 4개월.
아침 6시. 산 중턱, 풀 많은 이곳, 풀벌레와 날짐승이 울어대고, 길가에 앉아, 서로 안부를 묻거나, 그저 조용히 부채질 하는 늙은이들. 굽은 허리로 매일 언덕을 오르내리는 늙은 부부. 홀로 목발을 짚고, 단지 오르내리기 위해 밖을 나선 듯한 할아버지. 아침 미사를 마치고 우르르 몰려 나오는 할머니들. 쓰레기를 줍는 공공근로자분들. 근면한 여고생. 주인을 잃은 개들과, 애초에 주인이 없었던 길고양이들. 편의점은 하나도 없는데 지나칠 정도로 많은 슈퍼마켓. 저녁이면 세탁소 옆에서 매일 술을 마시는 같은 얼굴의 아저씨들. 한창 공사중인 동네 놀이터. 홀로 목발을 짚고, 단지 오르내리기 위해 밖을 나선 듯한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23시면 어김없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만 무슨 노래인지 알 수 없는, 아코디언을 켜는 앞집 할아버지. 초록눈의 고양이는 말없이 나를 피해 마당 수풀 속으로 도망가고, 붕붕이가 꼬리를 흔들며 울어대면.
라면 다섯 개들이 한 개 커피 스무 개들이 한 통 감자칩 한 봉 육포 세 봉들이 한 개 맥주 한 캔. 슈퍼마켓을 뱅뱅 돌다가 도무지 무얼 먹어야 할지 몰라 들고 나온 것들. 라면 한 개 감자칩 한 봉 육포 한 봉 맥주 반 캔 먹고 잠들었다. 목덜미가 너무 쑤셔와 머리까지 깨지는 것 같아서. 쉬는 날이면 곤혹스럽다. 쉬는 날이 길수록 더욱 곤혹스럽다. 온몸에 긴장이 풀리면서 몸살이 몰려 오고 배는 고픈데 먹고 싶은 건 하나도 없고 붕붕이를 안고 누우면 그대로 빠져드는 깊은 잠.
시간은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 사람도 너무 쉽게 변한다.
시간도, 사람도, 두려워. 믿을 수가 없어.
TAGS 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