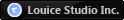소녀여. 비가 갠 날은 왜 이리도 푸른가. 어디서 쉬는 숨소리기에 이다지도 똑똑히 들리이는가.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나는 이리도 살고 싶은가. ㅡ 서정주,『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나는 이리도 살고 싶은가』부분 |
45 Articles, Search Results for 'Other Scraps/Arts'
- 2011/04/15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나는 이리도 살고 싶은가 (2)
- 2009/03/30 죽음의 무도 Danse Macabre
- 2008/05/01 김수영 시인 미발표詩 무더기 발굴 (1)
- 2008/02/20 Canon (Johann Pachelbel), 천세빛 (2)
- 2008/02/11 Love theme from the Godfather
- 2008/01/22 한국문학의 깃대종 기형도, 김소진의 요절 (2)
- 2007/11/22 사랑과 슬픔의 볼레로
- 2007/11/20 우울증의 원인
- 2007/11/19 하늘나라에 있는 기형도에게
- 2007/11/19 죽어서 전설이 된 시인 기형도 부활하다
- 2007/09/26 대한매일 신춘문예 평론 당선작/경악의 얼굴-기형도론/이성혁
- 2007/09/25 계간 [시인세계]의 기획특집 <시인의 요절과 마지막 시>
- 2007/07/29 호적예규개정
- 2007/06/30 문예기행2] 문학과 예술의 기원을 찾아서
- 2007/06/30 문예기행3] 그리스 비극, 산양의 노래 (2)
- 2007/06/30 문예기행4] 오이디푸스, 운명(Moira)와 미덕(Arete)사이에서
- 2007/06/30 문예기행5]왜 플라톤은 국가에서 시인을 추방하려고 했는가?
- 2007/06/30 후기 낭만주의, 제국주의의 악몽 -프랑켄슈타인
- 2007/06/30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 2007/06/21 ‘만듦으로/만드므로/만들므로’
- 2007/06/14 지젝과 함께 라캉을 읽는 방법
- 2007/06/14 프로이트라는 욕망의 대상 : 알튀세르에서 크리스테바까지 - 민승기
- 2007/06/14 라캉식의 라캉 읽기 - 김종주
- 2007/05/17 애절양(哀絶陽)
- 2007/04/17 [동서양사상비교] 데리다와 장자의 글쓰기
- 2007/04/09 시조(時調)와 시조 창사(唱詞)
- 2007/04/08 갑민가
- 2007/04/07 Z에 기고한 촘스키의 글
- 2007/04/07 [21세기 새로운 이론과 사상] 자크 라캉의 정신분석학
- 2007/04/07 [문화 프리즘] 한국문학에 나타난 동성애
| 김수영 시인 미발표詩 무더기 발굴 |
|
올해로 40주기를 맞는 '풀'과 '폭포'의 시인 김수영(1921~1968)의 미발표 시들이 무더기로 발굴됐다. 1일 창비와 문학계 등에 따르면 김 시인이 생전에 쓴 15편 안팎의 시들이 계간 '창작과비평' 여름호를 통해 처음 공개된다. 이 시들은 김 시인의 미망인 김현경 씨가 육필 원고 형태로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완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시도 1-2편 포함돼 있다. 이번에 발견된 시 중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이념적인 색채 때문에 당시 정치 상황에서 발표할 매체를 찾지 못한 시들도 있고 성(性) 담론을 다룬 시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비 여름호에서 시의 해제를 맡은 문학평론가 김명인 인하대 교수는 "남긴 작품이 많지 않은 김수영 시인의 시들이 한꺼번에 발견된 데다 의미있는 작품들도 많아 무척 뜻깊다"고 말했다. 1960년대 이후 한국 시단에 큰 영향력을 끼친 김수영 시인은 작품활동 초기 개인과 모더니티 탐구에 주력하다 후기에는 현실 비판의식과 저항정신을 바탕으로 한 참여시를 주로 썼다. 그는 1968년 교통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47년의 길지 않은 생애 동안 마지막 시 '풀'까지 총 170여편의 시와 80여편의 산문 등을 남겼다. 2005년에는 방민호 서울대 교수가 김 시인이 1950년에 발표한 초기시 '음악'을 발굴하기도 했다. 김수영 평전을 쓴 최하림 시인은 "김수영 시인의 알려지지 않은 작품 여러편이 한꺼번에 발굴된 것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유족들이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경위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6월 김 시인의 40주기에 맞춰 민음사가 김수영 오마주 시집과 김수영 육필 원고로 된 시집을 발간하고 유족들이 시인이 남긴 원고와 사진 등을 전시하는 등 다양한 추모 행사가 예정돼 있다. |
| [문화] 입력시간 : 2008.05.01 (07:41) |
가야금 연주
Love theme from the Godfather (Nino Rota), Andre Rieu
|
우리문학의 순간들 |
|
한국문학의 깃대종 기형도, 김소진의 요절 글 |이경철_랜덤하우스코리아 주간, 문학과문화를사랑하는모임 부이사장. 1955년생. 자연 환경의 보존이나 복원의 정도를 살필 수 있는 지표가 되는 동식물을 가리키는 ‘깃대종’이란 환경용어가 있다. 반딧불이가 어둠 속 나는 것을 보고 그 심심산간은 청정지역임을 알 수 있고, 하수구 같았던 하천에 붕어 따라 피라미가 돌아온 것을 보고 그 하천은 이제 자연의 강으로 정화됐음을 알 수 있다. 달려가 보니 당하고 있던 그 사내는 다름 아닌 박상천 시인이었다. 당시 박 시인은 시인협회 일을 맞아 열심히 순수시단 활동을 펼치고 있어 문단에 두루 안목이 있을 텐데 ‘기관원’으로 오인돼 몰매를 맞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람은 시인 아무개’라며 아무리 떼어놓고 말리려 해도 몰매질은 몇 분간 계속됐다.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 창밖을 떠돌던 겨울안개들아 /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빈집」 전문) 죽음을 예감했음인지 기 시인은 밤, 겨울안개, 촛불, 흰 종이, 눈물, 열망 등 자신의 익숙한 시적 이미지들에 이별을 고한다. 처절하리만큼 냉혹한 자기성찰로 비인간적 산업사회에서 인간성의 깊이를 지켜내던 기 시인을 떠나보내고 90년대 젊은 시단은 문학적 양심의 가책도 없이 상업주의에 함몰돼 갔다. 민주화도 눈에 띨 정도로 진척되고 경제도 95년 1만 불 시대로 나아가던 1990대에 접어들자 신예작가들이 ‘이제 글만 써도 먹고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에 직장도 팽개치고 하나 둘씩 전업작가의 길로 들어섰고 김 씨 또한 그러했다. 본격소설의 위엄을 지키며 한국소설의 대들보로 떠오르던 김 씨는 선배 전업작가의 창작욕을 부추겼을 뿐 아니라 돈 등에 딴눈 팔지 말고 본격소설을 지키게 하는 하나의 항체로 작용했을 것이다.
|
JB's Invitation to the Classical Fantasy
사랑과 슬픔의 볼레로
보들레르의 산문시집 "파리의 우울"은 필자가 학교 다니던 시절, 문학도 사이에서 꽤나 인기가 있었다. 몇몇 문학하는 친구들은 그 시집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며 온갖 개폼을 다 잡았다. 카알라일이 "우울한 과학(dismal science)"이라고 명명한, 문학적 색채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건조하고 재미없는 경제학을 전공하던 우리들은 그들의 개폼을 점잖게 비난했다. 지나친 지적知的유희요, 감성의 낭비라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때의 우리들도 참 웃기는 구석이 많았다.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플레이보이 잡지 보듯 몰래 숨어서 읽어본다던가, 무미건조한 사뮤엘슨의 "경제학 원론"에 진한 감동을 느낀다던가...
경제학에서 마셜이 없었다면 케인즈도 없었듯이, 한 선구적인 낭만파 시인이 없었다면 파리의 우울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리라. 그 시인의 이름은 루이 베르트랑. 보들레르에게 깊은 영향을 준 그의 작품은 "밤의 가스파르". 보들레르는 밤의 가스파르를 20번쯤 읽은 후 그와 비슷한 작품을 쓰고 싶은 열망에 휩싸여 파리의 우울을 썼다고 전해진다. 가난과 질병 속에서 짧고 우울한 인생을 살았던 베르트랑은 진정 선구적인 예술운동가였다. 말라르네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베르트랑을 읽어라.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부분은 후생경제학의 창시자 피구가 그의 제자들에게 항상 하던 말을 생각나게 한다. "마셜을 읽어라.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밤의 가스파르는 상징주의, 혹은 초현실주의 시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한 위대한 음악작품을 태어나게 했다. 필자가 판단컨대, 전 음악사를 통틀어 "물"을 묘사한 곡 중 두 번째로 잘 된 곡, "옹딘(Ondine)"이 바로 그것이다. 옹딘을 들으면 파도치는 물결이 보인다. 포말泡沫로 부서지는 물결은 스치듯 우리 곁을 지난다. 이윽고 화성의 아름다움이 환상의 세계로 이어진다... 이 곡은 음악사에 있어서 인상주의印象主義 작곡자로 분류되는 모리스 라벨의 작품이다. 라벨은 밤의 가스파르에 나오는 정밀한 어법을 그대로 피아노 음악으로 바꾸어, 3곡으로 이루어진 동명同名의 피아노 곡, "밤의 가스파르"를 썼다. 이 작품 중 제1곡이 옹딘이다.
|
|
라벨을 드뷔시의 그늘에 가린, 인상주의의 2인자로 보는 견해는 온당치 못하다. 그의 선율은 관능적이고 독창적이다. 드뷔시와 자세히 비교해 보면 곡의 전개방식도 딴판이다. 다만 화성이 주는 인상印象은 비슷한 경우가 있다. 인상파를 "인상"에 의해 판단하는 잘못된 관습 때문에 라벨은 부당하게도 드뷔시의 아류로 평가받는 것이다. 물론 라벨이 드뷔시로부터 받은 영향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라벨의 유일한 현악 4중주는 드뷔시의 격려가 없었다면 라벨 자신에 의해 상당부분 고쳐졌을지도 모른다. 현대적 현악 4중주곡으로서 매우 높이 평가되는 이 작품은 원래 1903년, 파리음악원의 작곡경연대회에 제출되었다. 하지만 엄청난 혹평이 쏟아졌다. 프랑스 음악의 선구자 생 상스마저 라벨의 불협화음을 참지 못했다. 좌절에 빠져 개작改作까지도 생각하던 라벨에게 드뷔시는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주었다. "나의 모든 음악과 음악의 여신 |
|
에 맹세코 하는 말인데, 자네의 현악 4중주곡 중에서 어떤 부분도 바꾸지 말라..." | |
프랑스 사람이 아닌 라벨이 프랑스의 대표적인 작곡가로 분류되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irony)이다. 라벨의 아버지는 스위스 태생의 철도기술자였고, 어머니는 바스크 태생이었다. 라벨이 태어난 곳은 시브르라는 어촌. 프랑스령領이라고는 하지만 스페인과의 접경지대여서 스페인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던 고장이었다. 비록 태어난지 3개월만에 온 가족이 파리로 이주하여 전 생애를 프랑스에서 보내게 되지만, 라벨은 시브르를 평생 마음의 고향으로 여겼다. 레종 도뇌르 훈장을 거부한 그였지만, 시브르의 강변을 "모리스 라벨 강변"이라 명명하는 기념식에는 기꺼이 참석하였다. 라벨의 곡에서는 스페인적인 요소를 자주 볼 수 있다. "하바네라", "말라게냐", "볼레로", "스페인 광시곡", "스페인의 한 때" 등, 제목에서부터 스페인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 여럿 있다.
라벨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가져다 준 작품은 역시 "볼레로"다. 화성과 리듬이 시종일관 반복되는 이 무곡舞曲은 그야말로 전세계를 폭풍과도 같이 휩쓸었다. 라벨의 볼레로는 동명同名의 스페인 전통무곡과는 사뭇 다르다. 선율에 스페인의 정취가 약간 묻어나기는 하나, 리듬이나 템포가 아주 달라서 스페인의 전통무곡 "볼레로"와는 무늬만 같다. 사실 이 곡의 템포는 무곡이라기에는 너무 느리다. 하지만 느린 템포를 일관성 있게 받쳐주는 작은 북 소리가 듣는 이들의 마음에 묘한 여운을 남긴다. 마치 춤을 추거나 춤추는 사람들을 보는 듯한... 작곡된 지 70년이 넘는 볼레로가 현대극이나 현대무용, 심지어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은 라벨의 작풍作風이 얼마나 현대적이었는가를 잘 말해준다.
발레곡 "다프니스와 클로에"는 음악적 회화다. 작품의 기저에는 "18세기 프랑스의 화가들이 상상했던 그리스의 모습"이 깔려 있다. 이 작품의 상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었던 모양이다. 러시아 발레단의 대부, 디아길레프가 런던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연비용초과를 이유로 공연에서 합창단을 빼자는 제안을 할 정도였다. 라벨은 이를 신랄히 반박하였고, 그 결과 두 예술가 사이에는 서신을 통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아주 흥미있는 논쟁이었으므로 런던 타임즈에서 이를 게재하기까지 했다.
디아길레프는 라벨의 또 다른 발레곡, "라 발스"의 공연을 거부함으로써, 역설적逆說的으로 음악계에 큰 이득을 남겼다. 라 발스가 그 때 발레로서 공연되었다면, 발레곡이라는 인상으로 인해 관현악곡으로서의 가치가 쉽게 드러나지 않았으리라. 이 작품을 왈츠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디아길레프에게 라벨은 절교를 선언했다. 절교 정도로는 성이 안 찾던지 그 사건 이후 5년 뒤 그를 우연히 만났을 때 결투를 신청하기까지 했다. 라 발스는 꿈틀거리는 생명력이 점점 고조되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화산의 폭발처럼 분출하는, 현란하고 격렬한 모습을 담고 있다.
오페라 "스페인의 한 때"는 초연부터 대성공을 거두었다. 가사가 명확하고 위트가 풍부한 이 오페라에서 라벨은 어머니를 통해 느끼고 있던 스페인의 분위기를 멋지게 살려내었다. 실로 20세기 오페라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작품이다. 마음의 고향인 스페인은 라벨의 창작열을 끊임없이 자극하였다. 관현악곡 "스페인 광시곡"에는 스페인의 정열이 배어 나온다. 비교적 초기작품인 "하바네라"에는 독특한 스페인 무곡舞曲의 리듬이 생생히 살아있다.
"어린이와 마술"은 스페인의 한 때와 상당히 대조적인 스타일의 오페라이다. 스페인의 한 때가 라벨 초기의 풍부한 화성을 품고 있다면, 어린이와 마술은 과감한 생략에 의한 간결한 선율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뮤지컬 코메디의 방식과 재즈풍의 작곡기법을 절묘하게 도입하여, 표면에 흐르는 세련미와 어린이의 단순함이라는 모티브를 무리없이 조화시키고 있다.
자주 드나들던 살롱의 주인, 에드몽 드 폴리냑 대공부인에게 바친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는 19세기 최후의 명곡중 하나이다. 한 젊은 스페인 왕녀를 위한 만가輓歌를 구상했던 라벨은 생각을 바꾸어 그녀가 생전에 궁전에서 추었을 춤, 파반느를 소재로 악상을 전개하였다. 스페인 왕녀를 생각했다고는 하나 이 작품에는 스페인적인 요소가 극도로 억제되어 있다. 자신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비판적이었던 라벨은 후일 이 곡을 '빈약한 형식에 단점만이 가득하다'고 자평했다. 음악사 상 손가락에 꼽을만한 겸손한 평이다. 실제 이 곡은 피아노의 시인 쇼팽을 무색하게 할만큼 아름답고 시적詩的이다.
라벨은 화성법 강의를 들으며 고생하는 음악도들의 꿈이요, 희망이다. 20세기 최고의 화성和聲의 대가라 일컬어지는 라벨도 화성학 과목에서 3년 동안이나 낙제를 하였으니까. 신神이 만든 천재는 범인凡人의 눈으로 평가할 수 없다. 정상적인 진도는 범인凡人의 몫이다. 또한 정상적인 진도가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화성학 낙제생이 반드시 훌륭한 작곡가가 된다는 보장은 더 더욱 없지만...
필자의 무지 때문인지, 라벨의 연인에 대한 기록은 보지 못하였다. 예술가에게 비교적 흔한 연애사건이 없다는 것은 의외이다. 특히 모리스 라벨같이 정열의 음악을 작곡한 예술가의 경우에는... 혹자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 정신적 유아증상 내지 자기애自己愛 성향을 보였다고 분석한다. 필자는 이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라벨의 음악인생은 연애를 허용하기에는 너무나 정돈되고 꽉 짜여져 있었다는...
라벨이 1927년에 미국 순회연주를 갔을 때의 일이다. 이미 "랩소디 인 블루"로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던 거쉰이 라벨을 방문하였다. 놀랍게도 거쉰은 라벨의 제자가 되고자 했다. 라벨은 이를 주저없이 거절했다. 일류급의 거쉰이 구태여 이류급의 라벨, 즉 라벨의 아류亞流가 될 필요는 없다는 이유로...
라벨은 1937년에 죽었다. 그의 사인은 뇌 손상이었다. 5년 전의 자동차 사고로 인해 그는 뇌를 다쳤었다. 이 천재의 말년은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킨다. 표현장애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글로 정확히 표현할 수 없었다. 머리 속의 악상을 악보에 옮길 수 없었던 것이다.
젊은 시절, 라벨은 5년간이나 로마대상에 도전했지만 보수적인 심사위원들은 라벨의 음악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모든 상에 대한 반감이 생겼다. 프랑스 최고의 명예인 레종 도뇌르 훈장을 거부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수훈을 거부한 후 친구에게 한 말이 인상적이다. "훈장을 거부한 것은 나로서는 순수한 허영이다."
옹딘이 물을 묘사한 작품 중 음악사 상 두 번째로 잘 된 곡이라면 첫째가는 곡은? "물의 유희"다. 폭포, 시내, 분수...모든 물이 내는 소리가 영감靈感의 원천이다. 작곡자는? 물론 라벨이다.
|
노재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영본부장 |
 |
3/2007 |
|
기획특집 우울증의 원인
우울증의 원인 서론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 불안, 신체증상, 무감동, 인지 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증상으로 구성된 질환이다. 그러나 정신운동 지연과 정신운동 초조, 수면과다와 불면 등의 일부 증상들은 서로 상반되는 성향을 가지면서도 모두 우울증에서 관찰될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의 기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원인이 명확한 하나의 질환이라는 개념보다는 여러 증상들이 모여 있는 복합증후군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울증의 병태생리와 증상 간의 연관성을 찾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전부터 우울증의 발병에 관련된 기전을 밝히려는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초기의 연구는 우울증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에 비중을 두고 시도되었다. 여러 학파의 연구자들이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아기 때의 심리적 손상에 대한 다양한 가설을 세웠으며 이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의미 있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기도 하였으나 우울증에 대한 심리학적 가설들의 일치된 의견은 거의 없었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생물학적 접근방법에 점차 연구의 비중을 두게 되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우울증의 기전과 연관될 수 있는 많은 생물학적인 현상들이 밝혀졌다. 하지만 생물학적인 분야에서도 역시 우울증의 원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의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른 질병이나 장애들과 달리,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은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에도 영향을 받지만 유전적인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건강한 부모에 의해 양육되었을 때도 우울증이 나타난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또 주변의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명확하지만 수면장애나 식욕변화 등의 많은 증상들은 우울증의 발병에 생물학적인 기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현재 우울증의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는 여러 증거들을 생물학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부분으로 분류하여 논하고 이것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생물학적인 접근 1] 유전적 요인 우울증이 인생경험이나 성격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실제로 개인의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인 성향에 의해 결정지어진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일란성 쌍둥이의 주요우울장애에 대한 일치율은 약 50%로 생각되고 있으며, 이란성 쌍둥이의 경우 10~20%로 생각된다. 우울증의 유전적 경향은 양극성 장애(조울병)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 낮으며 이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된다. 이 결과는 유전적 경향이 질병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유전만으로는 우울증의 발병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으며 다른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실제 많은 경우에서 우울증의 발병 이전에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환경적인 요인이 선행하고 있기도 하지만, 같은 환경적인 조건이라면 우울증이 생기는 여부는 강력하게 유전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된다.
2] 신경생화학적 요인 아직까지도 인간의 뇌에 대한 지식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인한 실제 뇌의 변화 역시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우울증과 연관된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요인은 바로 신경전달물질 기능의 장애일 것이다. 신경전달물질이란 뇌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물질이다. 뇌에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수 많은 신경전달물질이 있지만 현재까지의 연구결과 인간의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신경전달물질은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등 세 가지로 알려져 있다. 정상적인 뇌에서는 신경전달물질이 하나의 신경세포에서 다음 신경세포로 빠르게 신호를 전달하고 이런 전달이 수 차례 반복되어도 후반부에 있는 신경세포에서는 처음의 신경세포처럼 강력한 신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서는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전달물질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신경세포를 거치게 되는 경우 신호가 잘 전달되지 않거나 신호의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를 통해 이 세 가지 신경전달물질의 기능 장애에 대해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지만, 신경전달물질들은 서로 복잡하게 연관되어 서로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신경전달물질의 활성도가 감소해서 우울증이 발병한다고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런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이 우울증을 일으킨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이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된 다양한 항우울제들을 통해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치료되었다는 사실은 우울증의 발병에 있어 신경전달물질의 역할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다. 현재도 우울증의 신경생화학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발될 새로운 항우울제는 우울증의 완치를 목표로 하는 치료적 방법으로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3] 신경내분비학적 요인 우울증에서 흔히 관찰되는 식욕저하, 성욕감퇴, 일중주기(circadian rhythm)의 이상 등의 생리적 증상들은 우울증과 생물학적인 원인과의 연관성을 강력히 시사하며 많은 연구자들은 특히 신경내분비학적인 관점에서 그 기전을 밝히려고 시도해왔다. 그 가운데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피질 축(hypothalamus-pituitary-adrenal axis, HPA 축)의 활성도 증가로 인한 cortisol의 분비 증가는 우울증에서 가장 일관되게 보고되는 결과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덱사메타존 억제 검사(dexamethasone suppression test, DST)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 검사는 1970년대부터 시행되었으며 당시에는 DST 하나로 우울증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내인성 우울증, 단극성 우울증 및 melancholia형의 우울증의 경우 DST에 양성 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시상하부에 corticotropin releasing hormone(CRH)의 분비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CRH의 분비증가는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 등의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장애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CRH의 분비증가와 신경전달물질의 이상 중 어느 것이 더욱 근본적인 장애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처음에는 DST를 우울증을 진단하는데 이용하고자 하였지만, 우울증 이외의 다른 장애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자주 관찰되어 현재는 진단적 도구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DST는 임상적으로 약물에 대한 치료 반응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상태지표(state marker)로서의 역할을 하여 우울증이 치료되어 증상이 호전되면 정상반응을 보이게 된다. 우울증이 호전되어 DST가 정상으로 회복된 후, 추적조사에서 DST가 다시 양성의 결과를 보이게 되면 임상적으로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DST는 민감도가 40~67% 정도이고, 위양성이 5~10%에 이른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외에도 우울증 환자에서는 갑상선 기능이상이 적지 않게 발견되며, 우울증 환자의 약 1/3에서 thyrotropin releasing hormone(TRH)에 의한 thyroid stimulating hormone(TSH)의 반응이 저하되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TRH 자극 검사를 이용하여 우울증을 진단하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일부 우울증 환자에서 수면 시 성장 호르몬 분비 증가가 관찰되지 않으며 clonidine에 의한 성장 호르몬 분비 증가도 관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초로 성장 호르몬의 검사를 통해 우울증을 진단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면 항우울제에 의한 치료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또한 우울증 환자에서 성장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 소마토스타틴이 감소되어 있다는 보고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4] 수면 및 생체리듬의 장애 수면장애는 우울증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증상 중의 하나로 우울증 환자들은 밤에 잠이 들기 어렵거나 중간에 자주 깨기도 하고, 또 새벽에 일찍 깨어 다시 잠들지 못하기도 한다. 일부의 환자에서는 이런 수면장애의 증상들이 모두 나타나기도 하며 어떤 환자들은 이와 반대로 낮 동안에도 지나치게 졸리며 잠을 많이 자게 된다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들의 수면과 연관된 생리적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수면다원검사(polysomno-graphy)를 시행하였을 때, 전반적인 수면시간의 감소, REM(rapid eye movement) 수면의 증가, 서파 수면의 감소, REM 잠복기(일반적으로 잠들기 시작하여 첫 REM 수면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의 단축 등이 관찰된다. 이런 수면의 변화는 내분비 이상과 관련된 일중주기(circadian rhythm)의 장애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일중주기가 앞으로 당겨진 위상전진이 우울증의 발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우울증 환자에게 수면박탈을 시도하였을 때 치료적인 효과가 나타나거나 계절성 우울증을 보이는 환자에게 광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를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그러나 생체리듬과 우울증과의 관계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심리학적인 접근 1]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단독으로 우울증의 발병 원인이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증상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삽화가 발생하기 전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것은 첫 삽화의 경우 더욱 명확하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울해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몇 일 또는 몇 주 내에 이것을 극복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스트레스로 인한 생물학적 변화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소인과 결합하여 신경전달물질의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이것이 우울증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생물학적 소인이 강한 사람은 별다른 스트레스 없이도 우울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우울삽화 시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이후에는 스트레스 없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은 한 번 우울증이 발병하면 뇌의 생물학적 균형이 불안정해져 이후에는 매우 약한 스트레스나 특별한 스트레스 없이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실(loss)와 관련된 주제이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의 가까운 가족의 죽음을 포함한 친밀한 인간관계의 상실, 직장 등 자신에게 중요한 사회적 환경의 상실, 경제적 능력의 상실, 육체적 건강의 상실 등은 우울증에 선행하는 대표적인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 2] 정신역동이론 프로이트(Freud)에 의해 시작된 정신분석이론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그 이론이 확대 되었다. 프로이트는 자신의 저서인 ‘애도와 우울(mourning and melancholia)’에서 애도반응과 우울증을 구분하였다. 프로이트는 애도반응을 유발하는 사건은 실제 중요한 대상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우울증에서는 상실된 대상이 실제적인 것이 아니고 감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애도반응의 경우 이성적으로 안정된 자존감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우울증의 경우 심각한 자존감의 손상을 느끼며 자기비난과 죄책감이 동반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기비난의 이유로 외부를 향했던 분노가 자기 내면으로 향했기 때문이며 이는 환자 자신과 상실된 대상이 동일시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하였다. 이후의 저서에서도 우울증 환자는 엄격한 초자아를 가지고 있으며 환자의 죄책감은 자신을 사랑해 주던 대상을 공격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아브라함(Karl Abraham) 등에 의해 확장된 이론에 따르면 우울증은 ① 구강기에 어머니와의 관계에 장애가 있던 사람이 ② 실제 혹은 상징적인 대상의 상실을 경험하고 ③ 상실의 고통을 견디어 내기 위해 함입(introjection) 이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하여 상실한 대상을 자신의 내면으로 간직하며 ④따라서 상실한 대상에 대해 지녔던 분노나 공격성이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우울증이 자존감의 상실로부터 기인한다는 주장도 있다. 자신이나 자기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그 대상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우울증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3] 성격 특성 모든 성격에서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우울증이 더 쉽게 발생한다고 증명된 특정한 성격 유형은 없다. 그러나 불안의 수위가 높고 고민이 많은 성격유형이거나, 주변상황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성격유형, 수줍음이 많고 대인관계에 대해 회피적인 성격유형을 가진 사람은 환경적인 요인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또 강박적이거나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매사에 자기 자신에 대해 높은 기준을 제시하며 자신이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자존감에 손상을 입거나 죄책감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자신은 할만큼 하는데 상대방은 자신만큼 해주지 못한다고 느끼며 상처를 입을 가능성도 높다. 4] 인지행동이론 아론 벡(Aaron T. Beck)은 1960년대에 체계적인 임상적 관찰과 실험적 검증으로부터 우울증의 인지모형을 발전시켰다. 그는 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람들에게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미래,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라보는 세 가지 특징적인 사고의 패턴을 발견하였는데 이것을 인지 삼제(cognitive triad)라고 한다. 우울증 환자의 인지 삼제란 ①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며, ② 자기 자신을 둘러싼 세상도 자신을 못살게 굴거나 요구만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③ 미래도 비관적으로만 생각하는 인지적인 왜곡을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대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정적인 사고에 대한 신념을 유지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임의적인 추론(arbitrary inference: 결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결론과 배치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 선택적 추상화(selective abstraction: 중심에서 벗어난 한 가지 세부 특징에 초점을 기울이며, 더욱 현저한 다른 특성은 무시한 채 이러한 경험의 단편에만 기초하여 전체 경험을 개념화 하는 것), 과일반화(overgeneralization: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특수한 사건들에 기초하여 일반적인 법칙이나 결론을 도출하고 이러한 법칙을 관련되지 않는 상황까지 광범위하게 확장하는 것) 등의 사고방식이 작용하게 된다. 잘못된 자신의 패턴을 통해 세상을 파악하는 인지적 왜곡을 우울유발 도식(depressogenic schema)이라고 하며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왜곡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교정하고 새로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치료가 인지치료이다. 행동이론에서는 학습된 무력감(learned helplessness)을 통해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동물에게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불쾌한 자극을 주었을 경우 처음에는 그 자극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노력과 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학습하게 된다. 이런 동물은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되어도 자신의 노력이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불쾌한 자극을 벗어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게 되는데 이것을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한다. 행동이론에서는 인간도 동일한 과정을 통해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며 자신이 상황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긍정적 경험을 통해 학습된 무력감을 약화시키는 것이 우울증에 대한 행동치료의 목표이다. 결론 지금까지 우울증의 원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울증은 하나의 단일한 질환이라기보다는 생물학적 원인과 심리적 원인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 발생하는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이론이 옳다고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다. 최근에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접근태도를 통합하려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울증의 신경심리학적 연구와 뇌영상연구를 결합하여 뇌의 신경해부학적 병변을 국재화하려는 연구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감정/인지 상호작용을 포함한 뇌-행동 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다면 우울증의 원인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치료방법의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Synopsis of psychiatry, 9th edition. BJ Sadock, VA Sadock.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press. | ||||
![]() 월간의약정보 : 02-3270-0241∼2 Fax : 02-3270-0249 E-mail : druginfo@yakup.com
월간의약정보 : 02-3270-0241∼2 Fax : 02-3270-0249 E-mail : druginfo@yakup.com
| |||||||
|
광명시 시비 세우고 문학 세미나 열어 추모
'대취한 일용은 … 울면서 춤을 춘다. 다음날 아침 술이 깬 일용의 뺨에 누군가 뽀뽀를 한다. 아빠를 찾으러온 딸 복길이다. 일용은 복길을 안고 집으로 향한다. 그래도 여기는 우리의 땅이다. 자식들은 흙의 희망이다. 우리는 고향을 떠날 수 없다.' 20년 전 기사인데도 요즘 기사처럼 생생하다. 기사는 소위 기사체가 아니다. 6하 원칙은 깨졌고 객관적 보도는 무너졌다. 문장은 짧고 주장은 명료하다. 자식들이 흙의 희망이라니! 한 줄 기사가 아니라 한 수 시였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이름은, 기형도. 입사한 지 2년 갓 넘은 신참이었다. 기자가 시인인 줄 몰랐던 독자들은 이 통렬한 기사에 환호했다. 편집국에선 금기를 깬 기사란 평이 잇따랐다. 16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에서 시인 기형도(1960~89.사진)의 시비(詩碑) 제막식이 열렸다. 행사는 조촐했다. 고인의 누나 애도(49)씨와 소설가 성석제씨 등 지인과 유족, 광명시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후 3시부터 '살아있는 기형도의 문학'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고 오후 6시부터 시비 제막식이 진행됐다. 이게 전부였다. 광명시가 시비를 세우는 데 들인 돈은 1000만원. 전국 곳곳에 시비가 허다한 지금, 소박한 시비 하나 세운 건 별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경우가 다르다. 다른 시비의 주인공은 생전에도 문학성을 인정받은 대가였다. 그러나 89년 서울의 한 심야극장에서 숨진 채 발견될 때까지, 기형도는 시집 한 권 없었다. 등단 5년차 신예였다. 그러나 그는 오늘도 호명되는 시인이다. 뇌졸중으로 급사한 뒤 17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베스트셀러 시인이다. 90년대 이후 한국 시 대부분은 기형도의 영향 속에서 설명되고 있다. 이 점이 다른 것이다. ◆ 기형도 신화=시인이 주검으로 발견됐을 때, 생전에 그가 메고 다니던 검은 가방도 발견됐다. 거기엔 타이핑된 시 원고와, 시작 메모로 가득한 푸른 수첩이 들어있었고, 그 원고와 메모 등을 모아 시집이 제작됐다. 당시 최고 평론가였던 김현이 해설을 붙였고, 시집 제목을 골랐다. 그리하여 그해 5월 30일 유고시집 '입 속의 검은 잎'(문학과지성사)이 출간됐다. 17년이 지난 오늘. 시집은 무려 61쇄가 인쇄됐다. 40여 만 부가 팔린 것이다. 놀라운 건, 해마다 꾸준히 1만 부 이상 판매된다는 사실이다. 문학과지성사 측은 "20년 가까이 판매 순위 상위권을 지키는 유일한 시집"이라고 밝혔다. 세미나에서 박철화(중앙대) 교수는 "시인이 노래한 현대적 일상은 오늘도 유효하다"며 "21세기 이후 한국 시 대부분은 기형도의 자장(磁場) 속에 있다"고 평가했고, 이광호(서울예대) 교수는 "사소한 체험과 사적인 것을 시의 세계로 끌어온 시인에게서 한국 문학사 100년을 예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기형도의 추억=시인은 5세 때 경기도 시흥군 소하리(현 광명시 소하동)로 가족과 함께 이사 왔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았다. 광명에 시비가 세워진 이유다. '안개는 그 읍의 명물이다. /누구나 조금씩은 안개의 주식을 갖고 있다.'('안개'중 부분)라고 읊었던 것도 안양천 둑방의 울적한 풍광이 있어 가능했다. 시비엔 '어느 푸른 저녁'이란 작품이 실렸다. 5연 48행의 장시(長詩)다. 시가 워낙 길어 시비를 두 개나 세웠다. 시비에 새길 작품을 고른 건, 대학 때 시인과 함께 문학공부를 했던 성석제씨다. 그는 "형도가 가장 좋아했던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시인은 84년 10월 중앙일보에 입사했다. 정치부.문화부.편집부에서 기자로 일했다. 숨질 당시엔 편집부 기자였다. '김(金)은 블라인드를 내린다, 무엇인가/생각해야 한다, 나는 침묵이 두렵다/침묵은 그러나 얼마나 믿음직한 수표인가'라고 시작하는 '오후 4시의 희망'은 당시 편집국 풍경을 시로 표현한 것이다. 시인은 3월 13일 태어나 3월 7일 숨졌다. 행사가 열린 6월 16일은 시인과 관계가 없다. 광명시 축제가 시작된 날일 뿐이다. 그런가 했는데, 흥미로운 기록을 발견했다. 기형도는 시인 김수영(21~68)을 가장 좋아했다. 김수영의 기일이 6월 16일이다. 두 명 모두 요절한 것처럼 이 또한 우연일 것이다. 광명 글.사진=손민호 기자 *** 바로잡습니다 6월 19일자 10면 '죽어서 전설이 된 시인 기형도 부활하다'기사에서 기형도 시인의 누나 애도씨의 나이가 잘못 나갔습니다. 애도씨는 40세가 아니라 49세입니다. | |||||
| 2006.06.19 04:39 입력 / 2006.06.20 06:21 수정 |
| ||||||||||
  |
- 2003 여름 통권 제4호 특집
하 재 봉 | 시인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1984년 1월, 어느 신문의 신춘문예 심사평에서였다. 기형도는 당선되지 못했고, 최종 심사평에 그의 시 일부가 언급되어 있었다. 당선시가 아니라 최종 심사 대상에서 거론되다가 낙선한 시의 일부가, 심사평에 자세하게 소개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심사위원들이 최후까지 고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당시 <시운동> 동인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감수성과 어법으로 무장된 새로운 시인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1980년 12월, 하재봉·안재찬·박덕규 세 사람이 함께 시집을 낼 때부터 우리는 3인 시집이 아니라 <동인지>라고 못을 박았고, 이후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한기찬, 경희대에서 함께 시를 썼던 이문재, 《동아일보》로 등단한 남진우 등등이 동인활동에 합류했었다. 또 박덕규와 함께 대구에서 시를 썼던 박기영, 박기영의 소개로 만난 장정일, 그리고 오규원 선생의 소개로 만나게 된 황인숙 등등이 <시운동>에 합류하게 된다.
1984년은 신군부의 등장과 함께 폐간된 문지/창비의 양대산맥의 빈 공간을, 다양한 동인지, 무크지 등이 메꾸고 있던 시절이기도 했다. 한 평론가에 의해 ‘소집단 운동’이라고 명명된 당시의 문학 운동은, 한정된 문예지 지면의 대안공간으로서 동인지나 무크지가 이용되었던 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상상력과 시적 실험으로 형성된 동인 집단들이 칼날을 갈고 혁명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기형도의 짧은 시가 눈에 들어왔다. 당선된 시보다, 심사평에 언급된 그의 시 일부가 훨씬 더 가슴을 쳤다. 나는 수소문 끝에 기형도가 연세문학회 멤버라는 것을 알았고, 확신을 갖기 위해 연세춘추 교지에 실린 그의 시도 미리 읽어보았다. 그리고 그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했다. 당시 나는 군인 신분이었지만, 서울 교외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로 외출을 나와서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은 종로 2가에서 3.1빌딩 쪽으로 꺾어지는 모퉁이 2층에 있었던 ‘민화랑’이었다. 갤러리는 아니고 전통차를 팔던 찻집이었다. <시운동> 동인들은 대부분 술, 담배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배 냄새 자욱한 일반 카페보다는 이런 곳을 훨씬 선호했다. ‘민화랑’에서는 금연이었다.
나는 약속시간에 박덕규, 남진우와 함께 나갔다.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어떤 남자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듬는 것이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그가 기형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는 연세문학회 선배였던, 그리고 당시 이미 문예지 추천으로 등단했던, 시인 오봉진과 함께 그 자리에 나왔다. 나는 그에게 <시운동> 동인을 같이 할 것을 제의했다. 그는 망설였고, 며칠 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며칠 뒤, 그는 추후 함께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더불어 나에게 타이프로 A4 용지에 깨끗하게 타이핑된 시 한 편을 보내왔다. 훗날 발표된 「포도밭 묘지」라는 시였다. 특히 그 시는 당시 우리 <시운동>이 펼쳐가고 있었던 시세계와 흡사했다. 그는 명백히 <시운동>이 추구하던 시세계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생각되었다. 아마도 문예지나 신춘문예를 통해 정식으로 등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 시인들과 동인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리고 그 다음해 1985년, 우리는 1월 1일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발표에서 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선작 「안개」는 기형도의 대표시는 아니다. 신춘문예 스타일을 고심해서 응모한 시였다. 대학 졸업반이었던 그는, 이미 그때 《중앙일보》 기자시험에 합격해서 수습기자 과정을 밟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제대해서 한 잡지사의 수습기자로 일하고 있을 때였다. 나 역시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춘문예 시상식장에서 다시 재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5년 등단 이후 기형도와는 자주 만날 수 없었다. 그는 초보 기자로서 힘든 수습 생활을 하고 있었고, 수습 딱지를 뗀 후에는 정치부 기자로서 총리실을 출입하며 정치 기사를 썼다. 워낙 바쁜 생활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주 연락을 하며 지냈다.
나는 <시운동> 동인지를 만들 때마다 그에게 연락을 했었다. 1년에 한 번 정도 발간된 <시운동> 동인지는 어떤 때는 1년에 두 번 발간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기형도는 머뭇거렸다. 그의 시는 빠른 시간 안에 기존 평단의 주목을 받고 있었고, 자신의 시에 대해서 깊은 자기 확신이 있었던 그는 향후 시단의 방향을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된 것은, 그가 문화부로 부서를 옮기면서부터였다. 나도 직장을 옮겨 문예진흥원에 근무하고 있었고, 출판 홍보를 책임지고 있던 나의 직속 상관 박제천 시인은 언론사에 홍보할 일이 있으면 나를 내보냈기 때문에, 나는 업무차 사대문 안의 신문사를 뻔질나게 드나들어야 했었다. 내가 방문하는 곳은 각 신문사의 문화부였고 당연히 기형도와는 얼굴 마주칠 일이 늘어났다. 그러나 우리가 더 자주 만나게 된 것은 그가 편집부로 옮기게 된 뒤부터였다. 사실 그의 편집기자 시절이 우리의 황금기였다. 왜냐하면 늘 기사를 써야 했던 정치부/문화부 시절과는 다르게 그에게 여유 시간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다.
1988년부터 1989년 3월 7일 새벽, 그의 돌연한 죽음까지 우리는 자주 어울렸다. 어떤 날은 하루에 3번 넘게 인사동 골목에서 마주치기도 했다. 기형도가 문화부 방송 담당 기자였던 시절, 방송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중앙일보》 방송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신문 맨 뒷 페이지 오른쪽 상단, 그날 하루의 방송 스케줄이 빼곡하게 짜여진 한쪽 귀퉁이에 실린 방송면은, 순수문화에 대한 애정이 넘쳐나던 80년만 해도 일종의 액세서리였으며 방송이라는 대중문화, 하위문화에 대해 형식상으로 마련된 지면이었다. 그런데 그는 이 작은 지면을 놀랄 만한 탄력의 공간으로 바꿔놓기 시작했다. 방송국 프로듀서들을 긴장시켰고 제작 간부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가 문화부에서 편집부로 옮겨간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소상하게 증언하고 있으므로 피하겠지만, 자신의 일에 대한 그의 완벽주의, 주위 사람들도 혀를 내두를 그의 꼼꼼함은, 시에서는 더욱 심한 것이었다. 시에 대한 그의 이러한 엄정성이 사뭇 그리워진다.
1988년부터 나는 <시운동> 팸플릿을 발간하고 있었다. 매월 20여 쪽 내외로 구성된 작은 팸플릿은 문단 관계 인사들에게만 우송되던 새로운 동인운동이었다. 1년에 한 번 출간하는 동인지의 연장선상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단의 징후를 포착하고 문제를 부각시키며 논리를 다듬기 위해 만들어진 ‘시운동 팸플릿’ 맨 뒤쪽에는, 젊은 시인들의 모임 후기가 수록되어 있었다.
소위 문단에 ‘시운동 청문회’라고 명명되었던 이 모임은 대략 2주에 한 번 꼴로 인사동에 있는 평화만들기 혹은 토담 등등에서 개최되었는데 최근 시집을 낸 시인이 초청 대상이었고, 젊은 시인 평론가들이 모여들었다. 대부분 2, 30대로서 등단 10년이 안 되는 젊은 시인들이었다. 초청 대상이 된 어떤 시인은 그날 목욕재계하고 나왔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만큼 단순히 친목을 위해 어울린 것은 아니었고 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쏟아졌던, 조금은 살벌하기도 했던 모임이었다.
이 시운동 청문회의 단골 고객이 기형도였다. 그는 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했다.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면서도 할 말을 정확하게 하는 그에 대해 누구나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다. 1차 청문회는, 무차별한 폭격으로 초청 대상이 된 시인의 시를 난타하는 것이었다. 상찬도 있었지만 그것은 드문 경우였고, 시의 결점을 주로 잡아내서 토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열기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다.
1차 모임이 끝나면 그때부터 음주 가무로 들어갔다. 이때 가장 빛나는 사람이 기형도였다. 우리는 그를 ‘문단의 카수’라고 불렀다. 교회 성가대 출신답게 고운 음색과 정확한 음정으로 그가 노래를 부르면, 우리는 모두 조용히 그의 노래를 경청했다. 기형도의 연세문학회 동기였던 시인 성석제가 《문학사상》으로 등단한 이후, 시운동 청문회에서는 기형도와 성석제의 이중창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나는 아직도 두 사람이 함께 노래 부르던 트윈폴리오의 「하얀 손수건」, 「웨딩케익」 같은 노래들을 기억한다. 아니, 그런 노래만 들으면 기형도 생각이 난다.
1989년 3월 6일 아침, 나는 중앙일보사로 갔다. 그리고 편집부 그의 책상을 찾았다. 그날 저녁 샘터 파랑새 극장에서 나의 첫시집 『안개와 불』의 장례식 퍼포먼스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나는 퍼포먼스 팸플릿을 들고 그를 찾은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리에 없었다. 나는 그의 책상에 팸플릿을 놓고 나왔다. 그리고 하루종일 퍼포먼스 준비로 바쁘게 뛰어다녔다.
그 몇 달 전인 1988년 12월, 나는 첫시집 『안개와 불』을 민음사에서 출판했다. 등단 9년만에 낸 시집이었다. 발표한 시를 엮어서 시집을 만들었다면 벌써 2, 3권은 나와야 했다. 그러나 시집은, 그 자체가 하나의 시적 질서를 갖는 우주여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고 시집을 구성하는 동안 많은 에너지를 소진시켰다. 대립되는 물질적 이미지의 충돌을 통해 세계불화의 한복판에서 자아의 흔들림을 경험하는 개인의 성장과정을 그린 시집 『안개와 불』 구성에 너무 몰입해서 그런지, 시집을 출간한 뒤에 한동안 나는 그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제는 그 세계와 결별하고 새로운 시를 쓰고 싶었는데 여전히 『안개와 불』의 시 세계는 내 발목을 잡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시집 『안개와 불』의 장례식 퍼포먼스를 기획했다. 장례식이라는 제의과정을 통해서 그 시들을 떠나 보냄으로써 새로운 시적 출발을 가능케 하려는 의도였다.
대학로 샘터 파랑새 극장이 쉬는 3월 첫 월요일 저녁을 시집 『안개와 불』 장례식 퍼포먼스 공연날짜로 잡아놓고, 나는 기형도에게 시집 서평을 부탁했다. 조정래, 김초혜 선생이 함께 간행하던 월간 《한국문학》 서평난에 게재될 원고였다. 그때가 1989년 2월초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기형도는 흔쾌하게 내 부탁을 받아들여 주었고 좋은 원고를 보내왔다. 내가 알기에는, 그 원고가 기형도 생전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그의 마지막 산문이다.
3월 6일 저녁, 많은 시인, 기자들이 샘터 파랑새 극장을 찾아주었다. 상갓집 분위기와 똑같이 꾸미기 위해 나는 장의사에 가서 ‘근조’라고 검은 글자로 씌어진 커다란 노란등을 빌려 극장 입구에 걸어놓았고, 또 마름모꼴 하얀 종이의 검은 테두리 안에 역시 ‘근조’라고 씌어진 종이를 지하극장 입구 양쪽 벽에 수없이 붙여 놓았다. 무대에는 제단이 있었고 내 시집은 고인의 영정이 놓이는 자리에 양쪽으로 검은 띠를 두르고 놓여졌으며 향을 묶음 다발 통째로 피워 극장 안은 연기로 가득했다. 당시 《한겨레》 문학담당 기자였던 조선희는 매캐한 연기를 참지 못해 쿨럭거리며 극장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했었다. 나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듯이 미친 듯이 시낭송을 했고, 나중에는 시집을 들고 종을 딸랑거리며 극장 밖으로 나가 시집을 불태우고 오체투지로 그 불꽃을 덮었다.
공연이 끝난 뒤 참석자들과 뒤풀이가 있었다. 술을 마셨고 새벽에 택시를 타고 상계동 집으로 들어갔으며 다른 때보다 늦게 일어났다. 그런데 전화가 왔다. 《한국일보》 문학담당 기자인, 내 시집 뒤의 해설을 써준, 김훈 선배였다.
“나 김훈이다. 형도가 죽었다. 지금 서대문 병원 영안실에 있다.”
무미건조한 말이었다. 그리고 그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김훈 선배가 감정에 사무쳐서 소리 지르는 것도, 요동치는 것도 보지 못했다. 결국 그와 별로 친하지 못했다는 말인데, 하지만 나는 그가 이성을 잃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다. 그 순간에도 아주 사무적인 말투였다.
나는 전화를 끊고 머리 속이 진공상태가 되었다. 김훈 선배의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 <시운동> 동인들 중심으로 긴급히 연락을 하고 회사에 들러 직속상관 박제천 시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서대문병원 영안실로 갔다. 오전 10시쯤이었다. 이제 막 영안실 빈소를 준비중이었다. 그의 연세문학회 동기들이 넋 나간 표정으로 몇 사람 앉아 있었다.
그리고 발인이 있기까지 사흘 동안 나는 그곳에서 보냈다. 회사에 나가지도 않았고 중간에 집에 잠깐 다녀온 기억도 없다. 우리는 미친 듯이 술을 마셨고 서로 주먹질을 하며 싸움을 했다.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상갓집을 꾸며 놓고 향불을 피우고 생쇼를 한 것이 혹시 그의 죽음을 미리 부른 불길한 행동은 아니었을까 수없이 자책을 했다.
시인 권대웅은 나를 붙잡고 “형, 이제 형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나에게는 그렇게 생각되었다. 파고다 극장에서 새벽에 발견되기 전까지 기형도의 행적이 묘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소 기형도와 나의 친분관계로 보아서 분명히 어제 저녁 있었던 시집 장례식 퍼포먼스에 기형도가 갔을 것이고,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셨을 것이며, 그리고 사고가 났으므로 아직까지 원인불명인 기형도의 사인에 대해 내가 알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었다.
나는 권대웅에게 주먹을 날렸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상갓집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난투극을 벌였다. 야외 천막 안에 모여든 수많은 시인, 작가, 평론가들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다. 곳곳에서 서로 시비를 걸고 알 수 없는 분노로 폭발하기 직전이었는데, 내가 주먹을 날린 것을 시작으로 영안실 전체가 난투극에 휘말렸다. 이 날의 소동은 다음날 한국일보 휴지통에 소개되기도 한다. 나도 이성을 잃고 폭력을 사용한 점, 아직도 권대웅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 안성 천주교 묘지에 우리는 기형도를 묻었다. 붉은 무덤 앞에서 나는 그의 마지막 시 「빈집」을 읽었다. 마치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언하는 것 같은 시를 읽는 동안 우리 모두 흐느꼈다. 1989년 3월, 왜 우리는 그토록 많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3월호 《문학사상》에서 청탁을 받고 나는 시를 보냈는데, 「비디오/화산」이라는 그 짧은 시도 죽음의 이미지로 도배된 시였다.
기형도는 불과 4년 조금 넘게 시단 활동을 했고, 한 권의 유작시집밖에 남기지 않았지만 그의 시는 급물살을 타며 변화해 가고 있는 시대적 징후를 누구보다도 빠르게 감지하고 있었으며 90년대 시단으로 향하는 문을 미리 활짝 열어주었다. 너무 짧은 죽음으로 마감된 그의 시세계는 안타깝기만 하다. 한국 시사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고 문지방을 막 넘던 찰나에 그는 쓰러졌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살아 있다.
|
안녕하세요. 류가미입니다. 한 주일 동안, 별일 없이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약속대로 문학과 예술의 근원을 찾아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자 이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을 떠올려 보세요. 문학과 예술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했을까? 독자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내놓으셨나요? ⓒ 류가미 | |||||
|
|
그리스 비극, 산양의 노래
안녕하세요. 류가미입니다. 세월이 빨라, 벌써 올해의 마지막달 12월이 되었군요. 봄에 꽃피고 여름에 무르익다가 가을에 결실을 맺고 겨울에 사라져가는 한 해의 주기가 또 이렇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제우스, 부엉이가 아테네를 상징하는 동물이듯, 산양은 디오니소스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 했듯이, 디오니소스는 곡물신의 계보를 잇는 신입니다. 모든 곡물신들은 겨울에 매장되었다가 이듬해 공동체의 먹거리로 부활합니다. 11~12월이 있었던 시골 디오니소스 축제와 3~4 월에 있었던 도시 디오니소스 축제가 겨울밀의 파종과 추수와 관련있다는 사실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소포클레스는 처음에는 비극 작가가 아니라 배우로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잘 생긴 외모와 노래 솜씨 덕분에 그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BC 468년, 28세 때 비극 경연대회에 나와 스승인 아이스킬로스를 꺾고 첫 우승을 합니다. 그 후 그는 수많은 작품들을 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오이디푸스 왕(Oedipos Tyranos)입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을 받은 양치기는 아이를 버리지 못하고 그를 코린스의 양치기에게 넘깁니다. 그 후 코린스의 양치기는 그 어린 아이를 자식이 없는 코린스의 왕 폴리보스에게 바칩니다. 폴리보스 왕은 아이의 부은 발을 보고 그에게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 ||||||
|
|
오이디푸스, 운명(Moira)와 미덕(Arete) 사이에서
안녕하세요. 류가미입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마음까지 움츠러듭니다. 더군다나 댓글 붙는 것 보면 시베리아에 혼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몇몇 댓글에는 답변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잘못하면 연재글이 너무 개인적인 푸념으로 바뀔까 싶어 참았습니다. 원래 푸념이라는 것은 한번 늘어놓으면 굽이굽이 아홉 곡절이거든요.
1. 테베의 시민들이 테베 왕궁으로 찾아와 오이디푸스에게 전염병을 해결해달라는 탄원을 합니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은 테베 궁전에서 오이디푸스 왕이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 한 나절 동안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한나절 동안에 라이오스와 오이디푸스 2대에 걸친 사연들이 모두 압축되어 있습니다.
디오니소스 축제 때, 사람들은 비극을 보면서 인간의 미덕으로도 어쩔 수 없는 저 커다란 운명의 힘에 순종할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소포클레스(BC494~BC406)와 거의 동시대에 아테네에 살았던 소크라테스(BC469~BC 399)는 이러한 운명주의적인 시각을 거부합니다. 그에게는 운명보다 미덕이 더 중요하고 신보다는 인간의 영혼(psyche)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류가미 | ||||||
|
|
왜 플라톤은 국가에서 시인을 추방하려고 했는가?
안녕하세요. 류가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플라톤의 시인 추방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물론 여기서 시인은 비극 작가를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 왜 플라톤이 국가에서 시인을 추방해야한다고 주장했는가를 알아보기 전에, 테세우스의 이야기 한 토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첫째는 존재를 이루고 있는 물질적 측면이 바뀌어도 그 존재의 정신적인 측면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존재는 같은 존재다라는 입장입니다. 말하자면 테세우스의 배의 널빤지가 바뀌어도 그 배가 설계된 원안을 유지한다면 그 배는 같은 배라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인간에게 적용하면 육체적 조건이 바뀌어도 인간의 정신(영혼)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플라톤 이후, 19세기까지 서양철학을 지배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플라톤은 물질적 조건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원래의 설계 도면을 이데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도 크리아티스와 카르미데스와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민주파에 의해서 기소되어 처형됩니다. 플라톤은 아테네 민주파에 의해 사랑하는 친척들과 스승을 잃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이상 국가는 자신이 태어나서 자랐던 아테네보다, 아테네의 적이었던 스파르타에 훨씬 가깝습니다. ⓒ 류가미 http://www-nozzang.seoprise.com/board/view.php?uid=216704&table=seoprise9&issue1=&issue2=&field_gubun=&level_gubun=&mode=search&field=nic&s_que=류가미&start=&month_intval= | ||||||||||||
|
|
류가미의 문예기행(27) 메리 셸리, 새로운 장르의 어머니 안녕하세요. 류가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메리 셸리(1797-1851)의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사실 이 작품만큼 최초라는 말이 많이 붙은 작품도 없을 겁니다. 평론가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 작품은 최초의 공포 소설이자 SF 소설이며 또한 최초의 페미니즘 소설이라는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프랑켄슈타인, 새로운 프로메테우스’입니다. 다시 말해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그리스 신화 속의 프로메테우스처럼 인간을 창조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신화 속의 프로메테우스 보다 훨씬 무책임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의 창조물을 위해 신들이 금한 지식(불)을 훔쳐오지만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의 창조물을 외면합니다.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8212&table=seoprise_10&issue1=&issue2=&field_gubun=&level_gubun=&mode=search&field=nic&s_que=류가미&start=&month_intval=
|
|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안녕하세요. 류가미입니다. 오늘은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시학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시학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예이론서입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저서 ‘국가’에서 모방이론과 시인추방론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이 ‘국가’를 쓴 목적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 국가를 드러내기 위해서였지, 문예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말 그대로 시(비극)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평론을 담은 책입니다. 그야말로 본격적인 문예이론서인 셈이지요. 소크라테스가 가난한 시민이었고 플라톤은 몰락한 귀족 정치가 집안 출신이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당대의 최고 권력자들의 친구이자 스승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할아버지였던 아민타스 3세의 시의(侍醫)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마케도니아 궁전과 인연을 갖게 됩니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관계는 알렉산더의 후계자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사이에도 이어집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 그의 제국은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 세 개의 나라로 분열되어 통치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의 그의 제국을 나누어 통치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을 별로 없었습니다. 예술을 실재의 모방으로 보았던 플라톤이 예술의 중심에 미술을 놓았다면 예술이 실재 일어나지 않은 일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았던 아리스토텔레스 예술의 중심에 음악을 놓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재현 예술의 제일 앞에는 미술이 있었고 표현 예술의 제일 앞에는 음악이 있었습니다. ⓒ 류가미 http://www-nozzang.seoprise.com/board/view.php?uid=217807&table=seoprise9&issue1=&issue2=&field_gubun=&level_gubun=&mode=search&field=nic&s_que=류가미&start=&month_intval= |
제 목 ‘만듦으로/만드므로/만들므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6.04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사용하지만 정확한 용법을 따져 보면 혼동이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만듦으로/만드므로/만들므로’도
그러한 경우입니다.
아래의 경우 어느 말이 맞는지 얼핏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생에 만전을 기해 만듦으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위생에 만전을 기해 만드므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위생에 만전을 기해 만들므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먼저 ‘만듦으로’의 ‘만듦’은 ‘만들다’의 명사형입니다. 명사형이란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만듬’으로 잘못 쓰는 일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마당에 울타리를 만듦.
위의 문장에서 ‘만듦’은 문제가 없지만 ‘만듦으로’가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제대로 연결하고 있는지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문장은 앞의 문장 ‘위생에 만전을 기한다’가 뒤 문장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의 까닭이나 근거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사 ‘으로’를 쓰지 않고 연결 어미 ‘-므로’를 써야 합니다.
철수는 부지런하므로 잘 산다.
따라서 ‘만듦으로’는 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드므로’와 ‘만들므로’ 중에서 어떤 말이 옳을까요? ‘만들므로’가 맞는 말입니다. ‘만들-’은 ‘-므로’와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에서도 ‘ㄹ’이 탈락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만들므로 좋은 작품이 나올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만들면 결과가 좋을 것입니다.
정희창(국립국어원)
http://hangeul.seoul.go.kr/quiz/board_view.jsp?before_navinum=701&idx=743
프로이트는 동일시가 소유 구조보다 우선적이며 더 근원적이라고 말한다. 아이는 대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그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그는 <어머니의 젖가슴은 내 거야>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어머니의 젖가슴이야>라고 말한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동일시가 대상 지향적 사랑보다 더욱 근원적이고 대상 지향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 조건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시 대상 지향적 사랑을 기초로 하는 오이디푸스 체계로 되돌아간다. 근본적으로 서로 구별될 수 없는 동일시와 대상 지향적 사랑을 구분하고, 대상 지향적 사랑을 최종적인 설명의 원칙으로 삼으려는 프로이트의 의도는 무엇인가? 프로이트가 동일시를 겉모습일 뿐이라고 도외시하고 그것을 오이디푸스 구조로 환원시키려는 이유는, 동일시 속에서 드러나는 나와 타자의 반전 가능성 때문이다. 모든 것이 서로 대체 가능한 동일시 속에서는 어느 것도 기원적이고 진정한 것이 될 수 없다. 오이디푸스 가설은 동일시 속에서 드러나는 반전 가능성들을 안정된 구조 속으로 편입시켜 기원적 주체가 탄생하도록 한다. 사랑과 증오가 공존하는 동일시 속에서 구별될 수 없는 상태로 존재했던 나와 타자는 이제 자기 동일적 주체와 자기 동일적 객체로 구분된다. 구별, 분리, 차이로서의 아버지가 개입하고 어머니는 성적 대상으로 환원된다. 구별될 수 없는 것들이 분리될 때 의미가 만들어지고 차이를 근간으로 하는 상징적 의미들이 문화를 구성한다. 오이디푸스 삼각형은 이제 모든 문화의 보편적인 구조가 된다.
구조주의 이후의 프랑스 이론들이 문제삼는 부분이 바로 이 오이디푸스 구조의 보편성이다. 그것은 차이를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닫혀 있는 안정된 구조이다. 그러나 정신분석의 무대에서 모든 것은 반복되고 대체 가능하며 내부적인 저항에 열려 있다. 오이디푸스 구조를 이데올로기나 억압된 제도로 보고 그 구조 자체를 열어제치려는 여러 움직임들이 구조주의 이후의 프랑스 이론들을 특징짓게 된다.
알튀세르에게 오이디푸스 구조의 보편성은 무엇보다도 가족family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장치>들을 통해 구현된다. 아이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언어적 범주를 통해, 다시 말해 분리나 차이를 통해 의미를 발생시키는 가족 속에서 -- 예를 들어 근친상간은 아버지와 아들 또는 어머니와 아들간의 차이를 무화시키는 것이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 이미 항상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으며 자신의 위치를 부여받는다. 아이는 이미 존재하는 구조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인social 정체성을 자신의 것인 양 믿게 된다. 사회적인 것을 자율적인 것으로 오인하여 스스로를 자율적인 주체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알튀세르가 말하는 이데올로기이다. 호명interpellation이란 개념이 보여 주듯이 주체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소집되고 변형된 개인이다. 주체는 지배한다기보다 이미 종속되어 있다.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는 의식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허위 의식이라기보다 오이디푸스 구조처럼 지극히 무의식적인 것이다. 라캉의 상상계가 오인(誤認)에 기초한 것이긴 하지만 주체의 형성 과정에 꼭 필요한 경험인 것처럼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역시 허구이기는 하지만 주체를 주체로 만들어 주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알튀세르는 압축이나 전치와 같은 꿈의 기제들이 사회적 영역에서도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이미지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압축처럼,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시 말해 중층 결정되어overdetermined 있다. 그 요소들은 기계론적 인과론이나 총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미 서로 얽혀 있다. 더욱이 궁극적으로 생산 관계나 생산 양식에 의존하는 갈등들이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형태들 속에서 위장되고 생략되고 변형되어 드러난다. 이것은 마치 꿈속에서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자리를 바꾸어displacement 나타나는 것과 같다. 텍스트 역시 꿈처럼 조직되어 있다. 그러므로 텍스트가 말하고 있는 부분보다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더 중요하다. 텍스트가 억압하고 있는 부분, 의도적으로나 별다른 의도 없이 숨기고 있는 부분이나 단절, 틈새 등을 읽어 내는 것이 알튀세르의 징후 독법symptomatic reading이다.
블랑쇼의 말처럼 푸코는 정신분석학 자체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의 <고고학>은 이제까지 잊혀져 왔던 성sexuality의 역사를 추적한다. 성이란 이미 주어져 있는 자연적이거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란 개념처럼 역사의 산물이다. 19세기 이전에도 동성애는 여전히 비난받았지만 그것은 일탈적인 행위에 불과했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러 동성애는 더 이상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종>이라는 존재론적 질문으로 바뀌었다. 이제 동성애 행위가 아니라 그가 동성애자인가가 문제된다. 성은 존재나 정체성을 규정하는 비밀이 되어 <동성애자들>이 탄생한다. 광기 역시 질병이 아니라 역사이다. 이성에 의해 배제된 것들은 정신병으로 취급되어 감금되고 통제된다. 심리 병리학은 수용소 안에 배치되었던 모든 구조들을 의사 쪽으로 옮겨온 것에 불과하다. 심리학의 장치들은 비이성적인 것들을 은폐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는 수단일 뿐이다. 푸코는 정신의학이 숨기고 있는 지배 욕망을 읽어 낸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광기를 해방시킨다고 주장하는 학문 자체에 의해 광기가 억압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푸코가 억압 가설repressive hypothesis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억압 가설은 19세기에는 억압되었던 성이 현대에 와서 점차로 해방되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푸코에 따르면 19세기에 성은 억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종류의 담화(의사, 목사, 소설가, 심리학자) 속에서 만들어졌다. 성은 이질적인 현상들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고정되고 개인의 비밀이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 되었다. 성을 단순히 권력과 대립 관계에 두는 것은 오히려 권력의 편재성을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성은 권력에 의해 억압된 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생산된다. 우리는 성을 옹호함으로써 권력에 저항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권력은 자신과 반대되는 것까지도 지식의 형태로 만들어 낸다. 그러므로 푸코는 광기의 역사는 광기에 대한 정신분석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학문적 인식이나 철학적 이성에 포착되기 이전의 언어로 광기가 스스로 말하도록 내버려두겠다고 말한다. 그것은 광기가 주제인 동시에 주체인 역사이다. 그러나 데리다는 이것이 푸코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인 동시에 그의 가장 광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묻는다. 분석 상황에 독립해서 존재하는 분석가가 불가능하듯이, 이성의 언어를 완전히 벗어난 광기의 언어 역시 불가능하다. 광기의 중얼거림 역시 이미 이성적 언어에 의해 침윤되어 있다. 문제는 정신분석학이나 광기, 성 같은 것들을 대상으로 고정시켜 분석하지 않고 그것들의 역사를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광기 역시 이성적 언어를 통하지 않고는 나타날 수 없다는 점에서 광기와 이성적 언어는 이미 서로 중첩되어 있다. 문제는 단지 어느 한 쪽을 배제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대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요소들이 이미 서로에게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데리다는 이것을 유령 출몰haunting이라 부른다. 대립적인 요소들은 비가시적인 형태로 이미 서로의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다. 그러므로 체계를 지지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 속에서 체계를 능가하는 지점을 이야기해야 한다. 누구도 이 오염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데리다는 체계 속에서 체계로 환원될 수 없는 잉여물들을 구한다. 그것은 주로 주석, 서문, 후기들과 같은 주변적 요소margin들로서 단순히 본문을 보충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복시키거나 환치시킬 수 있는 보환supplement으로 작용한다. 데리다에게 텍스트의 무의식은 텍스트가 주장하는 것과 묘사하는 것 사이의 불일치 속에서 드러난다. 루소의 글쓰기를 다루는 방식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루소는 글쓰기를 배제한다고 공언해 놓고 실제로는 글쓰기가 이미 언어 속에 들어와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프로이트의 무의식 모델인 요술 책받침은 데리다에게 글쓰기의 모델이 된다. 무의식은 숨겨져 있는 진리,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차이 또는 글쓰기의 결과물이다. 요술 책받침은 씌어지는 동시에 지워짐으로써 계속 새로운 감각을 받아들일 수 있다. 동시에 이전의 것들은 왁스판 아래 흔적으로 남아 있다. 의미는 흔적으로 남아 있는 이전 것들과 새로운 감각들간의 차이에서 생긴다. 프로이트도 처음에는 글쓰기를 단지 기억을 돕는 도구로 생각했다. 그러나 점차 그는 글쓰기가 기억 자체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요술 책받침이 양손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글쓰기의 도움 없이 기억은 불가능하다. 글쓰기는 기억을 단순히 보충해 주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기억의 한가운데서 기억 자체를 가능하게 한다. 데리다는 이렇듯 개념 체계 속에서 그것을 능가하는, 다시 말해 그 개념을 가능하게 해주는 동시에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을 무의식과 연결시키려 한다.
알튀세르에게 오이디푸스 구조는 <이데올로기>였고 푸코에게는 <역사를 가진 것>이었으며 데리다에게는 <구조 속에서 구조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신분석의 3각형 구조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은 지라르에게서 온다. 지라르는 동일시가 대상을 소유하려는 욕망보다 우선적이라는 프로이트의 설명을 충실히 따라간다. 우리는 대상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을 모방한다. 우리의 욕망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정신분석 무대에서 나와 타자가 구분될 수 없는 것처럼 나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나의 욕망이 나만의 고유한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 라이벌이 그것을 욕망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욕망한다. 욕망은 일차적으로 모방하는 것이다. 지라르는 대상 선택을 기반으로 하는 오이디푸스 구조 속에 억압되어 있는 모방 욕망을 드러낸다. 욕망은 대상의 자질이나 주체의 기질에 의해 정의될 수 없다. 욕망은 욕망을 욕망한다. 욕망의 무대에서는 욕망의 주체나 욕망의 대상이 서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욕망은 늘 타자가 되려는 욕망이다. 타자가 가진 것을 원한다 해도 그것은 그 대상이 타자를 타자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라르는 이렇듯 대상과는 관계없는 <타자가 되려는 욕망>을 <형이상학적 욕망metaphysical desire>이라 부른다. 문화적이고 해석학적인 문맥을 생략한 채 억압된 것을 드러내어 더욱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미국의 프로이트 수용과는 달리 프랑스에서의 프로이트 수용은 실존주의나 데카르트가 해결하여 주지 못했던 <사회 속에서의 개인의 문제>, 다시 말해 사회성sociality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1)
지라르는 욕망이란 타자에 의해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헤겔의 공식을 더 밀고 나가 모방 욕망을 논한다. 반면 루스탕Franis Roustang은 타자와의 관계, 특히 분석가와 피분석자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전이>의 문제를 다룬다. 분석의 목적은 전이를 없애고 피분석자를 분석가로부터 독립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쉽지 않다. 오히려 전이를 통해 분석가들은 피분석자를 종속시키고 그들을 제자로 만들려 한다. 전이가 만들어 내는 이런 종속 관계는 프로이트나 라캉을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던 욕망이기도 했다. 프로이트는 <제도>나 <협회>를 통해 권위를 행사하려 했던 반면 라캉은 순전히 개인적인 카리스마에 의존했다. 그는 자신을 초현실주의적 대상으로 만들고자 했다. 전이가 갖는 이런 권위적 측면은 그것이 최면과 연결될 때 더욱 심화된다. 최면은 피분석자를 더욱 분석가에게 종속시키는 마법적 힘이다. 정신분석학은 최면이나 전이의 문제와 결별해야 한다. 루스탕이 전이가 갖는 권위나 지배욕에 천착했던 반면 야콥센Mikkel Borsch Jacobsen은 전혀 다른 이유로 최면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부각시킨다. 최면은 권위를 통한 종속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 심리에 근원을 둔 것이다. 왜냐하면 최면 속에서 우리는 정신분석학의 무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체/객체의 구별이 사라지고 동일시가 지배적인 최면 속에서 <나는 타자이다>, <나는 타자의 장소에서 말한다>. 바로 여기서 야콥센은 지라르와 만난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앙티 오이디푸스』에서 정신 분열증적 욕망을 이야기한다. 오이디푸스 구조는 그들에게 자본주의 담론의 상품성을 보장해 주는 구조일 뿐이다. 그들은 욕망이 규정된 길로 통하게 되어 있는 자본주의적 오이디푸스 구조에 반대하여 자본주의 생산의 상징 질서를 잠재적으로 작동 불가능하게 하는 욕망의 정신 분열증적 유출을 지지한다. 그들은 정신 분열증적 욕망의 유동적이고 다양하게 분출하는 강렬함, 사회 제도나 법의 억압적 기능에 저항하는 강렬함에 찬사를 보낸다.
오이디푸스 구조 중 가족 구조는 리비도적 욕망을 억압하는 주된 제도적 양식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오이디푸스 이전 단계pre-Oedipal로 되돌아가 (오이디푸스적) <주체 없는 기계>를 말한다. 다차원적이고 비연속적이며 가변적인 오이디푸스 전단계의 욕망들은 오이디푸스를 통해 억압 구조 속으로 약호화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모든 무의식적 생산을 가족의 근친 상간적 영역으로 일임하면서 욕망을 <개인화>한다. 정신 분열증은 동일시, 범주화, 차별화를 거부한다. 무의식적 욕망은 단순히 불확정적, 비개인적이며 재현될 수 없다. 무의식적 욕망은 욕망하는 기계이다.
크리스테바 역시 전제적인 상징계에 대항하기 위해 오이디푸스 이전 단계로 향한다. 거기서 그녀가 마주치는 것은 비천한 어머니abject mother와 상상적인 아버지imaginary father이다. 그러나 오이디푸스 이전 단계를 지칭하는 그녀의 모든 개념들은 이미 상징 질서에 침윤되어 있다. 그녀는 정신분석의 무대에서 대상보다는 동일시가 우선시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어떤 것도 순수한 형태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 기호계the semiotic는 상상계 이전의 단계이지만 이미 상징적 의미에 침윤되어 있다. 말word과 육체flesh는 같이 있다WORD FLESH. 오이디푸스 구조에서 억압되어 있는 것은 모성적인 기호계와의 만남, 즉 어머니와의 동일시이다. 비천한 어머니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어머니는 아직 대상이 아니고 아이 역시 아직 주체가 아니다. 비천한 것은 자기 동일성을 갖기 전, 주체나 객체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다. 비천한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지만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이는 주체로 탄생하기 위해 비천한 것들과 분리된다. 그런 의미에서 비천한 것은 원초적 어머니와 연관된다. 아이는 상징적 질서로 진입하기 위해 원초적 어머니와 분리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남아 있다. 아이는 어머니를 증오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어머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체라고도 객체라고도 할 수 없는 이 비천한 육체가, 이 비천한 육체와의 동일시가 상징 질서를 불가능하게 하는 동시에(안/밖의 구분, 주체/객체의 구분을 와해시킨다) 가능하게 한다(비천한 육체와의 분리를 통해).
크리스테바는 비천한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동시에 상상적인 아버지를 말한다. 상상적인 아버지는 권위나 법으로 나타나는 라캉의 엄숙한 아버지와는 달리 사랑의 아버지이다. 사랑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혼합물이다. 그것은 성차를 모른다.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라는 점에서 이미 이 단계에도 어머니의 육체 속에 상징계의 논리가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상상적인 아버지는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환유적 아버지 이전에 존재하는 은유적 아버지이다. 아이는 은유적 아버지와 동일시함으로써 비천한 어머니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상상적 아버지는 아이로 하여금 비천한 어머니와의 동일시 속에서 잡혀 먹지 않고 분리될 수 있도록 해준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혼합물인 상상적 아버지는 어머니와 그녀의 욕망이 결합된 것이고 어머니 속의 아버지이며 모성적인 아버지이다. 크리스테바에게 오이디푸스 구조를 넘어서는 두 가지 방식은 비천한 어머니와 상상적인 아버지이다. 여기서 지배적인 것은 주체와 객체의 분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동일시이다. 크리스테바가 비천한 어머니뿐만 아니라 상상적인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것도, 또 상상적인 아버지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혼합물인 이유도 주체/대상, 남성/여성의 대립 구조가 불가능해 지는 동일시 때문이고, 그런 점에서 그녀는 모든 것은 오염되어 있다는 정신분석학 무대의 논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구조주의 이후 프랑스 이론가들이 프로이트에게 배운 것은 정신분석학이 관객의 위치를 허용하지 않는 무대라는 사실이다. 정신분석의 무대 속에서 행해지는 것은 우선적으로 동일시이다. 이 단계에서 주체와 대상은 구별되지 않으며 나는 타자이다. 구분되지 않는 혼합물들을 주체와 대상으로 분리하는 차이 또는 법으로서의 아버지가 등장하면서 오이디푸스 구조가 시작된다. 오이디푸스 구조는 이미 그 속에 자신을 전복시킬 수 있는 동일시의 구조를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있을 뿐이다. 프랑스 이론가들이 개입하는 곳은 바로 이 지점이다. 그들은 오이디푸스 구조의 폭력성을 때로는 억압적 태도로, 때로는 이데올로기로, 때로는 전이라는 마법적 권위 등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오이디푸스 구조 속에서 그 구조를 능가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초월하기도 한다. 그들의 논의 속에서 오이디푸스 구조는 역사적인 구성물로, 폭력적인 억압 구조로,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의 폐쇄 회로로 드러나며 모든 것이 혼합물로 존재하는 오이디푸스 전단계를 통해 초월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프로이트라는 좌절/매혹의 기표이다. 욕망의 대상, 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대상으로서 프로이트는 이론의 욕망을 촉발시키는 동인으로 남아 있다. 데리다의 말대로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신분석이다>.
1) 프랑스에서의 프로이트 수용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Eugene Webb, The Self Between : From Freud to the New Social Psychology of France (Seattle : Univ. of Washington Press, 1993) 참조.
글쓴이 민승기는 경희대 영문과를 졸업했고 동대학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희대 강사, 인문학 연구소 연구 위원이다. 주요 논문으로 좥폴 드만, 이론에의 저항좦, 좥라캉이라는 이름의 기표를 애도하기좦, 좥라캉의 타자좦, 좥바바의 모호성좦, 좥해체론과 문학좦 등이 있고 역서로 『욕망 이론』(공역), 『포스트모던의 조건』(공역), 『포스트모더니즘과 문화』(공역) 등이 있다.
미메시스(http://openbooks.co.kr/mimesis/), 1999
자크 라캉(1901∼1981)은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 분석가이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문학계에 먼저 소개된 까닭에 문학가로 잘못 알려져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의 첫 논문이 편집증이란 정신병에 관한 연구였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정신과 의사이다. 오히려 그의 혁명적인 이론이 문학 동네나 영화 마을 같은 곳에서 너무나 잘 활용되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 또한 페미니즘과 정치, 경제, 사회를 비롯하여 미술에 이르기까지 어느 분야에서나 그의 정신분석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런 만큼 오해도 많다. 그래서 라캉은 제대로 알려져야 하고 제대로 알아야 하는 학문이다.
그러나 라캉을 읽어 내는 일이란 까다롭기 그지없는 일이다. 오죽했으면 멀러와 리차드슨은 라캉의 유일한 논문집인 『에크리럄rits』를 읽는 일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작업이라 했을까! 흔히들 『에크리』를 수수께끼 그림에 비유한다. 수수께끼 그림이란 언뜻 보기엔 무의미한 조각들을 따로따로 이해한 다음 그 조각들을 맞춰 봐야 겨우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라캉의 문체 때문이다. 라캉은 『에크리』의 서문에다 <문체란 우리가 말을 건네는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써놓았다. 제인 갤럽도 라캉의 텍스트를 충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말하는 존재>인 인간은 언어에 있어서 <거세>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캉은 1960년대 초 카라카스에서 열린 라카니언들의 학술 대회에 참석하여, 당신네들은 지금 라카니언이라고 여기 모인 모양인데 그 자신은 프로이디언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가 그렇게 주장하듯이 그의 글에는 항상 프로이트가 따라 다닌다. 거꾸로 말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 같다. 그의 중요한 이론에는 거의 언제나 프로이트의 텍스트가 참조되고 있다. 따라서 라캉식으로 정신분석을 읽어 내는 일은 언제나 프로이트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라캉의 구호처럼 <프로이트에게로의 귀환>이다. 물론 그의 제자들은 국제 정신분석학회로부터 <파문>당한 1964년에 열렸던 라캉의 열한 번째 세미나, 『정신분석의 네 가지 기본 개념』에서 라캉이 처음으로 라캉답게 말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정신분석이란 무엇인가? 가장 짧게 말해서, <정신분석학은 무의식의 발견에 기초하여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의해 시작된 이론이며 임상이다>. 다시 프로이트의 말을 빌리면, 정신분석이란 무의식적 정신 과정을 탐구하는 방법이고, 신경증의 치료 방법이며, 연구와 치료 방법에 나타난 정신 과정에 관한 이론들인 셈이다.
라캉은 정신분석을 <받으러> 오는 환자를 피분석자analys 아닌 분석 실행자analysant로 부른다. 분석을 당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스스로 분석을 행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그는, 우리들 가슴속 깊이 숨겨 놓은 무슨 흉측한 본능의 덩어리로 이해되었던 무의식을 대타자le grand Autre와 말을 나누는 자리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무의식을 우리들의 <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긴 뫼비우스의 띠에서 본다면 안과 밖, 윗변과 아랫변이 구분되지 않는다.
프로이트에게 처음으로 정신분석 치료를 받은 <안나 오Anna O.>라는 여인은 그 치료를 <대화 치료>라고 불렀다. 그녀가 앓았던 병은 히스테리라고 알려져 있다. 첫 증상은 심한 기침으로 시작되었지만 손발이 마비되어 굳어지고 감각조차 없어진다. 마치 <신경성>이 아니라 진짜 <신경이 고장난> 것처럼 보이는 전형적인 히스테리다. 사팔뜨기에 목 근육까지 마비되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들을 수 없다. 그러다가도 갑자기 독일어가 아닌 영어로 이야기한다. 음식을 거부하다가 브로이어 박사한테 먹여 달라고 한다. 물도 삼키기 어려울 때도 있다. 가끔은 환각에 시달린다. 요즘의 진단 기준으로는 분명히 히스테리성 정신병이다.
프로이트보다 열네 살이나 많은 브로이어 박사가 1년 반 동안 빈의 상류 사회 출신인 그녀를 진료했다. 한때 브람스의 주치의를 맡았을 만큼 브로이어 박사는 그 당시 빈의 내로라 하는 명사들을 도맡아 치료하는 명의였다. 브로이어 박사는 정말 성실한 의사였다. 하루에 두 번도 마다하지 않고서 안나 오에게 왕진을 다녔다. 치료 방법은 최면술이었다. 그녀는 증상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나면 눈 녹듯이 그 증상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야기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후련했으면 그녀가 이 대화 치료를 <굴뚝 청소>라고도 불렀을까. 일종의 <카타르시스> 방법인 셈이다. 그런데도 프로이트의 제자를 자처하는 요즘의 분석가들은 <말>을 무시한다. 이 틈새를 노려 라캉은 소쉬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을 빌려 와 프로이트를 재해석하고 있다.
벤베누토는 『라캉의 정신분석 입문』에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주체의 욕망은 말로 표현된다. 욕망은 분석가라는 타자 앞에서 말로 표현되고 이름이 붙어야 그 인식이 가능하다. 또한 주체가 자신의 역사를 온전히 알게 되는 것도 말에 의해서다. 언어의 존재라는 사실이 과거의 관점을 바꿔 놓는다. 주체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야 그 사건들을 재구성할 수 있다. 분석 경험을 통해 주체는 자신이 지닌 기억의 흔적들을 끊임없이 재정리하게 된다. 환자는 분석가한테 말하는 동안 자신의 역사를 드러내는데 이것이 증상을 없애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환자는 과거의 사건을 단순히 꺼내 놓기만 하는 게 아니다. 그 사건들을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라캉은 오로지 말만이 이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한다. 과거의 사건들이 흔적으로 남겨 놓았던 과거의 권능은 오직 말만이 입증해 줄 수 있다.
정신분석 과정에서 간혹 환자와 의사한테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 분석중에 안나 오가 임신했다. 물론 상상 임신이다. 자궁 속이 아니라 마음속에 생긴 아이다. 물론 그 아비는 그녀가 상상 속에서 사랑했던 브로이어 박사였다. 결국 그녀는 진통 끝에 상상의 아이를 낳는다. 그러니까 진통까지도 히스테리 증상이다. 훗날 안나 오의 치료를 떠맡은 프로이트는 이런 현상을 <전이의 사랑>이라 불렀다. 브로이어를 향한 전이의 사랑이 브로이어로 하여금 그녀의 치료를 중단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이의 사랑은 여성 환자를 많이 보아 온 프로이트에게도 예외일 수가 없었다. 그 당시에 벌써 전이는 정신분석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했는데, 그때에 전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 중요한 인물에게 붙어 있던 감정이 분석가에게 옮겨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라캉은 전이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실제로 이 사랑을 분석가가 지니고 있을 것 같은 무의식적인 지식, 즉 본식(本識, savoir)에 대한 사랑으로 이해한다.
그런 말들을 이해하려면 거울 단계와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알아야 한다. 프로이트는, 자가 성애 단계로부터 자기애 단계로 이행해 갈 때 분명 어떤 <새로운 정신 작용>이 끼여드는 것을 감지했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것을 라캉은 거울 단계로 해명하고 있다. 거울 단계란 생후 6∼18개월 사이에 거치는 자아의 형성 단계이다. 이러한 거울 단계를 통하여 자아가 말짱 헛것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 따라서 자아를 강화시킨다는 것은 이 사회에 순응하는 인간을 만들 뿐이다. 자아 심리학에서의 피분석자는 위대한 분석가를 동일시한다. 그러나 그것이 분석의 목표가 될 수 없다. 욕망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욕구와 요구와 욕동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아버지의 이름은 어머니와 아이 사이의 2자 관계로부터 3자 관계로 이행할 때 끼여드는 새로운 항목이다. 이러한 부명(父名)에 의해 상상계로부터 상징계로 발전해 가게 된다. 소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해소하는 데에 부명(父命)이 필요하다. 아버지의 명령과 아버지의 이름을 부명이란 한자를 가지고 말장난하는 것은 <이름nom>과 <안돼non>라는 동음 이의어로 말장난을 시작한 라캉의 흉내를 내본 것이다.
유달리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는 인간은 엄마와의 2자 관계 속에서, 다시 말해 아무런 부족함도 없는 상상계 속에서 자라다가 부명이란 기호에 의해 마침내 상징계 속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때서야 인간은 언어의 법칙과 사회의 법칙이 지배하는 문화 세계의 일원이 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가 사용하는 언어는 시니피에를 잃어버린 시니피앙의 지배를 받는다. 아마 최초의 시니피앙이 선악과였던 것 같다. 지혜의 열매를 따먹고 하느님과 비슷한 지혜를 얻으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부끄러운 나체를 지니고서 영원히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고 마는 것이다. 그 뒤로 인간은 결코 되돌아갈 수 없는 에덴에 대한 향수를 앓기 시작한다. 고국을 떠난 고아로서 영원히 이 세상을 떠돌며 헤매야 한다. 그것이 바로 <떠도는 시니피앙>이다. 라캉은 『에크리』를 편집할 때 자신의 논문들을 <도둑맞은 편지에 관한 세미나>처럼 읽으라는 듯이 그 논문을 제일 앞에 배열했다. 소설 『이어도』를 정신분석한 나의 졸고, <떠도는 능기(能記)>는 이것을 흉내내어 쓴 것이다. 능기는 시니피앙의 번역어이다. 이렇게 라캉의 정신분석은 시니피앙을 위주로 하는 정신분석이다. 우리가 언어를 부리며 사는 줄 알았는데 라캉 덕분에 우리는 오히려 언어의 노예가 되어 있음을 마침내 깨닫게 된 것이다.
중요하면서 혼란을 일으키는 개념이 남근이다. 먼저 말해 둘 것은 이 남근이 남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라캉이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 둔 것도 아니다. 그는 오히려 부정법으로 일관된 정의를 내렸을 뿐이다. <남근은 환상이 아니다. 어떤 대상도 아니다. 음경이나 음핵과 같은 기관은 더 더욱 아니다.> 그러나 여성주의자들이 라캉의 이론에 빚을 졌으면서도 라캉을 남근 중심주의자라고 비난하는 까닭은 역시 <특권을 지닌 시니피앙>이라는 이 남근 개념 탓이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은 남근이란 개념을 오해했기 때문이다. 남근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핵심이 되는 거세 불안을 푸는 열쇠이다. 남근이 음경의 표상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단지 갖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정신적인 표상일 뿐이다. 여기서 음경이 선택된 까닭은 몸에서 유난히 돌출된 기관인 데다가 생명력이 용솟음치는 것 같은 그 신축성 때문이다. 조상들의 무덤 앞에 쑥돌로 잘 다듬어 성석(性石)을 모셔 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어린아이가 아무런 부족함도 없으리라 상상했던 엄마에게 바로 그 남근이 없음을 알고는 자신도 언젠가는 귀중한 그것이 잘려 나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것이 거세 불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거세당한 남자 아이도 없고, 아예 처음부터 갖지도 않은 여자 아이는 거세당할 리가 없다.
한때 프로이트는 최면이 잘 걸리지 않는 환자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 주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그는 중요한 생각이든 그렇지 않든, 기분 좋은 생각이든 아니든, 떠오르는 대로 무엇이든 이야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그저 귀기울여 듣기만 했다. 그 결과 환자에게 떠오르는 것은 그 무엇이나 어떤 식으로든 무의식의 갈등과 관련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최면으로부터 자유 연상으로 옮겨 가는 기념비적인 과정이다. 그러니까 환자는 고통의 주체로서 분석가를 찾아왔다가 자유 연상을 통해 드디어 사유의 주체로 변하게 된다. 하지만 데카르트식의 <사유=존재>는 아니다. 사유의 주체가 실존일 수는 있어도 그 주체의 본질이나 진실은 아니라는 뜻이다. 사실 분석 시간에 분석 실행자가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그의 꿈 이야기나 그의 실언과 농담, 하물며 그의 망상이나 환청까지도 그의 무의식의 주체를 찾아가는 귀중한 <꽉 찬 말>이다.
필자 역시 이미 죽은 라캉한테 전이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을 해소할 방편으로 문학 작품을 통해 무의식의 주체를 체험해 보려고 시도해 왔다. 라캉은 분석가가 되는 첫번째 요건이 문학 수업이라고 봤다. 실은 프로이트가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문학 작품을 정신분석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문학 작품을 작가의 증후로 보고 그 증후를 분석하여 작가를 진단하는 작가 연구이거나 작품 속의 주인공을 정신 병리적으로 분석해 내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라캉식의 접근 방식은 전혀 다르다. 문자에 관한 해석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정신분석은 시니피앙을 위주로 하는 정신분석이기 때문이다. 텍스트의 해석은 욕망과 공격성에 의한 행위이다. 라캉을 해석하는 일도 라캉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출발하여 라캉을 살해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해석이란 전이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 되고, 독서에서의 해석은 전이의 분석을 수반하게 마련이다.
글쓴이 김종주는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천기독병원 신경정신과장을 거쳐 현재 김종주 신경정신과 의원 원장이다. 1991년 파리에서 열린 라캉 서거 10주년 학술 대회에 참석했고, <한국 라캉과 현대 정신분석 학회>를 창립한 뒤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라캉 학회 회원이다. 문학에도 관심을 보여 1993년 『예술세계』 문학평론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했다. 『라캉 정신분석과 문학평론』, 『라캉 정신분석 입문』 등의 저서가 있다.
미메시스(http://openbooks.co.kr/mimesis/), 1999
애절양
哀絶陽
(성기 끊음을 슬퍼하다)
정약용
갈밭마을 젊은 아낙
설리설리 우는 소리
관문 앞 달려가 통곡하다
하늘보고 울부짖네.
출정나간 지아비 돌아오지 못한 일이야
그래도 있을 법한 일이로되
사내가 제 양물을 잘랐단 소리
예로부터 듣도 보도 못하였네.
시부님 삼년상 벌써 지났고
갓난 아인 배냇물도 안 말랐는데
이 집 삼대의 이름이
모두 다 군적에 실렸구나.
관가에 가서 억울한 사정 호소하재도
범 같은 문지기 버티어 섰는데
이정(里正)은 으르렁대며
외양간의 소마저 끌어갔다오.
남편이 식칼 갈아 방안으로 들어가더니
선혈이 자리에 흥건히
스스로 부르짖길
"이 바로 자식 낳은 죄로다!"
잠실궁형(蠶室宮刑)은
어찌 꼭 죄가 있어서던고?
민땅의 어린애 거세하던 풍속
참으로 가엾은 일이었거든
만물이 낳고 살아가는 이치
하늘이 내려주심이니
음과 양이 어울려서
아들이요 딸이로세.
말이나 돼지 불알까기도
슬프다 이르겠거늘
하물며 우리 인간
대 물리는 일 얼마나 소중하냐?
부자집들 일년 내내
풍악 울리고 흥청망청
이네들은 한톨 쌀 한치 베
내다 바치는 일 없거니
다 같은 백성인데
이다지 불공평하다니
객창에 우두커니 앉아
시구편을 거듭거듭 읊노라.
| [동서양사상비교] 데리다와 장자의 글쓰기 |
| 데리다와 장자의 글쓰기 |
| 이승훈 _ 한양대 교수 / 시인 |
|
데리다(J. Derrida)는 1930년 알제리에서 태어난다. 그는 1959년부터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고 파리고등사범학교 교수를 역임한 유대계 학자로 1965년 역사와 글쓰기를 다룬 책에 대한 장문의 서평을 발표하면서 대중의 시선을 끈다. 그는 1967년 세 권의 저서 《문자학(of grammat-ology)》, 《목소리와 현상(speech and phenomena)》, 《글쓰기와 차이(writing and differenc)》를 동시에 출판하면서 소쉬르, 후설, 프로이트에 대한 비판적 읽기를 통해 이른바 해체적 읽기 혹은 해체적 접근을 철학에 도입한다. 특히 1969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인문과학 담론에서의 구조, 기호, 놀이》를 발표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이른바 해체주의 선풍을 일으킨다. 말과 글을 초월하는 글쓰기 위의 세 저서 가운데 《문자학》은 글쓰기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강조하고 그것은 크게 소쉬르의 구조 언어학을 대상으로 한다. 물론 루소, 레비-스트로스, 하이데거, 니체 등도 대상으로 하지만 나는 이 글에서 주로 소쉬르의 언어 개념을 해체하는 그의 글쓰기 개념을 간단히 살피고 그가 강조하는 글쓰기와 장자의 언어 혹은 글쓰기를 비교하기로 한다. 그는 세 가지 수준에서 소쉬르를 비판한다. 첫째는 언어에는 차이만 존재한다는 소쉬르의 명제이고, 둘째는 언어 기호를 구성하는 기표(signifiant)와 기의(signifiie)가 자의적 관계에 있지만 소쉬르의 경우 궁극적으로 기의, 그것도 초월적 기의를 강조함으로써 이성중심주의를 지향한다는 것. 셋째는 문자 체계의 2차성이다. 소쉬르에 의하면 문자 체계의 기능은 언어를 표기하는 2차적 기능이고 언어는 음성 언어를 대상으로 하고 문자 체계는 배제한다. 따라서 소쉬르는 문자 체계, 글쓰기보다 음성 체계를 강조하고 결국 음성중심주의를 지향한다. 첫째로 언어의 본질이 차이에 있다는 소쉬르의 주장. 그에 의하면 언어 속에는 오직 차이만 존재하고 이 차이는 실체적 항목들의 차이가 아니라 이런 항목들이 존재하지 않는 차이이다. 말하자면 기표든 기의든 언어는 언어 체계 이전에 존재하는 관념이나 소리를 소유하는 게 아리나 오직 체계가 환기하는 개념적 차이와 음성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F. D. Saussure, Course in General Linguistic, trans. w. Baskin, Philosophical Library, New York, 1959, 120). 이런 주장은 요컨대 언어는 체계이고 체계는 요소들의 관계, 곧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띠라서 기표와 기의가 의미를 소유하는 것도 체계 밖의 사물과는 관계없고 오직 체계에 의해, 그러니까 각 요소들의 차이에 의해 의미를 생산한다. 예컨대 ‘나’라는 낱말은 실체를 지시하거나 그런 실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칭 체계 곧 ‘나/너’의 차이에 의해 의미를 생산한다. ‘나’라는 낱말이 기표의 수준에서 그렇다면 ‘산’이라는 낱말은 기의의 수준에서 ‘산/들’의 차이가 의미를 생산한다. 그러나 데리다에 의하면 이렇게 구조적 차이로만 존재하는 요소들 역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말하자면 차이에 의해 각 요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차이에 앞서 존재하는 혹은 차이를 가능케 하는 어떤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예컨대 음성적 요소가 감각적인 것은 이 요소에 형식을 부여하는 차이 혹은 대립을 전제로 한다. 쉽게 말하면 차이에 앞서는 순수한 차이, 운동이 있다는 것. 한 요소가 음성적 실체로 환원되는 것은 이런 차이 때문이다. 이런 차이는 기원적 종합을 전제로 하고 이런 종합을 기원적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적 경험의 최소 단위 속에는 언제나 과거 파지(retention)가 있고 이렇게 타자를 보유하는 흔적이 없다면 차이도 없고 의미도 나타날 수 없다. 따라서 문제는 구성적 차이가 아니라 오히려 내용이 결정되기 전에 순수한 운동이 차이를 생산한다는 점이다. 요컨대 순수한 흔적이 차연(differance)이다. 차연은 감각과 지성을 초월하며 기호의 분절을 허용하고 기표와 기의, 표현과 내용, 말과 글의 분절을 허용한다. 이런 의미에서 언어는 이미 글쓰기(ecriture)이다. 한 마디로 차연은 형식을 형성한다(J. Derrida, Of Grammatology, trans. G. C. Spibak,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1974, 62~63). 이런 주장을 통해 데리다가 강조하는 것은 소쉬르가 말하는 언어에는 차이만 있다는 주장을 해체한다. 그는 소쉬르에 기대 소쉬르를 뚫고 새로운 개념/비개념에 도달한다. 소쉬르는 차이를 강조하고 데리다는 이 차이 너머 있는 것, 이런 차이를 형성하는 것, 곧 차연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차연은 순수한 운동이고 순수한 흔적이고 그가 말하는 광의의 글쓰기이다. 결국 그가 말하는 글쓰기는 협의의 글쓰기가 아니고 그가 애용하는 차연, 흔적, 텍스트 등과 비슷한 개념이다. 우리는 흔히 말과 글, 말하기와 글쓰기를 구분한다. 그러나 데리다가 강조하는 것은 이런 구분, 차이, 형식을 가능케 하는 글쓰기이고 그런 점에서 광의의 글쓰기이고 원-글쓰기(arch-ecriture, arch-writing)이다. 이런 글쓰기는 기원적 흔적이고 차연이고 협의의 말과 글을 초월하고 협의의 말과 글 이전에 있다. 차연은 시간/공간의 2항 대립이 해체되는, 그런 점에서 존재·사물·언어는 자기동일성이 없고 있는 건 오직 시간적 지연과 공간적 차이이다. 앞에서 낱말의 의미는 절대적으로 현존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과거의 의미를 파지한다고 했거니와 이제 좀더 자세히 데리다가 말하는 글쓰기, 곧 광의의 글쓰기가 협의의 말/글 속에 어떻게 기원적 흔적으로 드러나는가를 살피기로 한다. 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잊어버려라 일본 철학자 도시히코는 데리다의 에크리튀르를 다음처럼 분석한 바 있다. 요약하면 이렇다. 먼저 협의의 글쓰기, 소쉬르의 용어로는 문자 체계의 경우 공간성은 존재하고 시간성은 완전히 부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a-b-c-d의 순서로 글을 쓰는 경우 공간성은 그대로 존재하고 시간성, 곧 계기적 질서 역기 완전히 소멸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a를 적고 다음에 b를 적을 때 a는 앞에 존속하고 c를 적을 때도 앞에 b가 존속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협의의 글쓰기는 전통적으로 인식된 것처럼 공간성만을 특성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한편 말, 소쉬르의 용어로는 발화(parole)의 경우 공간성은 소멸하고 시간성의 지배를 받는다. a를 말하고 다음 b를 말할 때 a는 소멸하고 c를 말할 때 다시 b가 소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소멸은 기표의 경우에 해당하고 기의의 경우에는 a를 말하고 다음 b를 말한다고 해서 a의 의미가 완전히 소멸하는 게 아니라 b는 a의 의미의 흔적을 거느리고 c를 말할 때 역시 c는 b의 의미의 흔적을 거느린다. 그러므로 말에도 공간성이 있다. 요컨대 글은 공간적이고 말은 시간적이라는 2항 대립은 해체된다. 왜냐하면 글에는 시간의 흔적(기표)이 남고 말에는 공간의 흔적(기의)이 남기 때문이다. 도시히코가 강조하는 것은 말의 경우 기표의 계열 a-b-c-d는 시간적 순서를 유지하지만 기의 a,b,c,d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 그것은 고정성이 없고 이런 가동성, 흔적이 데리다의 원-글쓰기에 해당한다(이즈쓰 도시히코[井筒俊彦], 《데리다의 에크리튀르론에 대해》, 의미의 깊이, 이종철 옮김, 민음사, 2004, 128~132). 그런 점에서 원-글쓰기는 협의의 글과 말의 경계를 해체한다. 데리다의 원-글쓰기, 기원적 흔적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말에도 있고 글에도 있다. 그리고 말과 글을 초월한다. 요컨대 원-글쓰기는 말과 글을 가능케 하고 밀과 글을 구분한다. 글의 시간적 흔적(기표)이 차연이고 말의 공간적 흔적(기의) 역시 차연이다. 이런 흔적은 실체가 없지만 실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구분·차이·대립 이전에 있으며 구분·차이·대립을 가능케 하고 생산한다. 그러므로 이런 글쓰기는 글을 생략한 글쓰기이고 따라서 언어뿐만 아니라 존재·세계·사물의 흔적으로 존재한다. 소쉬르는 차이를 강조하고 데리다는 이런 차이를 가능케 하는 차연, 흔적, 말/글의 차이를 가능케 하는 원-글쓰기를 강조한다. 그렇다면 장자는 무엇을 강조하는가? 장자는 외물(外物)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통발(筌)은 고기를 잡는 것으로 고기를 잡으면 그 발은 잊어버리고 토끼올무(蹄)는 토끼를 잡는 것으로 토끼만 잡으면 잊고 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말이란 사람의 생각을 상대편에게 전달하는 것이므로 생각할 줄을 알면 말은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어찌 저 말을 잊은 사람과 더불어 말을 할 수가 있을까?(《장자》, 이석호 역, 삼성출판사, 1976, 448) 장자에 의하면 말, 언어는 통발에 비유되고 토끼올무에 비유된다. 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잊고 토끼를 잡으면 토끼올무는 잊어야 한다. 말도 생각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러므로 생각을 전하면 잊어야 하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말을 잊는다는 것. 부처는 말을 뗏목에 비유하고(‘금강경’) 비트겐슈타인은 말을 사다리에 비유한다(비트겐슈타인, 《논리-철학 논고》, 이영철 옮김, 천지, 1991, 143). 뗏목은 강을 건너면 버려야 하고 사다리도 목표물에 도달하면 버려야 한다. 장자 역시 사용한 다음엔 잊고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생각할 줄을 알면 말은 잊어버리고 마는 것(得意而忘言)’이다. 뜻을 알면 말을 잊고 거꾸로 말을 잊으면 뜻을 얻는다. 선불교에서는 이심전심·교외별전·불립문자(以心傳心 敎外別傳 不立文字)를 강조하고 장자가 말하는 것 역시 크게 보면 비슷하다. 요컨대 그의 주장은 말을 잊으라는 것. 말을 잊기 때문에 글도 잊으라는 것. 아니 내가 읽은 바로는 장자의 경우 말과 글에 대해 별도로 말한 바는 별로 없고 따라서 글에 대한 장자의 생각는 말에 대한 그의 사유에서 유추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그러나 나는 어찌 저 말을 잊은 사람과 더불어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장자의 질문과 관련되는 바 뒤에 가서 살피기로 한다. 텍스트 바깥엔 아무 것도 없다 중요한 것은 장자가 말하는 잊기, 망각의 의미이다. 앞에서 나는 데리다의 소쉬르 비판을 세 가지로 요약한 바 있고, 그 둘째는 언어 기호를 구성하는 기표와 기의는 자의적 관계에 있지만 암암리에 소쉬르는 기의, 그것도 초월적 기의를 강조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먼저 기표와 기의는 자의성의 원리에 따라 결합된다. 예컨대 ‘산’이라는 기표(말소리)는 ‘산’이라는 기의(개념)와 결합할, 이 개념을 지시할 아무 필연성이 없다. 자의적으로 제멋대로 결합된다. 왜냐하면 같은 ‘산’이라는 기의가 영어에서는 mountain, 불어에서는 mont이라는 기표와 결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쉬르는 이런 자의성을 강조하면서도 도형으로는 기의를 위에 놓고 기표를 아래 놓는다(소쉬르, 위의 책, 66). 이런 도형이 암시하는 것은 기의가 기표보다 우위에 있고 기표를 지배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라캉은 이런 도형을 거꾸로 그려 기표의 우위를 주장한 바 있다. 결국 표면상으로는 기표와 기의가 상호의존적 관계로 나타나지만 그 심층에는 기의가 강조되고 이런 기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기표를 지배하고 기표를 끌고 간다. 결국 그는 암암리에 초월적 기의를 지향하고 이런 기의는 서양 형이상학을 지배한 이성중심주의와 통한다. 데리다에 의하면 소쉬르는 은연중에 초월적 기의, 이성을 강조하고 따라서 이성중심주의를 지향하고 아무튼 언어에 무슨 중심이 있다는 사유를, 사유의 흔적을 드러낸다. 데리다의 경우 언어는 차연이고 흔적이고 원-글쓰기이고 이런 언어는 시작도 끝도 없고 물론 중심도 없다. 그런 점에서 언어는 텍스트이다. 텍스트는 책이 아니다. 책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중심이 있지만 흔적, 차연, 원-글쓰기, 텍스트에는 시작도 끝도 중심도 없다. 그의 텍스트 개념을 요약하자. 그에 의하면 흔적은 경험의 시간화(temporalization), 그러니까 경험이 시간을 매개로 형성될 때 나타나고, 그런 점에서 경험은 세계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빛도 소리도 아니고 시간 속에도 없고 공간 속에도 없다. 이 경험의 시간화에 의해 차이들은 요소들 사이에 나타나고 아니 요소들을 생산하고 요소들을 나타나게 만든다. 이 차이들이 텍스트들, 연쇄들, 흔적의 체계들을 구성하고 이런 연쇄와 체계들은 흔적의 조직 속에서만 그 윤곽을 그릴 수 있다. 나타남(appearing)과 나타난 것(appearance)의 차이, 세계와 경험의 차이는 다른 모든 차이들의 조건이고 다른 모든 흔적들의 조건이고 이미 하나의 흔적이다. 이 흔적이 의미의 절대적 기원이고 다시 말하면 의미의 절대적 기원은 없다(데리다, 위의 책, 65). 데리다의 문장이 난해한 것은 그만큼 그의 주장이 기존의 논리나 사유로는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직역을 피하고 가능한 의역을 하면서 다시 요약한 그의 텍스트 개념은 ‘우리는 오직 기호에 의해서만 생각할 수 있다’(데리다, 같은 책, 50)는 그의 명제를 발전시킨 것. 기호를 통해서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소쉬르가 강조하는 초월적 기의는 존재하지 않고 나아가 객관적 현실, 사물, 지시물, 세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건 기호이고 이 기호는 그의 경우 시작도 끝도 없고 중심도 없는 흔적이고 놀이이다. 그런 점에서 그는 서구 형이상학의 전통, 곧 이성중심주의를 부정하고, 존재-신학과 현전의 형이상학을 전복한다. 살아 있는 경험은 세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시간적 질서 속에 있고, 시간적 질서는 예컨대 1분-2분-3분의 순서로 전개되지만 살아 있는 경험은 이 질서 어디에 있는가? 결국 경험의 시간화에 의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1분과 2분의 차이이고 1분, 2분 3분의 차이들이고 이 차이들이 1분, 2분이라는 요소들을 생산하고 텍스트, 연쇄, 흔적들을 구성한다. 이 흔적이 의미의 절대적 기원이고 그런 점에서 의미의 절대적 기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텍스트들, 흔적들의 체계이다. 세계 역시 흔적이고 놀이이다. 그러므로 텍스트 바깥엔 아무것도 없다. 텍스트 바깥이 텍스트 안이고 안이 아니다. 텍스트는 언어의 기원이고 기원 없음이고 또한 텍스트는 직물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이 세계에 산다는 것은 텍스트 속에 살면서 텍스트를 짠다는 의미이고 존재는 글쓰기이고 글쓰기는 텍스트 짜기이다. 요컨대 텍스트, 세계, 존재, 쓰기, 짜기, 흔적은 등가 관계에 있다. 이런 글쓰기가 원-글쓰기이다.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바로 글쓰기이다. 그렇다면 시작도 끝도 없고 중심도 목표도 없는, 공간적 차이와 시간적 지연만 있는 이런 글쓰기-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객관적 현실, 지시물, 세계가 소멸한 다음의 기호들의 놀이? 기표와 기의의 순수한 놀이? 이 놀이의 의미는 무엇일까? 장자의 꿈인가, 나비의 꿈인가 도시히코는 이 놀이를 마르소(M. Marceau)의 팬터마임에 비유하면서 다음처럼 말한다. 어두운 무대. 마르소의 손이 조명을 받으며 암흑의 저 밑에서 떠오른다. 손가락이 섬세하게 떨리면서 나비가 갑자기 춤을 추며 날아오른다. 마르소의 손가락이 나비의 꿈을 꾼다. 관객은 이 나비가 손가락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나비라는 것도 알고 있다. 손가락은 나비를 의미한다. 그러나 나비는 손가락이라는 기호의 지시물이 아니다. 나비는 현전하지 않고 현전하는 나비는 나비의 환상일 뿐이다. 지시물, 현실, 세계가 소멸한 뒤에는 기표와 기의만 남고 현실에서 해방된 기표와 기의의 놀이, 상호 얽힘이 존재라는 이름의 텍스트를 계속 짜고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데리다의 경우 나비를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마르소의 손가락까지 환상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도시히코, 위의 책, 118~121). 손가락이 나비의 꿈을 꾼다? 데리다 식으로 말하면 손가락은 기호이고 따라서 기호의 꿈이다. 문제는 데리다의 경우 나비는 환상이지만 손가락까지 환상은 아니라는 지적이고, 이런 지적 후에 도시히코는 데리다의 차연, 장자의 꿈, 나가라주나의 공(空), 선불교의 무(無)一물(物)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다. 도시히코의 이런 지적은 암시하는 게 많고 내 생각을 말하면 디음과 같다. 데리다의 경우 나비는 환상이지만 손가락은 환상이 아니고 장자의 경우에는 나비도 환상이고 손가락도 환상이라는 것. 데리다가 목적은 없지만 텍스트를 계속 쓰고 짠다면 장자는 이런 행위도 버리라고 말한다. 다 같이 현실, 초월적 기의, 세계를 부정하지만 데리다는 텍스트를 쓰고 짜는 주체, 쓰고 짜면서 태어나는 주체, 곧 텍스트적 주체를 인정하고 장자는 이런 자아마저 잊으라고 말한다(데리다의 텍스트적 주체에 대해서는 이승훈, 《탈근대주체이론-과정으로서의 나》, 푸른 사상, 2003 참고 바람). 다음은 장자의 말. 전에 장주(莊周)는 꿈에 나비가 되었다. 훨훨 나는 것이 분명히 나비였다. 스스로 줄겁고 장주인 줄을 알지 못했다. 그러다가 조금 뒤에 문득 깨어보니 분명히 장주였다.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꿈에 장주가 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겠다. 정주와 나비는 반드시 구분이 있을 것이니 이를 물화(物化)라고 한다(장자, 위의 책, 208). 마르소의 팬터마임에서는 손가락과 나비의 경계가 해체된다. 이때 해체란 손가락과 나비, 현실과 환상의 2항 대립이 깨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손가락은 나비이고 나비가 아니고 나비 역시 손가락이고 손가락이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손가락이 나비가 되는 것이지 나비가 손가락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점을 강조하자. 물론 손가락은 나비가 되면서 손가락도 아니고 손가락이 아닌 것도 아니다. 그러나 장자의 나비 꿈은 다르다. 무엇보다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꿈에 장자가 된 것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중요하다. 과연 이 꿈은 누가 꾸었는가? 물론 장자가 꾸었다. 그러나 장자가 강조하는 것은 꿈의 주체가 누구냐는 문제. 장자의 꿈인가? 나비의 꿈인가? 손가락과 나비의 경우는 주체가 손가락이고 장자의 경우는 이런 주체 문제가 소멸한다. 이른바 물화는 주체를 망각하고 객체를 따라 변화하는 삶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물화는 말 그대로 주체, 자아, 나를 잊고 대상, 객체, 사물이 되는 삶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른바 망아(忘我)가 물화이다. 한편 자아를 잊고 사물이 된다는 것은 자아를 망각했기 때문에 사물도 망각하는 경지이다. 왜냐하면 자아, 곧 의식이 없기 때문에 사물이 된 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화는 물망(物忘)이다. 사물이 되면서 사물을 잊는 경지. 그러므로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꿈에 장자가 된 것인지 장자 자신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물화는 물아양망(物我兩忘)이다. 장자는 언어를 고기 잡는 통발에 비유하면서 통발은 고기를 잡으면 잊어야 한다고 말하고 나는 앞에서 이 잊음, 망각이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그가 강조하는 잊음은 망아이고 결국은 물아양망이고 이런 경지는 ‘스스로 즐겁고 뜻대로’인 삶을 지향한다. 요컨대 물아양망은 물아해체이면서 해체 이상이고 망아는 차연이면서 차연 이상이다. 무슨 말인가? 물아해체는 주체와 객체의 2항 대립을 해체하고 이른바 서양 형이상학의 전통인 이성중심주의를 전복한다. 물아양망 역시 이런 2항 대립을 해체하고 이성중심주의를 전복한다. 그러나 물아양망은 해체가 아니라 망각이다. 주체도 객체도 망각하라는 것. 차연은 절대적 자아, 현존을 부정하고 공간적 차이와 시간적 지연만 강조한다. 망아 역시 절대적 자아, 현존을 부정한다. 그러나 망아, 곧 자아를 망각하는 것은 물화, 곧 사물이되는 것이고 이 사물 역시 망각하는 것, 곧 물망과 통한다. 그러므로 차연도 초월하는 경지이다. 이 경지가 유(遊)이고(소요유) 심제좌망(心齊坐忘, 제물론)이다. 데리다가 텍스트, 원-글쓰기를 강조한다면 장자는 텍스트 너머를 추구하고 말, 언어, 문자, 글쓰기를 버리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장자는 어찌 저 말을 잊은 사람과 더불어 말을 할 수 있을까 ? 글쓰기의 모험은 놀이의 모험이다 데리다의 소쉬르 비판 세 항목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겨둔 것은 문자체계와 언어의 관계이다. 다음은 소쉬르의 말. 언어와 문자체계(글쓰기)는 구별되는 두 개의 기호체계이며 글쓰기의 유일한 목적은 언어를 재현함에 있다. 언어적 대상은 쓰여진 낱말과 발음된 낱말의 결합이 아니다. 언어적 대상을 구성하는 것은 발음된 낱말이다. 그러나 발음된 낱말은 쓰여진 낱말의 이미지와 밀접히 결합되기 때문에 쓰여진 낱말이 중심 역할을 빼앗고 따라서 우리는 기호 자체보다 음성 기호의 쓰여진 이미지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한다. 이런 실수는 마치 사람을 직접 보는 것보다 그의 사진을 볼 때 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소쉬르, 위의 책, 23~24). 요컨대 소쉬르가 강조하는 것은 발음된 낱말과 쓰여진 낱말 가운데 발음된 낱말이 중요하다는 것. 언어는 개별적인 발화의 심층에 존재하는 법칙을 의미하고 따라서 발음, 음성을 토대로 하고 이 발음을 옮겨 적는, 재현하는 문자체계, 글쓰기는 2차적이라는 것. 그러나 데리다의 글쓰기는 이렇게 발음된 낱말을 옮겨 적는 글쓰기가 아니다. 말하자면 데리다의 글쓰기는 언어적 대상이 아니고 언어적 실체가 아니고 문자로 재현되는 그런 글쓰기가 아니고 흔적, 텍스트, 원-글쓰기이고 언어로 생산된 것이 아니라 언어의 생산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의 글쓰기는 소쉬르가 말하는 문제체계가 아니다. 그의 글쓰기는 소쉬르기 말하는 언어/문자체계, 발음된 낱말/쓰여진 낱말의 경계를 해체하고 나아가 이런 경계가 나올 수 있는 근거로서의 글쓰기를 강조한다. 다음은 데리다의 말. 지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간신히 지각된다고 가정하면 글쓰기는 일반적으로 언어의 특수한, 파생적, 보조적 형식(의사소통, 관계, 표현, 의미작용, 사고나 의미의 구성으로 이해되는)을 지시하는 게 아니고, 주요 기표의 비실체적 이중성, 곧 기표의 기표를 지시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언어의 외연을 넘어 발생하기 시작하며 언어를 포괄한다. 글쓰기라는 낱말은 기표의 기표를 지시하며 이상하게 생각되지만 기표의 기표가 우연한 이중성, 전락한 2차성으로 정의되지 않는 상태로 나타난다. 이와 반대로 기표의 기표는 언어의 운동을 기술한다. 그 기원에 있어서 확실히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조가 기표의 기표로 표현될 수 있는 기원은 자신을 생산하면서 자신을 은폐하고 지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기의는 언제나 기표로서의 기능들이다. 글쓰기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2차성은 모든 기의들에 영향을 주고 기의들을 이미 있게 하고 순간적으로 기의들을 놀이에 참여케 한다. 도망가고 다시 잡히는 단일한 기의는 없다. 언어를 구성하는 것은 의미작용의 놀이이다. 따라서 글쓰기의 모험은 놀이의 모험이다(데리다, 위의 책, 6~7). 데리다는 과연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명확한 판단을 보류하면서 계속 망설이면서 계속되는 그의 주장은 명확한 논리, 이성, 개념을 거부하는 논리이고 이성이고 개념이다. 그가 말하는 글쓰기는 언어 너머 있지만 언어를 포괄한다. 그것은 언어의 기원이지만 자신을 은폐하고 지우는 기원이다. 말하자면 글쓰기는 흔적이다. 글쓰기는 기표의 기표로 나타나고 기표의 기표가 언어의 운동이다. 그가 기표의 기표를 강조하는 것은 기표/기의의 관계가 소쉬르처럼 1 대 1로 고정되지 않고 한 기표의 기의는 다시 다른 기표가 되고 이런 기표의 기표가 언어의 운동이라는 것. 그러므로 기표의 기표는 언어의 기원이지만 언제나 흔적, 차이로만 존재/부재한다. 결국 글쓰기는 기표의 기표이고그러므로 단일 기의는 없고 기의들의 놀이가 있고 글쓰기의 모험은 놀이의 모험이다. 예컨대 낱말 놀이를 생각해 보자. 낱말 놀이는 낱말이 지시하는 사물이나 지시물과는 관계없이 이런 지시물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기호 자체만을 강조하면서 수행된다. 어떻게 수행되는가? ‘연못’을 보기로 들면 다음과 같다. ‘연못’이라는 기표(1)의 기의(1)는 ‘연을 심은 못’이다. 그러나 이 기의(1)는 다시 기표(2)가 된다. 왜냐하면 ‘연’의 기의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표(1)는 기의(1)를 매개로 기표(2)가 되고 그러므로 기표의 기표가 되고 기표의 기표의 기표로 발전한다. 어디 그뿐인가? 기의(1)는 다시 ‘심다’라는 기표(3), ‘못’이라는 기표(4)로 분열된다. 또한 ‘연못’은 순수한 기표의 수준에서는 ‘날아가는 연이 있는 못’이고 ‘날아가는 연과 벽에 박는 못’이고 이런 기표의 연쇄는 한이 없고 이런 식의 글쓰기가 놀이와 통한다. 말을 잊은 사람과 더불어 말하기 그렇다면 장자는? 장자는 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버리듯 말도 쓰고 나면 버리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말을 잊은 사람과 더불어 어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가 말을 잊으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이른바 물아양망(物我兩忘)을 목표로 한다. 이런 경지는 데리다가 말하는 놀이의 경지이면서 그런 놀이를 초월한다. 장자가 말하는 물아양망은 이른바 ‘소요유’의 유(遊)와 통하고 이 유는 놀이이면서 놀이를 초월한다. 물론 유는 놀이를 의미한다. 그러나 데리다가 말하는 놀이(play)와는 다른 의미이다. 아니 같으며 다르고 이런 놀이 개념을 수용하며 초월한다. 다음은 장자의 말. 혜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우리 집에 큰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이 가죽 나무라고 부르네. 그 밑둥은 혹투성이라 먹줄을 댈 수 없고, 그 작은 가지들도 꼬불꼬불해서 규구(規矩, 자)에 맞지 않네. 그것이 길가에 서 있으나 목수가 돌아보지도 않네. 지금 그대의 말은 이 나무와 같아 커도 소용이 없네.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돌보지도 않을 것이네.” 장자는 이에 대답했다. “이제 자네는 큰 나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쓸 데가 없는 것이 걱정이지만 왜 그것을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鄕)인 광막한 들에다 심어 놓고 그 곁을 방황하면서 무위(無爲)로 날을 보내고 소요하다가 그 밑에 드러눕지를 않는가? 그러면 그 나무는 도끼에 베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아무에게도 해를 입을 염려가 없네. 쓰일 데가 없으니 또 무슨 괴로움이 있겠는가?”(장자, 위의 책, 192) 그 유명한 무용의 용이라는 명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쓸모가 있다는 이 명제에서 장자가 강조하는 것은 참 쓸모는 세속의 쓸모를 초월하는 것. 세속적 가치를 잊는 것. 참된 유용성은 세속의 가치를 벗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참된 유용성을 발견하여 홀로 즐기고 홀로 소요하라는 것. 무하유지향은 어디에도 없는 고향, 인공을 가하지 않은 낙토(樂土), 말하자면 유토피아이다. 장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런 이상향에서의 소요(逍遙), 곧 슬슬 거닐며 한가로이 돌아다니는 것. 이런 소요가 놀이와 통한다. 데리다의 글쓰기가 놀이, 무용성을 강조한다면 장자는 이 놀이, 무용성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그런 점에서 데리다가 예술을 강조한다면 장자는 예술과 삶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경지를 지향한다. 말을 잊은 사람과 더불어 말한다는 것은 결국 밝힐 수 없는 것은 밝힐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세속적 가치를 지탱하고 세속적 가치를 생산하는 언어를 버리는 일과 통한다. 요컨대 데리다의 경우 텍스트가 세계이고 산다는 것은 쓰기이고 텍스트 짜기이고 이 텍스트는 시작도 끝도 중심도 없지만 아무튼 우리는 세계라는 텍스트를 쓰고 짜며 산다. 이렇게 글이 생략된 글쓰기, 원-글쓰기가 데리다의 글쓰기라면 장자는 이런 텍스트로서의 세계를 인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텍스트도 잊으라고 주장한다. 장자의 물아양망은 주체/객체의 2항 대립을 해체한다는 점에서 데리다와 비슷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자의 경우 이 망각도 망각하라는 것. 왜냐하면 망각의 망각이 깨달음, 도(道)와 통하기 때문이다. 장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글도 망각하자. 대저 큰 도(道)는 이름 부를 수가 없고 위대한 변증은 말하지 않으며 위대한 인(仁)은 인자하지 않고 크게 청렴함은 사양하지 않으며 크게 용감함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 도가 밝혀지면 도가 아니고 말로 변증되면 도달하지 못하고 인이 계속되면 이루어지지 못하고 청렴이 결백해지면 미덥지 못하며 용기가 해치면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 다섯 가지는 원래 원만한 것인데 지금은 거의 모난 데 가깝다. 그러므로 앎이 그 알지 못하는 데서 그치면 최고다(장자, 위의 책, 202). |
Copyright 월간 넥스트 All right reserved.
시조(時調)와 시조 창사(唱詞)
시조(時調)
-
- 시조란 말은 흔히 우리나라 고유의 문학의 한 장르의 이름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시조의 원 뜻은 악곡의 이름이었고 오늘날엔 시조 창사를 시조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좀더 엄밀히 따진다면 오늘날에 시조라고 부르는 시조 창사도 정확하지는 않고 가악 시조 이전부터 존재했던 가곡의 창사를 시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에서 시조라고 하는 용어의 정확한 원뜻은 가곡창사가 맞는 말일 것이다.
- 시조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는 영조대의 가객 이세춘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전시대에도 시조는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시조의 발생은 먼저 존재하고 있던 가곡 창사를 더 슆게 읊기 위해 발생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시조의 발생은 조선 중기 정도로 추정되며, 서유구의 '유예지'와 이규경의 '구라철사금자보'에 악보가 전해진다.
- 시조는 서울 지방에서 불려지다가 점차 각 지방으로 전해져 그 지방의 방언에 맞는 특색을 지닌 향제 시조가 파생되었다. 처음에는 시조의 형식이 하나 뿐이었겠지만 지름시조가 먼저 파생하여 원 시조는 평시조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가곡의 발달에 따라 그 영향으로 엇시조, 중허리시조, 사설시조 등이 파생하였다.
- 시조는 황종(黃鐘;Eb), 중려(仲呂;Ab), 임종(林鐘;Bb)의 3음을 기본으로 하지만 몇가지 변음이 나오고 요성과 퇴성을 사용하여 음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 시조 창사(時調唱詞)
- 시조는 곡조에 따라 평시조 혹은 지름시조, 엇시조, 지름시조 등으로 구별하며 각 곡의 특성에 맞게 시조 창사를 얹어 가락에 맞춰 부른다.
- [1] 평시조(平時調)
- 평시조의 평(平)은 낮은 소리라는 뜻으로 지름 시조에 대조되어 쓰이는 명칭이다. 평시조는 시조의 원형으로 경제(京制)와 향제(鄕制)가 있으며 평시조 가락에 얹어 부르는 창사는 시조의 원조답게 매우 다양한데, 널리 알려진 평시조의 창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시조란 말은 흔히 우리나라 고유의 문학의 한 장르의 이름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시조의 원 뜻은 악곡의 이름이었고 오늘날엔 시조 창사를 시조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좀더 엄밀히 따진다면 오늘날에 시조라고 부르는 시조 창사도 정확하지는 않고 가악 시조 이전부터 존재했던 가곡의 창사를 시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에서 시조라고 하는 용어의 정확한 원뜻은 가곡창사가 맞는 말일 것이다.
-
- 1)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감을 자랑마라 (황진이)노래:김월하
- 2)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남구만)
- 3)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뫼히로다 (양사언)노래:김월하
- 4) 국화야 너는 어이 삼월동풍 다 지내고 (이정보)
- 5) 일각이 삼추라하니 열흘이면 몇삼추요
- 6) 천자는 만물지역려요 광음은 백대지과객이라
- 7) 청산은 내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이 (황진이)
- 8) 만경창파 욕모천에 천어환주 유교변을
- 9) 녹수청산 깊은 골에 청려완보 들어가니
- 10)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황진이)
- 11) 청산아 말 물어보자 고금을 네 알리라 (김상옥)
- 12) 형산에 박옥을 얻어 세상 사람 뵈렸더니 (주의식) 노래:문현
- 1)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감을 자랑마라 (황진이)노래:김월하
-
- [2] 반각시조(半刻時調)
- 반각시조는 반사설시조라고도 하며 평시조와 사설시조를 섞어서 부른다. 반각시조에는 초장을 평시조로 부르고 중장과 종장을 장형(長型)으로 사설시조로 부르는 선반각(先半刻)과 초장, 중장을 장형으로하여 사설시조로 부르고 종장을 단형(短型)으로하여 평시조로 부르는 후반각(後半刻)이 있다.
- `일년이 열두달인데'와 `귀또리 저 귀또리'는 선반각이고 `송하에 문동자하니'와 `낙양 삼월시에'는 후반각이다. 반각시조의 내용은 여창인 경우는 그리움을 주로하지만 남창인 경우에는 호연지기를 드러내는 내용을 주로 부른다.
- [2] 반각시조(半刻時調)
-
- 1) 일년이 열두달인데 윤삭들면 열석달도 일년이라
- 2) 귀또리 저 귀또리 어여뿔사 저 귀또리
- 3) 송하에 문동자하니 스승은 영주 봉래 방장 삼신산으로 불사약을 구하러 가셨나이다 노래:김호성
- 4) 낙양 삼월시에 궁류는 황금지로다 춘복이 기성하거늘 소거에 술을 싣고 도리원 찾아들어 (임의식)
- 1) 일년이 열두달인데 윤삭들면 열석달도 일년이라
-
- [3] 사설시조
- 사설시조는 가곡의 영향을 받아 파생된 곡이라 할 수 있다. 사설시조는 말 그대로 장형의 가곡 창사를 단순화하여 시초에 얹어 부르던 형태이다. 시조가 발달하고 다양한 감정 표현이 요구되면서 사설 시조의 등장은 필연적 이었다. 그러나 가곡의 어려운 곡조 보다는 비교적 단순한 시조의 가락에 가곡의 `편(編)'이나 `농(弄)', `낙(樂)'에 쓰이는 가사를 옮기다 보니 가사를 부르는 곡조마다 장단과 곡조가 조금씩 달라서 따로 정형화된 사설시조 형식은 없다.
- 사설시조의 내용은 주로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는 가사가 많고 가사가 한문투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 [3] 사설시조
-
- 1) 소년 행락이 다 진커든 와류강산 하오리라 이호상이 자작
- 명정케 취한 후 한단침 도두 베고 장주호접이 잠간되어
- 2) 일년 삼백 육십일은 춘하추동 사시절이라 꽃피고 앞 푸르면노래:김호성
- 화조월석 춘절이요 사월남풍 대맥황은 녹음방초 하절이라
- 3) 진국명산 만장봉이 청천삭출 금부용이라 거북은 흘립하여 북주 삼각이라 노래:문현
- 1) 소년 행락이 다 진커든 와류강산 하오리라 이호상이 자작
- [4] 지름시조
- 지름시조는 가곡의 두거와 같이 첫음을 고음에서 시작하는 곡으로 남창 지름 시조와 여창 지름시조가 있다. 지름시조는 첫 장을 질러 내며 시작하지만 중장과 종장은 평시조와 같다. 남창 지름시조는 내용이 호쾌하고 충절을 나타내는 남자의 기상이 엿보이는 창사를 주로 얹어부르며, 여성(女聲)에 맞게 짜여진 여창 지름시조는 여인의 정한(情恨)을 표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 중에서 `학타고 저불고'는 초장과 종장이 길어진 형태인데 특별히 엮음 지름시조라고 부른다.
- 남창지름시조
-
- 1) 바람아 부지마라 휘어진 정자 나뭇잎이 다 떨어진다노래:이동규
- 2) 바람도 쉬어 넘고 구름이라도 쉬어 넘는 고개 노래:문현
- 3) 장검을 빼어들고 백두산에 올라보니 (남이)
- 4)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이순신)
- 5)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 데 (김종서)
- 6) 태산에 올라 앉아 사해를 굽어 보니
- 7) 청천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러기
- 8) 가노라 가노라 임아 응영단처 풍월강산으로 가노라 임아 노래:문현
- 1) 바람아 부지마라 휘어진 정자 나뭇잎이 다 떨어진다노래:이동규
- 여창지름시조
- 1) 청조야 오도고야 반갑도다 님의 소식 노래:김호성
- 2) 버들은 실이 되고 꾀꼬리는 북이 되어
- 3) 기러기 산이로 잡아 정들이고 길들여서
- 4) 달밝고 서리친밤 울고가는 저기럭아
- 2) 버들은 실이 되고 꾀꼬리는 북이 되어
-
- [5] 중허리 시조
- 중허리 시조는 가곡의 창법을 본따서 만들어진 것으로 '중거(中擧)'에서 파생되어 중허리라는 말이 붙여졌다. 초장과 중장의 첫 장단은 평으로로 부르다가 가성과 상청을 쓰고 다시 종장에서는 평시조와 같은 가락으로 끝난다.
- [5] 중허리 시조
-
- 1) 방 안에 혔는 촛불 눌과 이별하였관듸 (이개)
- 2) 산촌에 밤이 드니 먼데서 가이 짖어온다 (천금)
- 3) 산촌에 눈이 오니 돌 길이 묻혔어라 (신흠)
- 1) 방 안에 혔는 촛불 눌과 이별하였관듸 (이개)
-
- [6] 우조 시조(羽調時調)
- 우조 시조는 서울의 우대(지금의 누상동 근처)에서 불리워진 시조로 평시조가 계면조인데 반해 우조 음계로 이루어진 시조를 말한다. 그러나 우조 시조라고 이름하지만, 평조(우조)를 바탕으로 하여 계면조를 섞어 부르는데, 전조가 빈번하다. 장단은 평시조와 같지만 고음을 많이 써서 듣기에도 평시조와는 달리 호탕함을 느낄 수 있다.
- 우조시조에 얹어 부르는 시조 창사로는 '월정명(月正明)'이 잘 알려져 있으며 이 곡은 이문언(李文彦)의 전창(傳唱)으로 알려졌다.
- [6] 우조 시조(羽調時調)
-
- 1) 월정명 월정명커늘 배를 타고 추강에 나니 노래:김호성
- 2) 백구야 놀라지마라 너 잡을 내 아니로다
- 1) 월정명 월정명커늘 배를 타고 추강에 나니 노래:김호성
-
- [7] 우조(羽調) 지름시조
- 우조 지름 시조는 우조 시조 보다도 더 높은 성음으로 부르는 곡인데, 지름 시조와도 곡조가 사뭇 다르다. 또 다른 시조들이 시조 창사를 부르지만 우조 지름시조는 한시(漢詩)의 칠언율시(七言律詩)를 가사로 사용한다. 우조지름시조는 기악판(妓樂版)이나 시조계(時調系)에선 전혀 부르지 않았고 우조 시조와 마찬가지로 서울의 우대에서 불려지던 곡조였다.
- 이 곡도 우조시조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우조는 아니고, 계면조를 바탕으로 하여 우조를 섞어 부른다. 박기준(朴基俊)의 전창으로 <십재를>과 <봉황대상>이 알려졌고, 그 외 <석인이>가 전한다.
- [7] 우조(羽調) 지름시조
- 1) 십재(十載)를 경영 옥수연(屋數椽)하니
- 금강지상(錦江之上)이요 월봉전(月峰前)이로다
- 2) 봉황대상 봉황유러니 봉거대공강자류라 노래:이양교
- 3) 석인( 昔人)이 이승백학거(已乘白雲去)하니 차지(此地)에 노래:김월하
- 공여황학루(空餘黃鶴樓)로다
- 금강지상(錦江之上)이요 월봉전(月峰前)이로다
- [8] 사설 지름시조(엇시조)
- 사설시조의 창사와 같이 초장과 중장에서 장형의 창사를 부르는 곡인데, 가사에 따라 부르는 법이 약간씩 다르다. 보통 엇시조라고도 하며 `푸른 산 중 하에'는 `산행포수'라는 또다른 이름이 붙여져 있고 수잡가라고도 부른다.
- 1) 창 내고자 창 내고자 이 내 가슴에 창 내여고자
- 2) 백구는 편편 대동강상 비하고 장송은 낙락 청류 벽상 휘라
- 3) 푸른 산중하에 조총대 둘러메고 설렁설렁 내려오는 저 포수야 노래:이준아
- 4) 푸른 산중 백발옹이 고요독좌 향남봉을 노래:문현
- 5) 학 타고 저 불고 호로병 차고 불로초 메고 쌍상투 짜고 노래:문현
- 색등거리 입고 가는 아희 게 좀 섰거라 네 어디로 가느냐 말물어 보자
- 2) 백구는 편편 대동강상 비하고 장송은 낙락 청류 벽상 휘라
http://user.chollian.net/~flumen/
갑민가
어져어져 저기가는 저사람아
네행색 보아하니 군사도망 네로고나
요상으로 볼작시면 베적삼이 깃만남고
허리아래 굽어보니 헌잠방이 노닥노닥
곱장할미 앞에가고 전태발이 뒤에간다
십리길을 할레가니 몇리가서 엎쳐지리
내고을의 양반사람 타도타관 옮겨살면
천하되기 상사여든 본토군정 싫다하고
...
- 탈근대 철학(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의문을 담은 촘스키의 글
여행을 가서 강연을 마치고 - 제 대부분의 생애를 이것으로 보내지요 - 돌아와보니 "이론"과 "철학" 에 대한 토론과 관련해서 계속 글들이 올라오고 있군요. 제가 보기에는 다소 기묘한 논쟁입니다만 말입니다. 여기 제 반응들을 몇가지 올립니다. 단, 미리 인정하겠지만, 솔직히 지금 무슨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논쟁은 처음에, 저와 마이크[Michael Albert; "Z"의 편집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런 "이론"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여러가지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촉발되었지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이 점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고, 이 약점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론"과 "철학"과 "이론적 구성물들"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마이크를 대변할 필요는 없겠지요. 지금까지 저의 응답은 제가 35년전, 그러니까 소위 "포스트모더니즘"이 지성계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기 오래 전부터 이미 활자화했던 주장들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말했지요: "만약에 시사 문제들을 다루거나 국내외의 분쟁들을 해결하는데에 적용할 수 있고, 충분히 시험을 거쳤으며 잘 검증된 이론이 있다면, 누군가가 그런 이론의 존재를 지금까지 비밀리에 잘 감춰왔음이 분명하다. [그런 이론이 있다는] 수많은 사이비 과학적 허세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제가 아는한 이 말은 35년전에도 맞는 말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더구나, 제가 한 말은 인간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모든 연구들에 확장되며, 35년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나온 "이론"들에 대해서도 물론 단 하나의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제가 아는 한 그동안 바뀐 것이라면, 이른바 "이론"과 "철학"을 제안하는 사람들 사이에, 스스로에 대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이비 과학적 허세"이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지요. 제가 에전에도 썼지만,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는 것들중 가끔 꽤 흥미있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도 제 시간과 정력을 바치고 있는 실제 세계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함축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가령, 예를 들어달라는 구체적인 요구와 관련해서 제가 언급한 것으로, 롤즈(Rawls)의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에 대한 존경심의 폭발적인 증가라는 현상은 이미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령 상당히 괜찮은 철학자이자 사회이론가 (그리고 또한 활동가이기도 하지요)인 앨런 그라우바드 (Alan Graubard)가 몇년전에 롤즈에 대한 로버트 노직 (Robert Nozick)의 "자유지상주의적"인 응답,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한 반응들과 관련해서 흥미있는 논평을 썼었지요. 앨런은, 노직의 응답에 대한 반응들이 아주 열광적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논평을 썼던 사람들마다 노직의 논변들이 가지는 파워 및 그밖의 여러 점들을 극찬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누구도 실제 세계와 관련된 노직의 결론들중 그 어느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 중 이미 그런 결론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외로 하고 말이지요). 앨런의 지적이 맞습니다. 더불어 이런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의 논평도 맞구요.
"이론"과 "철학"을 지지하는 이들은, 자신들을 옹호하길 원한다면 아주 쉽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저에게,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비밀"로 남아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 됩니다. 기꺼이 공부하겠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알려달라고 여러번 요구했지요. 그리고 여전히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운 요구가 아닙니다: 마이크, 저,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사실, 편협하고 놀랍게도 자족적인 지식인 사회를 제외한 대다수의 인류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들과 사안들에 "적용할 수 있고, 충분히 시험을 거쳤으며, 잘 검증된 이론"의 예를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그리고 글을 쓰고 있는 문제들과 사안들, 또한 이들과 같은 종류의 문제들과 사안들에 대해서 말이지요. 조금 다르게 말해보면, 우리가 공부해야한다고 하고 또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이론"이나 "철학"의 원리들이, 우리 및 다른 이들이 다른(또는 더 나은) 근거에 의해 이미 다다른 결론들을 타당한 논변을 통해 이끌어낸다는 점을 보여주십시오. 이 "다른 이들"에는,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이들 또한 "이론적" 모호함 같은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호 관계를 통해, 또는 곧잘 스스로들, 제가 말한 그런 결론들에 다다르니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은 간단한 요구입니다. 이런 요구를 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그 비밀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지요. 저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몇가지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요즘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논쟁에서 언급된 바 있는) 이른바 "해체(deconstruction)"과 관련해서는 논평을 할 수가 없군요. 왜냐하면 그 대부분이 저에게는 횡설수설인것처럼 보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심오함을 깨닫지 못하는 저의 능력부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라면, 다음으로 여러분이 해야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 결과들을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들로 다시 서술해주고, 이 결과들이, 세음절 이상 나가는 단어, 비정합적인 문장, (최소한 저에게는) 거의 아무런 의미도 없이 남발되는 수사, 이런 것들 없이도 이미 오래 전부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 결과들과 왜 다른지, 또는 왜 더 나은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 능력부족이 치료가 되겠지요. - 물론,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어쩌면 치료가 안될지도 모르지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이건 만족시키기 아주 간단한 요구입니다. 그렇게도 대단한 열정과 분노로 제기되는 주장들에 어떤 근거라도 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대신, 답변들을 보면 잔뜩 화만 내고 있지요: 이런 요구를 제기하는 것은 "엘리트주의", "반지성주의", 또 그밖의 다른 범죄들을 범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 반면에, 스스로에 대한 존경과 상호간의 존경이 가득한 지식인 사회에 머무르면서 자기네들끼리만 얘기하고 제가 있기를 더 선호하는 종류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엘리트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듯 합니다. 제가 더 선호하는 세계에 대해서라면, 제 강연 및 집필일정만 봐도 제가 뭘 의미하는지 예시가 될 겁니다. 물론 이 토론 참가자들이야 다 알고 있거나, 쉽게 알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저는 그 세계에서 어떤 "이론가"들도 본적이 없으며, 그들이 하는 회의나 파티에 가본적도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저와 그들은 그냥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세계가 아닌 제 세계가 "엘리트주의"적 세계인지는 알기 힘듭니다. 더 이상 논평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 반대가 사실이라는 것은 자명한듯이 보이지요.
또 다른 면을 덧붙이자면, 저에게는 강연 요청들이 너무나 많이 밀려들어와 도저히 제가 원하는만큼 다 수용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경우 저는 다른 사람들을 제안하지요. 하지만 기묘하게도, 저는 "이론"이나 "철학"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절대 제안하지 않습니다. 대중 모임과 활동가들의 모임및 단체, 일반 단체, 대학, 교회, 노조, 등등, 또 국내외 청중들, 제3 세계 여성들, 난민들, 등등, 이들과 관련된 제 자신의 (상당히 광범위한) 경험에서, 그런 사람들과 (또는 그들의 이름조차도) 우연히 부딪히거나 한 적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게시판의 이 모든 논쟁이 기묘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성난 비난과 탄핵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비난과 탄핵을 지지할만한 증거와 논변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대해 더한층 분노로 가득찬 비난으로 응답을 합니다. --- 하지만 놀랍게도, 어떤 증거나 논변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왜 그럴까를 물어보게 되지요.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도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또는 어쩌면 과거 20년동안 [프랑스] 파리의 지식인들과 그 추종자들이 밝혀놓은 심오한 사실들을 이해할만한 지적 능력이 저에게 부족한 것이지도 모르지요. 저는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 전적으로 열려있습니다. 비슷한 비난들이 쏟아진 수년간 계속 그래오고 있지요 - 하지만 제 질문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 질문들은 간단하고 답변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 답변이 있다면 말입니다: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면, 그게 뭔지 보여주십시오.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들로 말이지요. 물론, 그것들이 완전히 제 이해를 벗어나 있는 것이라면 - 그럴 수도 있습니다 -, 그렇다면 체념해야지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해할수 있는 것 같은 일들을 계속해야지요. 또한 이 일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으며 관심있어하는 것 같은 사람들과 계속 다녀야지요. (물론 저로서는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자기 자족적인 지식인 문화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제가 뭘 놓치고 있는지 성공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은 것은 두번째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가능성이 참일지도 모른다는 점은 기꺼이 인정합니다만, 저로서는 계속 미심쩍어할수밖에 없군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말이지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 가령, 중성미자(neutrino)가 질량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최신 논쟁, 또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최근에 어떤 식으로 증명되었는가에 대한 지식. 하지만 저는 이쪽 동네에 50년간을 있으면서 다음과 같은 두 사실을 배웠지요:
(1) 관련 분야에 있는 친구들에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한 어려움없이 내 부탁을 들어줄수 있다.
(2) 내가 관심있으면, 좀 더 공부해서 이해할 수도 있다.
자, 이제 데리다(Deridda), 라캉(Lacan), 리오타르(Lyotard), 크리스테바(Kristeva), 등등 - 심지어 푸코(Foucault)도 말이지요. 비록 제가 그를 알고 있고 좋아했으며, 이 부류의 다른 이들과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말입니다 - 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글들을 쓰지요. 하지만 [이들의 글과 관련해서는] (1)과 (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해했다고 하는 어떠한 사람도 저한테 그걸 설명해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실 그런 저의 이해불능을 어떻게 극복해야할지 조금의 실마리도 찾을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다음의 두가지 가능성중 하나가 맞겠지요. (a) 지성계에 무엇인가 새로운 진보가 이루어졌다 (아마도 어떤 종류의 갑작스러운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이겠지요). 그 결과 그 깊이와 심오함에 있어서 양자역학, 위상수학, 등등을 뛰어넘는 형태의 "이론"이 탄생되었다. 또는 (b) . . .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 지식인 세계라는 데에서 50여년간을 살아왔고, "철학"과 "과학"이라고 불리우는 영역들 및 지성사 분야에서 제 자신의 일을 상당량 해 왔습니다. 아울러 자연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그리고 예술 분야에서의 지식인 문화에 대해 상당한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지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지식인들의 생활에 대한 제 자신의 결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쓰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히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여러분들보고 "이론"과 "철학"의 경이로움에 대해 말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물리학, 수학, 생물학, 언어학, 그 밖의 다른 분야들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군가가 그들보고 진지하게 그들 이론의 원리들이 무엇이고, 그 원리들이 어떠한 증거들에 바탕해있고, 그것들이 설명하는 것들이 이미 명백한 것들이 아닌지 등등을 물어볼 때 기꺼이 답해주겠지요. 이건 누구나 해야하는 공평한 요구들입니다. 이 요구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그렇다면 저는 비슷한 상황에서 흄(Hume)이 제시한 충고를 받아들이라고 제안하겠습니다: 그 "이론"과 "철학"을 불속에 던져버리십시오.
이제 몇가지 세부적인 논평을 하겠습니다: 제가 "파리 학파들"(Paris Schools)과 "포스트모더니스트 종파들"(Postmodernist cults)을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지 페틀랜드(P.h.e.t.l.a.n.d)가 물어보았지요. 위에 든 사람들이 그 일례들입니다.
그 다음에 페틀랜드가, 당연하게도, 왜 제가 이들을 "무시"하느냐고 물어보았지요. 가령 데리다를 들어볼까요. 우선, 저는 이제부터 제가 하려는 것과 같은 종류의 논평을 아무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하지만 여기 이 게시판에 참가한 사람들이, 가령, 소쉬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원하는지 의심스럽군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그런 분석을 하지 않을 겁니다. 페틀랜드가 제 견해를 명시적으로 물어보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할 얘기를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제 견해를 뒷받침하라고 요구받는다면 저는, 그런 일은 시간들여서 할만한 가치가 없다고 답변할 것입니다.
어쨌든 데리다를 보겠습니다. 나이많은 저명한 사람들 중 하나이지요. 저는 최소한 그의 <그라마톨로지(Grammatology)>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려고 시도했지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령 제가 매우 잘 알고 에전에 거기에 관해서 논문도 쓴 적이 있는 고전적 문헌들에 관한 비판적 분석같은 것 말이지요. 우스꽝스런 오독에 근거한, 형편없는 스칼라쉽이었습니다. 아울러 그 논변이라는 것이, 제가 사실상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익숙해왔던 정도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글쎄, 아마 제가 뭘 놓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위에서 말한대로 의심은 여전히 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무런 근거도 대지 않은 논평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견해를 물어봤으니,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 종파들 (제가 보기에는 종파들처럼 보입니다)에 있는 사람들 중 몇몇은 저도 만나보았습니다: 푸코 (우리는 심지어 몇시간씩 토론도 했지요. 활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동안 매우 즐거운 대화를 했지요. 실질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 그는 불어로, 저는 영어로). 라캉 (여러번을 만났고, 재미있는, 그리고 자신도 잘 알고 있는 사기꾼 (charlatan)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종파를 형성하기 이전인 그의 초기 연구는 사리에 맞는 것이었고 이에 대한 제 논의도 활자화되어있지만 말입니다). 크리스테바 (그녀가 열광적인 마오주의자였을 때 잠깐 만난적이 있지요). 그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요. 저는 제 선택에 의해 이들 써클을 멀리 했고, 전혀 다르면서 훨씬 광범위한 써클들을 더 선호했으니까요 - 제가 강연하고, 인터뷰하고, 운동에 참여하고, 매주 몇십장씩 긴 편지들을 쓰고 하는 써클들 말입니다.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들의 저술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이유들 때문에 진도를 많이 나가지는 못했지요: 제가 본 것은, [이들이] 극단적으로 허세를 부리면서도, 검토해보면 그 허세중 대부분은 단순히 그 분야에 대해 기본 소양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때로는 제가 논문을 쓴 적도 있는) 문헌들에 대한 엄청난 오독, 기본적인 자기-비판도 수시로 무시한다는 점에서 지독하게도 형편없는 논변, (복잡다단한 말들로 치장되어있지만) 사소하거나 거짓인 많은 진술들, 이런 것들에 근거한 허세이지요. 더불어 상당부분은 그냥 횡설수설(gibberish)입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분야들에서 중간에 막힐 경우에는, 저는 위에서 말한 (1)과 (2)에 관련된 문제들과 부딪히지요. 어쨌든 위에서 말한 사람들이 제가 애초에 염두에 둔 사람들이고, 또 제가 왜 진도를 많이 나가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혹시 불분명하다면 더 많은 이름들을 나열할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하지만 내부인으로서의) 관찰에 대한 문학적 묘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데이비드 롯지 (David Lodge)의 소설들을 권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하에서는, 정곡을 찌른 것 같습니다.
페틀랜드는 또한, 제가 "뉴욕 타임즈의 허세와 혹세무민을 드러내는" 데에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들 지식인 써클들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히 무시"하는 것이 "매우 당혹스럽게" 여겨진다고 썼습니다.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은 식으로 취급해주지 않는 것이지요?" - 정당한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간단한 답변이 있지요. 제가 논의하는 (뉴욕 타임즈, 여러 저널들, 많은 학술책들) 텍스트들은 이해가능한 글들로 씌어져있고 세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사회같이 성공적으로 교설적인 (doctrinal) 사회에서, 생각과 표현을 담는 교설의 틀 (doctrinal framework)을 제공하니까 말입니다. 이것은 세계 전역에 걸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지요. 저는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지, 롯지가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일반적인 사람들과 그들의 문제들에 관심이 있다면, 제가 논의하는 텍스트들을 진지하게 다루어야지요. 페틀랜드가 언급한 글들은, 제가 판단하는 한, 전혀 그런 성격의 글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글들은 세계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 글들은 단지 같은 써클들 내에 있는 다른 지식인들에게만 읽혀지니까요. 더구나, 이들 글들을 일반 대중들 (가령, 제가 강연을 하거나, 만나거나, 편지를 쓰거나, 또는 제가 글을 쓸때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별다른 특별한 어려움 없이 제가 말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일반적으로 볼 때 이들 역시 제가 포스트모던 종파들에 맞닥뜨렸을때 가졌던 것과 같은 종류의 지적 장애를 그 종파들에 대해 가지는 것 같지만 말입니다)에게 이해시켜보려는 시도가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또한 저는 그런 글들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적용해보려는 시도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의미에서, 이미 명백한 것이 아닌 뭔가 새로운 결론들을 뒷받침해주는 역할로서의 적용을 해보려는 시도 말이지요. 저는 지식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명성을 부풀리고, 특권과 존경을 얻고, 일반일들의 투쟁에 동참하는 것을 점점 멀리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것이지요.
페틀랜드는 푸코에서부터 시작해 볼 것을 제안하는군요. 반복하지만, 푸코는 다른 이들과 두가지 이유에서 조금 틀리지요: [첫번쩨로] 최소한 푸코가 쓴 글들중 몇몇은, 비록 그렇게 흥미롭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푸코는 개인적으로 [대중들의 투쟁에] 멀리 떨어져있지 않았고, 같은 부류의 특권 엘리트 써클들안의 다른 이들과만 상호 교류하지도 않았지요. 이어서 페틀랜드는 정확히 제가 요구했던 것을 답하려고 합니다: 페틀랜드는 왜 자신이 푸코의 저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쓰고 있지요. 이것이 토론을 하는 제대로 된 방식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기에 대한 제 답변을 통해 왜 제가 이런 부류의 저술들에 대해 그렇게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지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 사실,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페틀랜드가 서술하고 있는 푸코의 "이론" - 올바른 서술이라고 확신하건데 - 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알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 사회사 및 지성사와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사실 이 세부사항들에 대해서도, 저라면 상당히 주의하겠습니다: 이 영역들 중 몇몇은 제 자신이 우연히도 꽤 광범위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들과 관련해서는 푸코의 스칼라쉽이 별로 신뢰할만한게 못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 결과 제가 모르는 영역들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의 작업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1972년 이래로 활자화된 논의들을 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조금씩 불거지기 시작하지요. 17세기와 18세기에 관련해서 [푸코보다] 훨씬 더 나은 스칼라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들과, 제 자신의 조사결과를 참고하지요. 하지만 다른 역사 관련 저술들은 제쳐놓고, "이론적 구성물들"과 설명들로 넘어가봅시다: "가혹한 억압 메커니즘으로부터, 사람들이 권력이 원하는 것들을 (심지어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보다 교묘한 형태의 메커니즘으로의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설명은 진실입니다. 사실, 당연한 말이지요. 만약 이런 게 "이론"이라면, 저에 대한 모든 비판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이론"은 있으니까요. 저는 정확하게 푸코가 지적하고 있는 바로 그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유와 역사적 배경도 제시했지요. 하지만 저는 제 견해를 "이론"이라고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이라는 용어를 붙일만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헷갈리게 만드는 수사도 쓰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제 주장은 아주 단순한 것이니까요). 아울러 제 견해가 새로운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지요 (왜냐하면 당연한 사실이니까요). 통제와 억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쇠락해감에 따라 20세기초 PR 산업 종사자들이 "대중들의 마음을 조종하기"라고 부른 것들에 점점 의존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은 오랫동안 인지되어온 사실입니다. 18세기에 흄이 말했듯이,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통치자들의 느낌과 욕구에 굴복하여 암묵적으로 맡겨버리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통치자들이 사람들의 견해와 태도를 조종하는데에 근거해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당연한 사실이 갑자기 "이론"이나 "철학"이 되어야하는지는, 다른 사람들이 설명해주어야지요. 흄이라면 웃었을 겁니다.
푸코의 특정한 예들 중 몇몇 (가령 18세기의 형벌 방식)은 흥미있어 보이고, 그 정확성에 대해 조사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단순히, 남들이 별다르게 심오한 것이 있다는 허세없이도 간단하게 지적해놓은 것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들고 부풀려서 다시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페틀랜드가 서술한 것 중 그 어느 것도 제가 35년간 써왔고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보여왔던 것들 - 이것들 모두가 명백하고 당연한 사실들이지요 -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소한 사실들에서 흥미있는 것은 어떤 원리가 아니라 - 그 원리가 무엇인지는 명백하지요 - 어떻게 이 원리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들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가 하는 점을 보이는 것입니다: 국가개입, 칩략, 착취, 테러, "자유시장"이라는 사기, 등등에서 말입니다. 이것들과 관련된 작업은 푸코의 저술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장들을 쓸 수 있고 지성계에서 "이론가들"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의 많은 저술들에서는 그런 작업을 찾아볼 수 있지요.
제 논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페틀랜드는 정확히 옳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푸코가 발견한 "중요한 통찰들과 이론적인 구성물들"을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제 문제는, 그 소위 "통찰들"이라는 것이 이미 익숙한 것들이며, 더구나, 단순하고 익숙한 아이디어들이 복잡하고 허세에 가득찬 수사들로 치장되었다는 점을 뺀다면 어떠한 "이론적인 구성물들"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페틀란트는 제가 푸코의 작업을 "틀렸는지, 쓸모없는지, 또는 허세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역사와 관련된 그의 작업은 때때로 흥미롭습니다. 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하나하나 검증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말이지요. 오랫동안 명백한 사실이었고 훨씬 더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점들을 재진술한 부분은 "쓸모없지" 않습니다. 사실 매우 쓸모있고, 그게 바로 저와 다른 활동가들이 늘 같은 점들을 지적하는 이유이지요. "허세"와 관련해서는, 물론 제 견해로는 푸코가 쓴 많은 것들이 허세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그것 때문에 푸코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허세는 프랑스 파리의 썩어빠진 지식인 문화에 아주 뿌리깊숙히 박혀있는 것이고, 푸코는 그냥 거기에 자연스럽게 빨려들어간 것이니까요. 오히려 높이 사야 할 점은, 그가 그 문화에 거리를 두었다는 사실이지요. 파리 지식인 문화의 "부패"(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해서는, 이건 다른 이슈이고 제가 다른 곳에서 논의한 적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기 게시판의 사람들이 이 이슈에 대해 관심있어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관심없습니다. 제 견해로는, 그들 자신들만의 편협하고 (최소한 저에게는) 별로 흥미롭지도 않은 써클들에서 엘리트 지식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경력을 쌓았고 또 다른 것들을 추구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매우 성근 주장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무런 증명없이 이런 논평을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지요. 하지만 저에게 질문들을 제기해왔고, 저는 여러분들이 제기한 특정 이슈들만을 답했습니다. 제 일반적인 견해를 물어보면, 저로서는 그냥 제 견해를 말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그리고 보다 특정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그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만 답할 수 밖에요. 저는 제가 관심이 없는 주제들에 대해 책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론"과 "철학"에 관련된 주장들이 제기될때 어떠한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도 곧바로 마음속에 떠올릴 단순한 문제들에 대해 누군가가 대답해줄수 없는한, 저는 제가 보기에 합당하고 계몽적인 작업들을 지속해나아갈 것이고, 또한 세계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데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만날 것입니다.
존 (Johnb)은 "듣는 이가 준거틀 (frame of reference)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평이한 언어로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옳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올바른 반응은, 있지도 않은 "이론"과 관련된 애매모호하고 불필요하게 복잡한 말과 허세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지요. 올바른 반응은,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이 받아들이고 있는 준거틀을 의문시해보라고 요청하고, 그것 대신 고려해 볼 수 있는 다른 대안을 평이한 언어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식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혹은 어떤 경우에는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과 늘 얘기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 교육 수준이 점점 올라가서 지배 이데올로기에 단단히 세뇌되어 있고 알아서 복종하는 것 (엘리트 교육의 상당 부분은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지요)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일수록 이해시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존은 말하기를, 여기 게시판과 같은 써클을 제외한 "우리나라[미국]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그"는 저를 의미하지요)는 이해불가능한 사람이다"라고 했지요. 이건 제 많은 경험들에 완전히 위배되는 말입니다. 모든 종류의 청중들과 관련해서 말이지요. 오히려, 제 경험은 제가 방금 서술한 그대로입니다. 가령, 라디오 대담을 보지요. 저는 라디오 대담에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억양등을 들어보면 청취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상당히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은, 청취자가 가난하고 덜 교육받은 사람일수록 많은 배경지식이나 "준거틀" 문제같은 것을 제가 그냥 건너뛸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것들은 상당히 자명하고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저는 그냥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들로 곧장 옮겨나아갈 수 있습니다. 좀더 교육받은 청취자일수록 이게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수많은 이데올로기적 구성물들을 부숴버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제가 쓴 책들을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그 안의 아이디어들이나 언어가 복잡해서 그런것이 아니지요. 강연장에서 자유토론을 할 때는, 정확히 같은 사안들에 대해, 심지어 정확히 같은 단어들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제 문체 때문일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방대한 자료를 제시해야 될 필요 (최소한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때문에 그 결과 읽기가 어려워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 책에서 특정 부분을 (어떤 때는 거의 그대로) 팜플렛 형태나 그 비슷한 것으로 만들어 배포하지요. 아무도 [이해하는데] 별 문제를 느끼는 것 같지 않더군요. 물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히려 Times Literary Supplement나 전문적인 학술 저널들은 도대체 제가 뭘 말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자주 벌어집니다만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정말 희극적이지요.
마지막 지적입니다. 이미 다른 데서도 썼습니다만 (Z에서의 토론, <501년: 정복은 계속된다>의 마지막 장등), 최근 지식인 계급의 행동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지요. 60년전이라면 노동 계급 학교들에서 가르치거나 <백만인을 위한 수학> (제목 그대로,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수학을 이해가능하게끔 해주었지요)과 같은 책들을 쓰고 대중 조직들에 참여 및 강연을 했었을 좌파 지식인들이, 지금은 그러한 활동들을 거의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그만 문제가 아니지요. 지금 이 나라[미국]는 매우 이상하고 불길한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환상에서 깨어나고, 회의적이 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마이크가 말한 것처럼, 이런 상황이야말로 활동가들이 꿈꾸어오던 것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이런 상황은 선동정치가들과 광신자들에게 비옥한 토양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그들의 선배들이 뿌려왔던 메시지들을 뿌려대면서 상당수의 대중적 지지를 즐길 수 있을 (그리고 실제로 벌써 즐기고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과거에 이러한 상황이 어떠한 식으로 발전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지요. 과거에는 일반 대중들과 그들의 문제를 기꺼이 공유하고자 한 좌파 지식인들이 메어왔던 간극이, 현재는 엄청난 틈으로 존재하고 있지요. 제가 보기에 이러한 상황은, 불길한 함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끝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앞에서 말한 명백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이 문제에 대한 저의 개인적 관심도 이것으로 끝을 내려고 합니다.
http://theology.co.kr/wwwb/CrazyWWWBoard.cgi?db=study&mode=read&num=259&page=1&ftype=6&fval=&backdepth=1
| [21세기 새로운 이론과 사상] 자크 라캉의 정신분석학 |
| 욕망이란 이름의 인간을 사유하기 |
| 이정우 _ 철학아카데미원장 |
|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철학자인 자크 라캉(1901~1981)은 사르트르·메를로-퐁티·레비-스트로스·바슐라르 등과 더불어 20세기 중엽에 활동했다. ‘구조주의 정신분석학’의 대표자로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구조주의적 맥락에서 새롭게 재창조했으며, 거기에 인간존재에 대한 중요한 철학적 성찰을 가미함으로써 현대 사상의 핵심 인물들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주체를 지배하는 무의식 라캉의 사유는 깡길렘·푸코가 그렇듯이 ‘정상과 비정상’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푸코와 깡길렘이 한 사회·한 시대가 비정상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어떤 논리·개념·장치들·배경들을 깔고서 그런 구분을 행하는가에 관심이 있다면(인식론적-과학사적 관점), 라캉은 처음부터 모든 인간은 비정상이라고, 더 정확히 말해 정상과 비정상이란 이분법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아픈 존재’(헤겔)인 것이다. 이 점에서 통상적으로 함께 ‘구조주의자’로 분류되지만, 그리고 라캉 자신이 말년에 자신의 담론을 수학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지만, 라캉은 레비-스트로스의 투명한 합리주의와 대조된다. 그러나 라캉은 그 아픔이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본 점에서 역시 구조주의자이다. 라캉 사유의 성과는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을 이으면서도 거기에 구조주의 언어학의 성과를 도입해 무의식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를 시도한 점에 있다. 정신분석학은 ‘무의식’ 개념을 기본으로 한다. 우리가 의식하는 세계, 의식으로 행하는 경험 아래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세계가 놓여 있다(그러나 ‘무의식’이라는 실체는 없다. 의식의 공백으로서, 의식의 배면으로서 발견되는 어떤 차원일 뿐이다). 라캉에게서 무의식은 어린 아기가 상징의 세계, 표상의 세계에 진입하면서 형성된다. 그러한 진입 이전, 즉 아기와 엄마만이 존재하는 세계가 그 후의 상징과 표상의 세계에 억눌리면서 무의식이 형성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의식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아래에는 어린 시절에 발생했던 그러한 진입과 더불어 그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주체를 지배하는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의식 세계가 상징의 세계, 표상의 세계라면 그 세계는 필연적으로 기표(記表)의 세계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표는 기의(記意)와 맞물린다. 그러나 라캉에게서는 소쉬르에게서처럼 기표와 기의가 일대일 대응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존재와 사유의 일치’라는 고전적인 전제 위에서 활동했던 소쉬르와 기표와 기의의 ‘미끄러짐’에 대해 이야기한 라캉 사이에는 거대한 담론사적 심연이 가로놓여 있다. 더 정확히 말해, 소쉬르나 레비-스트로스에게는 기표-기의의 대응관계가 성립하며 때로 그 관계를 일탈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면(예컨대 레비-스트로스가 말한 ‘떠다니는 기표’) 반대로 라캉의 경우 기표와 기의는 애초부터 일치하지 않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기표가 기의에 “닻을 내리는” 곳, 즉 이른바 ‘누빔점’이 존재한다. 기표는 그 안에 어떤 경험 내용을 담고 있다. “눈이 내린다”라는 기표는 눈이 내리는 현상(지시대상) 및 그 현상에 대한 경험 내용(기의)을 담고 있다. 그러나 라캉은 기표와 기의가 흔히 일치하지 않음을 말한다. 정치가가 “저는 대권 욕심이 없습니다”라고 극구 강조하는 것은 사실 은근히 대권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조심할 것은 이 정치가가 지금 의식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실제 그 사람은 자신이 욕심이 없다고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무의식 속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요점이다). 즉 기표와 기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일치하지 않는가? 바로 무의식 때문이다. 기표는 대권 주자에 나가고 싶지 않다는 그 정치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대권 주자의 무의식의 움직임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라캉에게 인간이란 병자든 아니든 기본적으로 이런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의식과 기표, 그리고 그 기표가 명시적으로 가리키는 기의의 세계가 있는 반면, 또한 무의식에서의 움직임이 존재하는 것이다. 무의식은 ‘그것(Es)’이다.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것’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라캉은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를 뒤집는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에서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한다, 고로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로. 라캉은 근대 철학의 대전제인 주체의 투명성, 주체가 “주어졌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주체의 밑에는 ‘그것’이, 무의식이 존재하며 주체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주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거울 단계’, 상상과 상징 사이 어린 아기의 주체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가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라고 한다. 어린 아기는 아직 신체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를 ‘조각난 몸’의 환상이라 한다. 이는 생물학적으로는 환상이지만 심리학적으로는 환상이 아니며, 누구나 겪게 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이 환상은 후에 ‘정신분열증’이 생길 수 있는 잠재적 바탕을 이룬다고 한다). 이 조각난 몸의 환상은 ‘거울 단계’에서 극복된다. 거울 단계에서 아기는 거울에 비친 영상을 보고서(또는 어머니나 다른 아기들에게 비친 자신을 보고서) ‘동일화(identification)’의 과정을 겪는다. 아기는 동일화를 통해서 조각난 몸의 단계를 극복한다. 이 단계가 ‘거울 단계/국면’이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주체가 형성되지 않은 단계이다. 아기는 아직 이자(二者)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즉 이때에 아기는 아직 상징의 세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며, 엄마와 자기를, 다른 아기와 자기를 혼동하는 전이성(transitivity)의 단계이다. 이 단계는 아기가 자신과 세계를 연속적으로 이해하는 지점이며, 라캉은 ‘상상적’ 단계라 부른다. 이 단계는 나르시스의 그것이기도 하다. 물 속의 자기 영상에 반했던 나르시스처럼 이 단계의 인간에게는 아직 타인이나 상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매우 행복한 단계이다. 그러나 그 행복은 자신이 통일된 어떤 존재라는 일정한 ‘오인(誤認)’에 근거하고 있다. 라캉에게 주체란 기본적으로 오인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아기는 이제 이런 상상계로부터 상징계로 건너가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서 본격적인 한 ‘인간’ 혹은 ‘주체’가 형성된다. 아기는 타인의 세계, 사회 세계에 들어간다. 그 결정적인 측면은 곧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다. 라캉은 이 차원을 상징계라고 부른다. 이것은 달리 말해 아기가 이제 기표들의 세계로 진입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기표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의 장 속에서 주체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주체의 형성은 곧 상징계로의 진입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언어란 타인과의 관계 하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징계로의 진입은 자기소외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제 아기는 상징계라는 타자, 사회라는 타자 속에 들어가면 동일시의 환상에서 깨어나 차가운 자기소외(自己疏外)의 장으로 들어선다(이 단계에서 아이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게 된다. 즉 타인의 시선을 매개해 스스로를 이해한다). 나르시즘의 단계, 거울 단계는 곧 상상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 사이에 존재하며, 그 단계를 통과함으로써 아기는 이제 자기와 타자를 뚜렷이 구분하면서 하나의 주체로서 정립된다. 그러나 이 구분은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로서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징계에서 어떤 자리를 잡는다는 것을 뜻한다. 레비-스트로스는 근친혼의 금지야말로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문화로 이행하게 한다고 말했다. 연속적 자연으로부터 불연속적 규범으로 넘어옴으로써 혈연과 결혼이 구분된다. 라캉에게서는 바로 거울 단계가 이 ‘자연과 문화의 돌쩌귀’ 역할을 한다. 아기는 거울 단계를 거치면서 유기체에서 인간으로 화한다. 이 점에서 라캉의 정신분석학은 프로이트와는 달리 모든 형태의 생물학주의를 물리친다. 라캉의 사상은 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함축을 띤다. 주체가 자기동일적 투명성의 존재가 아니라 자기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타자 즉 상징계를 통해 형성된다는 것은 근대적 주체 개념과는 판이한 주체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코기토가 해체된 것이다. 아버지의 이름 ‘안돼(non)’ 아기는 이자 관계에서 삼자 관계로 넘어간다. 이때 아버지가 출현한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상징계의 은유이다. 따라서 아버지가 없는 고아의 경우라도 상관없다. 아버지는 곧 법(法)의 세계이며 달콤한 상상계와 대비되는 차가운 상징계를 상징한다. 아버지가 등장한다는 것은 곧 아기가 상징계로 진입한다는 것을 뜻한다.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건너가면서 ‘균열(die Spaltung)’이 생긴다. 그 과정을 통해서 무의식이 구조화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름’이다. 이름이 주체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작용한다. 즉 인간의 원초적 욕망인 리비도/성욕이 규범에 종속된다. 오이디푸스가 아버지 라이오스를 죽이고, 어머니 이오카스테와 결혼했듯이, 아기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증오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과정은 의식적 과정이 아니라 무의식적 과정이다. 아기에게 어머니는 하나의 결핍으로서 나타난다. 즉 어머니에게는 남근(phallus)이 결핍되어 있다. 이때의 남근은 생리학적인 남근이 아니라 아버지의 상징, 법의 상징, 상징계의 상징이다. 어머니가 욕망하는 것이 바로 이 팔루스이다. 아기는 바로 어머니의 팔루스가 되고자 한다. 즉 자신을 팔루스에 동일화한다. 아기는 어머니의 결핍을 채움으로써 어머니와 더불어 충족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남자아이 중심의 설명이다. 아버지의 이름(nom)/기표는 곧 아버지의 “안돼(non)”이다. 즉 아버지/상징계는 금지로서 등장한다. 무엇의 금지인가? 바로 근친상간의 금지이다. 그것은 곧 연속성에 대한 갈망을 불연속으로 떼어놓는 과정이다. 연속의 자연에서 불연속의 문화로(이 점에서 레비-스트로스와 통한다). 그런 분리를 거부할 때 아버지/법은 제재를 가하게 되며, 이 때문에 아기는 ‘거세(castration)’ 공포를 느낀다. 그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아기는 상징계로 진입하게 되며 ‘자아의 이상(the ideal of me)’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상상계에서의 ‘이상적 자아(the ideal I)’와 다른 것이다. 이상적 나는 상상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나이지만, 나의 이상은 상징계 속에서 타인의 눈길을 통해 형성되는 나의 모습인 것이다. 이 나의 이상을 가지게 되는 것은 곧 프로이트가 말한 ‘초자아(super-ego)’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비로소 주체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 주체는 상징계에 자리를 잡은 주체이지 상식적 의미에서의 주체가 아니다. 상징계로 진입하면서 언표하는 주체(말하는 주체)와 언표되는 주체(말의 주체)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한다. 자아가 억압되고 소외되기 때문이다. 이를 ‘원억압(原抑壓)’이라 부른다. 이것은 의식적 억압과 구분된다. 이러한 억압은 필연적으로 ‘욕구불만(frustration)’을 불러일으킨다(이 욕구불만도 의식 차원에서의 욕구불만과는 구분된다). 상징과 도덕이 욕구불만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불일치’라 하는 것이 나을 듯이 보이는) ‘부정(negation)’의 개념이 등장한다. 이렇게 도덕과 윤리는 균열·틈·입벌림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신경증과 정신병은 바로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성립한다. 즉 상징계에 대한 ‘거부’로부터 발생한다. 여성이 잘 걸리는 히스테리는 자신이 거세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남성에게서 잘 발견되는 강박증은 반대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지나친 기대 때문에, 즉 스스로를 계속 팔루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런 병들에 대한 치료는 기본적으로 상징계에로의 정상적인 진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표에 숨은 기의 그리고 ‘그것(Es)’ 주체는 상징계에 들어감으로써 그리고 기표들의 장에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게 되며, 하나의 ‘인간’이, ‘주체’가 된다. 물론 인간·주체라는 말이 풍기는 뉘앙스는 근대 주체철학의 그것과 정반대이지만. 요컨대 기표의 상징적 질서가 주체를 구성한다. 이것이 라캉의 기본적인 ‘구조주의적 사유 양식’이며 그를 레비-스트로스에 이어준다. 그러나 이 상징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레비-스트로스와 현저하게 다르다. 인간은 언제나 타인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한다. 타인이 자신에게 ‘똑똑한 사람’이기를 요구하면, 자신은 타인의 욕망하는 그것을 욕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욕망이 지향하는 것은 곧 기표이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기표가 지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상징계, 같은 구조라 해도 레비-스트로스의 경우와 라캉의 경우는 현저히 다르다. 레비-스트로스의 구조가 욕망이라는 기름기가 제거된 수학적이고 명징한 구조라면, 라캉의 구조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욕망 이외의 것이 아니다. 라캉에 이르러 이제 욕망이란 특수한 의미, 부정적인 의미를 넘어 인간 존재의 근원적 본성으로, 세계의 성격 그 자체로 대두된다. 요컨대 의식으로부터 기의가 생기고 기의를 나타내기 위해 기표가 존재하는 것(현상학의 입장)이 아니다. 기표들의 장이 존재하고, 그 기표들의 장에 의해 주체―의식적 주체 이전에 무의식적 주체―가 구성되고, 그로부터 의식이 형성되는 것이다. 언어의 법칙이 먼저 존재하고 각 개인의 무의식이 그 언어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것이다. 무의식이 언어적 규칙성에 의해 지배된다고 했다. 그리고 그 언어적 규칙성은 기표와 기의의 일대일 대응이 무너진 상황에서의 규칙성이라 했다. 그렇다면 그 규칙성은 무엇일까?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기표가 떠다닌다고 말했다 해서, 기표와 기의 사이의 어떤 일정한 관계도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럴 경우 정신분석학을 ‘과학’으로 정립하려 한 라캉의 시도는 좌절될 것이다. 라캉은 구조주의자인 한에서 합리주의자이며, 따라서 구조를 좀더 역동적으로 파악하려 한 것이지 합리적 파악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그럴 경우 ‘구조’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다. ‘구조’라는 말을 쓰는 한 문자 그대로 어떤 구조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라캉에게서 기표와 기의는 일정 지점(‘누빔점’)에서 만난다. 그 지점을 잡아내는 것이 라캉 사유에서 합리주의적 측면이다. 그러나 기표는 궁극적 기의에 끝내 닻을 내리지 못한다. 영원히 알 수 없는 기의의 심연이 놓여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이 라캉이 합리주의에서의 한계를 긋는 부분이다. 라캉은 이 언어학적 구조들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은유와 환유라고 생각한다. 은유는 압축이다. “불타다”와 “사랑하다”는 “뜨겁다”라는 공통 요소를 함께-중첩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압축(condensation)이다. 또한 은유는 치환을 특징으로 한다. “부자가 되다”가 ‘돼지’로 치환되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꿈이란 바로 이런 은유의 언어로 되어 있다고 했다. 은유는 동시성을 기반으로 한다. “불타다”와 “사랑하다” 그리고 “부자가 되다”와 ‘돼지’ 사이에는 어떤 시간적 선후도 없기 때문이다. 환유는 다르다. 환유는 이행이다. “잔을 들다”는 “술을 마시다”의 환유이다. “잔을 들다”와 “술을 마시다” 사이에는 이행/이동의 관계가 성립한다. 환유에서 두 항은 치환되기보다는 조합된다. 그리고 환유에는 시간적 요인이 개입한다. “잔을 들다”는 “술을 마시다”의 앞에 오며, 또 그래야만 환유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참고로 제유는 부분으로서 전체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사각모는 대학을 나타낸다). 정신분석학자는 기표들(예컨대 환자의 말)을 분석함으로써(즉 그 언어적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기의들(그런 말들이 뜻하는 환자의 ‘인생’)을 밝혀내고자 한다. 그런데 기표들과 기의들의 관계가 매끈한 일대일 대응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점들이 발생한다. 라캉은 모든 열쇠는 결국 기표들이 쥐고 있으며, 우리는 기표들의 무의식적 구조를 분석함으로써만 기의들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한다. 기의는 기표에 잡히지 않고 계속 미끄러진다. 물론 분석가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기의를 찾아낼 수밖에 없다. 분석가는 기표들이라는 낚시 바늘을 던져 기의들을 낚아낸다. 기표들과 기의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그것이 성공한다. 그러나 기의는 끝내 그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칸트의 물자체처럼, 메이에르송의 ‘탈합리적인 것’처럼 저편에 머무른다. 이곳을 라캉은 ‘실재계’라고 한다. 그것은 언어에 완전히 포획되지 않는 세계 자체, 인생 자체일 것이다. 라캉의 사유는 상상계에서 출발해 상징계로 가지만 결국 실재계에서 끝난다. 아마 인생의 ‘의미’는 영원히 기호로 포착되지 않는 그 무엇인가 보다. 욕망과 운명 프로이트는 “그것이 있던 곳에서 나는 생성하리라(Wo es war, soll ich werden)”고 했다. 나의 생성을 좌우하는 것은 무의식이다. 그것도 어릴 때 형성된 무의식이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워즈워스)라는 말은 정신분석학에서 또 다른 뉘앙스를 획득한다. 그것은 나=자아에게 타자이다. 다른 것이다. 그러나 그 타자=다름은 나의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나는 내 안에 나의 타자=무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정신분석학이 던져주는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이다. 타자란 무엇인가? 타자는 언어, 기표의 장소, 상징계이다. 이 상징계는 어린아이가 상상계에서 그곳으로 옮겨갈 때 어린아이의 무의식에 자리 잡는다. 어린아이는 상상계의 달콤함과 환상을 포기하는 대신 상징계 안에서 ‘인간’으로서, ‘주체’로서 선다. 또 타자란 상호주체성의 장이다. 상호주체성은 개별적인 주체들 사이에서 추후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상호주체성의 장 내에서만 주체들은 주체들일 수가 있다. 상징계에 들어서는 동시에 개인들의 무의식에는 상호주체성이 각인된다. 헤겔에게서 한 인간의 주체성은 타자를 통해서만, ‘자아 속의 이상한 자아’로서의 타인을 통해서만 형성된다(인정투쟁). 라캉에서도 자아는 자신 속의 이상한 자신으로서의 타자=무의식을 통해서만 형성된다. 상징계는 팔루스이며 상징계를 채우고 있는 욕망은 팔루스에의 욕망이다. 팔루스는 욕망의 기표이다. 욕망은 팔루스라는 기표를 통해서 형성된다. 그런데 욕망(desire)은 욕구(need), 요구(demand)와 다르다. 욕구는 생리학적 필요이지만, 요구는 타인에 대한 간청이다. 어린 아기는 사탕을 욕구하지만 엄마의 사랑을 요구한다. 욕구는 사물들을 향하지만 요구는 사람들을 향한다. 이에 비해 욕망은 보다 근원적인 것이다. 욕망은 어떤 구체적인 맥락에서의 부재가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결핍에서 온다. 결핍은 어린 아기가 어머니의 몸에서 분리되어 나올 때 이미 형성되는 인간의 원초적 조건이다. 인간은 그 최초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며 따라서 그 기억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는다. 그 원초적 결핍으로부터 욕망이 나온다. 욕망의 근원적 기의는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을 욕망하는가? 이미 상징계로 들어선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래서 욕망의 기표는 팔루스이다. 그러나 욕망 자체는 어디에서 오는가? 팔루스를 욕망하는 것은 주체가 되기 위한 것, ‘인간’이 되기 위한 것, 일종의 타협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정신병을 앓기 때문에 거치는 통과의례이다. 그러나 도대체 욕망이 근원적으로 지향하는 곳은 어디인가? 실재계를 영원히 알 수 없듯이 이 또한 알 수 없다. 라캉은 이곳을 ‘신화의 세계’라 부른다. 인간은 어떤 쪼개짐으로써, 갈라짐으로써 인간이 된다. 로고스의 세계에 들어서는 것이 동시에 분열의 경험이라는 것이 인간의 얄궂은 상황이다. 따라서 욕망의 근원적 기의는 그 어떤 쪼개짐도, 갈라짐도 없는 그 어디일 것이다. 이런 욕망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라캉적인 의미에서의 ‘운명’이다. 라캉은 욕망과 욕구 사이에 ‘충동(pulsion)’을 넣는다. 충동은 한편으로 욕구와 유사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성애적(性愛的)” 측면을 띤다는 점에서 욕구와는 다르다. 충동은 생리학의 영역에서 정신분석학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존재한다. 인간이 욕망의 존재인 한, 인간은 번뇌의 존재이다. 도덕이나 윤리는 상징계를 받아들임으로써 성립하며, 따라서 인간의 영원한 번뇌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라캉에게 번뇌를 해결하는 길은 우리가 왜 그렇게 번뇌의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번뇌의 실체를 알게 되며 그로부터의 공허한 몸부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라캉의 사유는 불교와 접맥된다. 라캉 사유의 의미 자크 라캉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받아들여 그것을 보다 넓은 지평에서 참신하게 재창조했다. 라캉이 프로이트와 구분되는 점은 프로이트와는 달리 극히 철학적인 성격의 담론을 전개했다는 점이다. 라캉을 통해서 정신분석학과 철학은 교차하게 되며, 그로써 주체·자기·욕망…을 비롯한 숱한 문제들이 새로운 지평에서 논의되게 되었다. 이 점에서 라캉이 현대 사상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하겠다. 라캉의 사유는 오늘날 슬라보예 지젝을 필두로 하는 ‘슬로베니아 학파’에 의해 계승되어 계속 확장되고 있다. 또 라캉의 사유는 문화예술 분야에 두드러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현대 사상을 수놓고 있다. |
| [문화 프리즘] 한국문학에 나타난 동성애 |
| 병리성 혹은 낭만적 이상화의 클리세 |
| 김은하 _ 중앙대 강사 / 문예창작 |
|
기괴한 남색가로든, 속 깊고 다정한 동성친구로든 간에 한국문학(문화)에 동성애자나 동성애가 등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적어도 해방 이후부터 1990년대 이전까지 게이·레즈비언들은 문학 동네에서 유령으로도 떠돌지 못한 채 ‘부재’했다. 물론 그들은 드물게 서사의 장으로 불려나오기도 했지만, 늘 병리성의 상징이거나 인간의 추악한 심연의 대리표상이었을 뿐이다. 이상화된 동성애자와 가부장제의 회한 최근 영화 <왕의 남자>(이준익, 2005)나 <브로크백 마운틴 Brokeback Mountain>(이안, 2005)의 대중적 성공이 가히 ‘어메이징’한 변화로 여겨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영화들은 동성애자가 주인공이고 동성애가 소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가족과 이성애자를 불러 모으고 심지어 가슴 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맑은 눈물을 흘리게 했다. 이는 분명 동성애를 ‘구역질나는 비역질’이나 유년기의 성적 트라우마와 연관짓던 관행, 즉 동성애자에 대한 이성애자의 폭력적인 상상력과는 다르다. 특히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부정적인 스테레오 타입을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상적인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동성애에 대한 악의에 찬 재현과 구분되는 이상화된 이미지가 등장한 것이다. 두 작품은 잘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촌스러운 인상을 남기는데, 무엇보다 거기에는 낭만적 사랑의 신화가 훼손되지 않은 채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게이 주인공들은 사랑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연인의 죽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자신도 이미 죽어버렸음을 감지한다. 우리 시대에 사랑의 탈낭만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본다면 관객들이 흘린 눈물은 되돌아갈 수 없는 시절에 대한 회한이자, 희미한 옛사랑에 대한 애도인지도 모른다. 그만큼 이 영화들은 게임으로서의 연애와 섹스가 넘쳐나는 시대의 얄팍한 표면을 비추고 과거로의 퇴행과 향수의 욕망을 자극한다. 물론 이 눈물은 들춰봐도 그러한 사랑의 기억을 찾을 수 없는 허전함일 수도 있다. 과거란 실상 적당히 조작된 것이고, 향수는 무지와 은폐에서 비롯되는 속성이 있지 않은가? 어쨌든, 이 작품들의 배경은 상당히 고전적인데, 그곳은 역사책 속의 한 페이지 같은 조선이거나, 로데오 경기가 펼쳐지고 굵다란 시가를 문 ‘싸나이’들이 있는 옛날의 서부다. 이렇듯 고전적 시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숭고한 사랑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경계를 뚜렷하게 부각시키며 이성애 제도를 재생산한다. <왕의 남자>의 공길은 예쁘고 감성적이며, 늘 위기에 처해 남성들의 구출 환타지를 완성시켜주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여성이다. 장생은 비록 천한 광대지만 강인한 육체와 지력 그리고 연인에 대한 순도 높은 열정을 갖춘 신사의 전형이다. 다른 한편으로 <브로크백 마운틴>은 남성들의, 여성적 문명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을 보여준다. ‘조잘대는’ 아내들이 주도하는 부부 모임에서 남자들이 주고받는 거의 유일한 대화는 집을 벗어나 낚시를 가고 싶다는 것이다. 이 영화는 우회적으로 남성을 밥벌이꾼으로 추락시킨 산업화에 대한 염증, 양육을 비롯한 급증하는 가정적 의무, 남성의 공적 지위를 위협해오는 여성들의 약진 등 거세 위협에 직면한 현대 남성들의 고뇌와 공포를 표현한다. 이렇듯 이 두 편의 영화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는 이성애적 제도에 대한 퀴어적 냉소의 참신함보다는 이성애 문화에 대한 향수와 여자들의 시대에 대한 환멸 때문은 아니었을까? 영화는 동성애자라는 미지의 캐릭터를 통해 남자다운 남자와 여자다운 여자가 있었던 과거에 대한 그리움 혹은 회한을 드러낸다. 이성애제도는 기괴한 드래그 퀸(drag queen:여성복장을 즐기는 남성)의 퀴어 공동체가 아니라 꽃보다 예쁘거나 터프한 게이의 절절한 사랑이야기를 통해 차이의 목소리가 드높아진 시대와 손해 보지 않을 타협을 했다. 그러한 타협과 양보(?)는 미덕인가? 동성애/동성애자를 이상화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사회적 억압을 은폐하는 일이다. 최근 영화나 소설은 동성 관계에 대한 낭만적 환타지를 엿보인다. 예를 들어 동성애 영화는 아니지만 자매애적 연대를 그리고 있는 <싱글즈>에서 돈 없고 혼기 찬 처녀들이 비록 고물차를 탔지만 전도양양한 왕자를 버리고 동성 친구를 선택하거나, 미혼모가 되기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은 조금도 지난하지 않다. 이들이 이성애 제도에도 흔들리지 않은 우정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겨우 서른이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모든 것을 소비하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동성애 역시 스펙터클한 상품일 수 있다. 동성애 영화에 대한 열광이 반드시 성소수자로서의 이들의 인권에 대한 윤리적 의식을 고양시키거나, 가부장적 이성애 제도에 대한 반성으로 귀결되지는 않는 것이다. 거세공포의 문학과 ‘열정’의 시기 그리고 동성애 앞서도 말했지만,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의 소설에서 동성애자 찾기란 ‘윌리를 찾기’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필자는 이른바 제도권 밖의 게이, 레즈비언 문학에 대한 별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 글은 문학이라는 제도가 인준해 준 작품들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편협하다. 참고로, 동성애/동성애자가 언급되는 정도도 있지만 꽤 비중 있게 그려진 작품 중 필자가 이 글에서 거론하지 않은 작품을 밝혀둔다. <나는 너무 멀리왔을까>(강석경), <마짠 방향으로>(배수아), 《내가 사랑한 캔디》(백민석), 《그녀의 여자》(서영은), <송어와 은어>(송경아), 《꽃을 던지고 싶다》(이명랑), <남자의 기원>, <다섯 번째 질서와 여섯 번째 질서 사이에 세워진 목조마네킹 헥토르와 안드로마케>(전경린), <푸른 수염의 세 번째 아내>(하성란)). 한국 현대소설은 일제 식민지, 미군정기, 분단, 반(半)식민 근대화, 전체주의적 근대화를 겪으며 일정한 서사적 관습을 형성하는데, 이때 한국 소설이 발견해 낸 문제적 인물은 오욕에 찬 역사로 인해 주체성이 훼손당하고,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남자였다. 그는 어머니나 누이가 이국 병사에게 겁탈당한 기억 때문에 수치스러워 하거나, 미군의 원조 덕분에 이룩한 산업화의 부정성을 고뇌하며, 분단과 이후 전체주의적 근대화 과정에서 사상의 자유를 억눌린 남자였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개발과 독재의 정치와 격렬하게 투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치스러운 식민의 기억을 지워버릴 만한 민족 국가에 대한 국가의 열망을 내면화하며 가부장권을 강화하거나 좀더 남자다워져야 할 필요가 있는 남성들이었다. 국가에 협력하든 저항하든 남성다움은 이들의 열망의 대상이었다. 한국 현대문학은 보수와 진보, 자유와 실천의 대립구도가 무색하리만큼 여성·섹슈얼리티·무의식·자연·사적 영역 등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한국문학은 이성애적 제도 위에 스스로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재생산해 냈다. 특히 근대적 민족 국가 건설을 향한 집단적 소망은 섹슈얼리티를 엄격한 규제 대상으로 만들었다. 《별들의 고향》(최인호, 1972)의 문호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섹스와 소비를 상징하는 경아가 죽어야만 했다. 문호의 입사식(入社式)은 자신이 근대적 생산에 협력하지 않고 섹스에 탐닉했다는 반성과 함께 이루어진다. 또한 <壯士의 꿈>(황석영, 1974)에서 산업화와 욕망의 부정성을 상징하는 ‘따루마 감독’은 “알록달록한 홈스펀 저고리” “빨간 구두” “희고 보드라운 살결” 긴 머리의, “불알이 없는” 남자로 묘사된다. 이 작품은 도시(산업화)의 부정성을 거구의 장사인 일봉이 도시로 와 포르노 배우와 남창을 전전하다 급기야 성기능 상실자가 되는 과정을 통해 비판한다. 소설은 그가 귀향을 서두르면서 순간적으로 성적 기능을 회복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는데, 이러한 성적 비유들은 한국현대문학의 근저에 거세 콤플렉스가 자리잡고 있음을 암시한다. 남성성은 이성애제도의 산물이자 그것을 보완하는 구실을 한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문학은 매우 가부장적이다. 이는 문학 작품 속의 여성의 주변화나 동성애자의 부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문학이 다양한 차이들에 주목하지 못했다는 점은 여성 캐릭터는 ‘창녀’ 아니면 어머니 밖에 없고, 동성애자는 전무한 데서 증명된다. 그러나 한국문학사에는 동성애자가 반드시 병리성의 징후이지 않은 때도 있었다. 이광수의 초기 소설 <윤광호>(《춘추》 1918년 4월)는 동경 K대학 경제과 학생인 윤광호가 동성의 P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거부당하고 자살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또한 한국 최초의 근대적 장편 소설인 《무정》(이광수, 1917년)에는 기생 영채와 그녀가 형님처럼 따르는 명기 월화가 육욕에만 눈 먼 호색한들에 대한 혐오와 원치 않는 삶을 사는 데서 오는 슬픔으로 서로를 끌어안는 장면이 버젓이 등장한다. 이들의 성애는 암시적이기보다는 제법 노골적이다. 그러나 서술자는 윤광호나, 스스럼없이 서로의 육체를 어루만지는 여성들을 향해 비난의 시선을 던지지 않는다. 이들이 눈 뜬 관능은 오히려 사람다운 자각으로 조명된다. 사춘기에 접어든 윤광호가 어느 날 발견한 것은 자기 속의 “크고 깊은 공동(空洞)”(289면)으로 비유된 깊은 고독과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열정으로서의 사랑이다. 열정을 가진 개인의 발견은 근대의 부르주아지가 형식과 의무에 매인 삶을 산 봉건적 세대와 스스로를 구별 짓는 지점이었다. 최정희의 《녹색의 문》은 비록 발간된 시기는 1953년이지만, 식민지 근대화기를 소설의 배경으로 취하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도 여성 간의 제법 진한 성애 장면이 등장한다. 개인의 열정은 공적이거나 이타적인 욕망으로 전환되지 못해 비판받기는 해도, 소설 속 인물들은 이성이 아닌 동성을 사랑했다고 반성하지는 않는다. 언론은 1931년 명문가의 딸인 홍과 부호의 며느리인 김이 동반 철도자살을 하자 이를 “과도기에 처해 잇는 조선 여성 중의 애매한 타입을 가지고 엄벙하니 떠도는 여성 중의 한 사람의 파국”이라고 해석한다. 이는 기혼녀인 김의 자살이 부모에 의한 강제 결혼 생활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백면아의 이 글은 이들의 죽음에서 봉건적 조선의 폐해를 통찰해내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동성애 관계로 적극적으로 읽어내지 않는다. 이는 동성애를 이성애제도에 대한 갈등과 전복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당시는 식민지 시기 최초로 근대적 여학교가 세워지고 여학생들이 가족을 벗어나 동성과의 관계라는 최초의 사교관계를 경험하면서 여학생 동성애가 문젯거리로 등장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당대의 담론들은 여성 동성 관계가 여성들의 이성애적 탈선을 막아줄 것이며, 얼마 되지 않아 없어질 일시적 풍조라고 해석한다. 동성애에 대한 관대한 시선은 이성애 제도가 그만큼 강고했음을 의미한다. 어쨌든 저 혼란스럽고 전복적이며 열정적인 시대를 거쳐 해방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동성애자는 실종되어 버린다. 식민지 근대화를 주도한, 스스로를 봉건적 아비와 구별 짓고자 한 오빠의 시대가 가고, 국가 재건과 근대화라는 총력전에 앞장 선 아버지들의 시대가 온 것이다. 오빠와 아버지의 거리가 그리 먼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페미니즘의 레즈비어니즘 끌어안기 동성애가 문학 작품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이후 여성 작가들에 의해서였다. 90년대 문학은 문학사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 주목해 볼 때 매우 이질적인 시대라 할 만하다. 이 시기의 문학의 주류를 형성한 이들은 30대의 여성 작가였고, 성·사랑·가족은 이들의 주된 서사의 장이었다. 이는 이전 시기 문학을 주도한 남성 작가들이 주목해 온 전쟁·분단·노동·이념·변혁·산업화·전통 붕괴·농촌 해체 등과 같은 비교적 큰 이야기와는 다른 것이었다. 여성 작가들은 동성애/동성애자라는 제재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가부장제의 억압성을 환기하거나 그것에 대한 반격을 시도했다. 페미니스트 문학은 가부장제에 의해 훼손된 여여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여성적 주체성을 되찾기 위한 시도로서 레즈비어니즘을 수용했다.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여성의 존재는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 결정된다. 이를 테면 여성들은 거주, 가사, 경제적 조건, 사회적 지위 등의 장치를 통해 아버지나 남편과 유착 관계를 맺고 모든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지위를 구비한 남성들로부터 물질적 보호를 받기 위해 그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타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창조성의 상실은 여성되기의 절차이며 무력함은 여성적 미덕으로 미화된다. ‘아버지의 법’을 수행하는 정상적인 여성이 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연대와 상호이해보다는 서로에 대한 적대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녀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자매이다. 또한 서로 한 몸으로 살았던 시절을 잊고 서로를 수치스러워 하며 유기하는 어머니와 딸이다. 레즈비어니즘은 단지 동성 간의 육체의 교류가 아닌 서로를 동반자로 받아들임으로써 남성의 피보호자-타자라는 여성의 무력한 위치를 벗어나는 계기로 조명된다. <하나코는 없다>(최윤, 1994년)는 삶의 심연 앞에 직면한 남성들이 어떻게 여성을 타자화함으로써 그 위기를 피해 가는지 보여준다. 이니셜로 표기된 동창생들은 자신들의 이너서클이 지루해졌을 때, 사귀던 여자와의 심리전에 지쳤을 때, 삶의 무의미성에 직면 할 때 ‘하나코’를 불러낸다. 그들 각자는 그녀에게 구애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은밀한 비밀을 털어놓기도 하지만 서클의 결속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그녀를 각각 한 발짝만큼의 거리를 둔 채 공유한다. 그들은 동창이면서 동시에 사업적 파트너이기도 하다. 하나코는 지나치게 똑똑하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고, 대단한 미인은 아니지만 매력이 있으며, 친구이면서 연인 같아서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이 되는, 남자에게 아무 것도 청구할 권리가 없는 첩이다. 하나코라는 별칭은 남성중심 사회에서 훼손되는 여성의 주체성을 암시한다. 소설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디자이너로 성공한 하나코의 곁에 사업적 파트너이자 동반자인 동성 친구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레즈비어니즘을 페미니즘과 결합시킨다. 이렇듯 <하나코는 없다>가 레즈비어니즘을 여성 간의 육체적 접촉으로만 규정하는 포르노적 시선을 차단하며 여성들을 서로의 감정과 내면생활을 공유하는 동반자로 제시하는 데 비해 근친상간 못지않은 금기인 동성의 육체를 끌어안는 위반을 범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여성들의 에로틱한 성적 행위는 모성의 몸으로 규정당하면서 억눌린 여성의 성적 욕망을 되찾고 거울과 저울 사이에서 사물화된 여성의 몸을 자유롭게 하는 제의가 된다. <밤의 수영장>(강영숙, 2002년)에서 한때 수영선수였던 여자는 지금은 비대한 육체를 향한 타인의 경멸적 시선 탓에 손님이 빠져 나간 수영장에서 코르셋에 갇힌 몸을 풀어놓는 수영장 직원이다. 여자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한때는 인어같이 날렵했지만 지금은 빈곤과 양육 노동에 짓눌린 뚱뚱한 여자를 만나 서로의 육체를 끌어안음으로써 “오랜 세월 짓눌린 살들”을 물 밖의 세상에 부드럽게 풀어놓는다. <세번째 유방>(천운영, 2004년)은 세 번째 유방을 가진 여성들의 동성애를 통해 여성의 몸의 주권을 탈환하려는 판타스틱한 상상력을 펼쳐 보인다. 여성의 유방은 아기·연인·법원·의학·포르노 작가·예술가·정신분석학자들에 의해 그 의미가 확정되어왔다. 그것은 아기에게 생명을 주는 좋은 것으로 칭송받는 동시에 유혹의 미끼로 비난받는다. 남성 사회가 소유할 수 없는 여성의 주체성을 상징하는 세 번째 유방과 서로의 육체를 매개로 자신의 육체를 나르시스틱하게 향유하는 여성동성애자들의 섹슈얼리티는 여자의 유방을 소유함으로써 수컷다움을 회복하려는 남성의 기획에 부딪힌다. 비록 여자는 남자의 칼에 찔려 죽지만, 남성이 끝내 차지하지 못한 세 번째 유방과 여성동성애는 남성지배가 관철되는 몸을 여성주체성을 재구축하는 장소로 재전유한다. <무궁화>(정이현, 2003년) 역시 여성의 성기와, 국가를 상징하는 무궁화를 병치시킴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특히 동성애/레즈비언의 서로를 향한 욕망을 질시함으로써 처벌해온 가부장적 국가에 대한 반격을 시도한다. 주인공은 기혼녀인 연인이 끝내 사회적 시선의 폭력이 두려워 떠나버리자 동성의 사랑을 허용하지 않는 세상을 향한 도발을 감행하듯 자신의 성기를 카메라 렌즈에 담아 사랑하는 너의 사진 옆에 붙여둔다. 지배적 관습에 대한 반란 페미니스트 작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차용된 레즈비어니즘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데 비해 스토리의 작위성과 관념성이 두드러지기도 한다. <플라스틱 섹스>, <여자가 여자일 때-플라스틱 섹스 Ⅱ>, <어두운 열정―플라스틱 섹스 Ⅲ>(이남희, 1997년)는 성·사랑·가족 등 미시적 영역의 변화를 발빠르게 읽어내면서 새로운 시대의 전망을 찾으려는 열망이 진지하게 드러난 작품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작품은 페미니스트의 계몽적 의도가 앞설 때 그것이 역설적으로 레즈비어니즘을 신비화하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초록이 자신들의 사랑을 부인하는 은명에게 분노해 그녀의 소설이 담긴 노트북을 가지고 달아나자, 은명이 초록이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몸과 정신의 괴리를 엿보고, 이를 화해시키려는 관념적 사색으로 채워져 있다. 사실 이 작품은, 몸은 이미 개종되었지만 머리가 몸의 해방을 가로막는 족쇄이기는커녕, 머리는 이미 레즈비언 페미니즘을 정치적으로 올바른 대안으로 선택했으나 몸이 따라주지 않는 80년 세대의 자화상을 보여준다. 은명의, 신세대 언더그라운드 문화와 90년 이후 성정치 운동의 포문을 연 신세대 레즈비언을 향한 호기심과 이에 대한 지적 성찰은 전망이 사라진 시대 앞에 선 80년 세대의 절망과 고뇌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성급하게 레즈비어니즘이 대안으로 호출되면서 페미니스트의 마술지팡이로 수단화된다는 것이다. 이십대의 레즈인 초록이는 은명의 젊음에 대한 선망과 뒤섞여 지독히 매력적이고 개성적인 인물로 진술된다. 그러나 그녀를 사랑한 여성들의 애절한 회고에도 불구하고 독자 스스로가 그것을 판단하고 동의할만한 객관적 근거는 허약하기만 하다. 집 나와 뚜렷한 직업 없이 세상을 떠도는 어린 레즈비언이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조금만 더 나이 들면 쓸쓸히 동사할 수 있다는 공포로 영혼을 잠식당할지도 모른다. 동성애자를 질시하는 것만큼이나 대안적 삶을 요구하는 것 역시 혹독한 강요일 수 있다. 위에서 거론한 <무궁화> <밤의 수영장> <세번째 유방> 역시 작위성을 면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선명히 드러나는 이론적 구도, 다소 생뚱맞거나 뻔한 결말, 정치적으로는 올바르지만 정서적 울림을 주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엿보이는 것이다. 동성애자의 경험과 감수성을 의도적으로 내세운다고 해서 이성애 제도에 기반한 관습적 상상력에 균열이 일어나리라고 보장할 수도 없다. 본격적인 동성애 소설이 더 짙은 작위성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비록 성소수자나 페미니스트로서의 자의식은 덜 두드러진다 할지라도, 이성애 제도의 관습적 상상력과 충돌하는 동성애/동성애자 캐릭터나 그들의 경험은 남성성/여성성의 젠더 도식에 혼선을 가져와 가부장 제도를 잠식할 수 있다. 오정희의 <완구점 여인>(1968년)은 소녀가, 휠체어 여인과의 동성애적 관계를 통해 성에 대한 관능과 혐오, 죽은 동생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 깨어진 가족을 대한 애절한 상실감을 경험하며 세계와 존재에 대해 어렴풋이 자각해 내는 과정을 담아낸다. 도벽에 시달리고 청결한 학교 복도에 뻣뻣이 선 채 오줌을 누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는 소녀의 성장 담화는 관습적인 소녀의 성장담과 충돌하며, 여성되기의 통과의례를 겪는 사춘기 소녀의 지난한 성장통을 여실히 보여준다. 소녀의 계모에 대한 혐오의 시선이 연민의 감정과 복잡하게 뒤섞이는 과정은 여성의 정체성이 모성으로만 규정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走者>(주자, 1969년)는 비록 성소수자로서의 확고한 정체성과는 거리가 먼 작품이지만 동성 연인의 자살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한편으로 자신의 게이 정체성을 부인하는 남성의 갈등을 통해 역설적으로 성소수자들의 허약한 관계와 불안한 내면을 여실히 드러낸다. 인간 주체를 섹슈얼리티를 통해 낙인 찍고 인격화하는 이성애제도로부터 탈주하듯 질주하는 남자에게서 사회적 타자들이 겪는 소외와 억압을 읽을 수 있다. <절규>(윤이형,문학사상 4월호) 역시 가족과 세상이 받아들여주지 않는 사랑을 하는 레즈비언과 가부장적 아버지와 가족으로부터 상처 입은 이성애자 여성의 소외를 절규의 모티프 위에 겹쳐 놓음으로써 사회적 타자들의 연대와 공감의 상상력을 확대해 나간다. 이는 동성애 모티프가 이성애 문화에 기반한 한국문학의 외연을 확장하고 내연을 새롭게 하는 해체의 일환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성애, 이성관계에 대해 이미 쓰라린 실망을 맛 본 우리 시대는 동성애나 동성 관계에 대한 판타지를 부여함으로써 또 다시 그들을 타자화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렇듯 우리 시대에 동성애가 소환되는 방식은 실상 그다지 새로운 것도 아니다. 과도한 단순화일 수 있지만, 한때 정치적 세대들은 역사와 자기 세대들에 대한 환멸을 페미니즘이나 에콜로지 같은 새로운 요술램프에 기대어 극복하고자 했다. 문제는 전망에 대한 강박적이거나 야단스러운 기대는 결국 조만간에 또 다른 환멸과 혐오로 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한국문학의 관습이 동성애라는 하위담론과 만나 어떻게 소통하고 변신을 모색할 지를 신중하게 지켜 볼 일이다. |



 070427청주지방법원.pdf
070427청주지방법원.pdf [호적예규 제722호].hwp
[호적예규 제722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