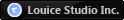다시 보는 숭산 스님 전법 이야기 6
- 시주없어 세탁소취직…신도 점차 늘어-
- 좁은 아파트 합숙하며 참선 지도 -
미국행 비행기에서 만났던 김정선 교수를 다시 만난 것은 보스톤에서 1시간가량 차를 달린 후였다. 그곳의 학생 너 댓명이 미리 교수의 집에 와 있는 것을 보고 행원스님은 놀랐다.
“스님, 반갑습니다. 스님이 오신다니까 이렇게 학생들까지 찾아 왔군요. 다들 불교에 관심이 많아서….”
김교수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스님과 학생들사이에도 간단히 인사가 치뤄졌다. 그리고는 스님을 중심으로 둘러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사실은 이야기를 나눴다기 보다는 “불교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십시오”라는 교수의 청에 대해 행원스님이 법문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야기판은 금방 깨지고 말았다. 행원스님이 ‘선이란 무엇이냐’ ‘불립문자요 직지인심이란 말은 무슨 의미냐’를 이야기 하면 그 통역을 김교수가 하는데 의미가 바르게 전달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기야 ‘언어도단’과 ‘불립문자’의 뜻을 서로 다른 언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되지 못할 일이기도 했다. 불교를 가르치는 이야기판은 깨졌지만 학생들은 스님과 좀더 오래 만나며 조금씩 배우고 싶다고 청했다. 이미 미국포교에 뜻을 세운 뒤인데 무엇을 망설일 것인가.
행원스님은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얻었다. 그리고는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참선을 지도했다. 역시 말이 안통하는게 큰 어려움이었다. 스님이 아무말 없이 방석을 깔고 가부좌를 틀면 학생들도 그것을 따라했다. 죽비 소리에 맞춰 앉고 또 일어서 움직이는 것으로 참선을 지도하는데는 아무래도 답답한 그 무엇이 있었다.
왜 그렇게 앉고 앉아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설법을 해야 했다. 빈 깡통에 흙을 퍼 넣더라도 그 이유와 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 열의에 찬 학생들을 그저 멍청히 앉아 있게만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편법이긴 했지만 최면술을 조금씩 써가며 학생들에게 단전호흡법을 가르치는 한편으로 간단한 말로 선(禪)의 목적 등을 설명했다. 통역하는 김교수도 무척 힘들었겠지만 내색은 않고 늘 즐거운 표정이었다.
다시 흑인촌으로 아파트를 옮겼는데 참선을 배우러 찾아오는 신자가 30여명이나 됐다. 그곳에 브라운대학의 프르덴 교수가 찾아 왔는데 그는 일본말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동경대학에서 인도철학을 공부하고 하바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스님에게 참선을 배우고 싶다며 스스로 찾아 온 것이었다.
프르덴 교수가 일본말에 능했던 것이 스님에게만 반가운 일일 수 없었다. 30여명의 학생들에게도 해당되는 반가움이었다. 이제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스님의 설법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스님이 일본말로 뭔가를 얘기하면 프르덴교수는 담박에 그것을 영어로 옮겨 듣는 이의 귀를 열어 주었던 것이다.
매주 아파트가 메어지도록 사람들이 몰려왔다. 50명, 60명, 90명… 이렇게 참가자가 많은 법회를 열어 나가다 보니 살림살이가 궁핍해 질 수 밖에 없었다.
보시나 시주가 무엇인지 알 미국신도는 없었고 그것을 강요할 형편도 못 되었다. 할 수 없이 행원스님은 세탁소에 일자리를 얻었다. 영주권이 없다는 이유로 한달 품삯도 2백50불 이상을 받지 못했다. 영주권 있는 사람의 6백~7백불에 비하면 억울하기 짝이 없는 월급이었지만 달리 항변할 문도 벽도 없었다.
반년이란 시간이 그렇게 지나 갔어도 지루하지 않았다. 매일 찾아 오는 사람에게 참선을 가르치고 금요일 밤에는 정기법회를 가지며 지내는 동안 아예 스님의 법당에 들어 와 살겠다는 사람도 한 두 사람씩 생겼다.
“마음 자리를 하나로 하려는데 같이 못 살 것도 없지. 들어와 살도록 해요.”스님과 그들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와 함께 예불하고 참선하고 그렇게 단체생활을 했던 것이다. 입이 많다보니 먹거리의 소모도 만만치 않았다. 밥에 두부와 김치와 물을 넣고 끓여 주어도 그들은 맛나게 먹었다.
“스님, 오늘은 저희가 식사를 짓겠습니다.”
“그래 보시오.”
그들은 빵이니 우유등속을 장만하고 쌀을 구해다 밥을 짓기도 했는데 제법 밥이 잘 되었다. 함께 살면서 간단한 말과 몸짓의 의사 소통만 가능해 진 것이 아니라 밥짓는 일까지 배우게 된 것인가 싶었다. 그런데 그 잘된 밥을 그릇에 퍼담은 한 제자가 다시 물을 붓더니 끓여서 내왔다.
“아니 밥 잘 지어서 이게 뭐야.”
의아해 하는 스님께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전에 스님이 이렇게 끓는 물을 부어 드셨잖아요.”
“하하하, 그것은 찬밥이어서 그렇게 먹은 것이지….”
임연태 기자
- 시주없어 세탁소취직…신도 점차 늘어-
- 좁은 아파트 합숙하며 참선 지도 -
미국행 비행기에서 만났던 김정선 교수를 다시 만난 것은 보스톤에서 1시간가량 차를 달린 후였다. 그곳의 학생 너 댓명이 미리 교수의 집에 와 있는 것을 보고 행원스님은 놀랐다.
“스님, 반갑습니다. 스님이 오신다니까 이렇게 학생들까지 찾아 왔군요. 다들 불교에 관심이 많아서….”
김교수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스님과 학생들사이에도 간단히 인사가 치뤄졌다. 그리고는 스님을 중심으로 둘러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사실은 이야기를 나눴다기 보다는 “불교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십시오”라는 교수의 청에 대해 행원스님이 법문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야기판은 금방 깨지고 말았다. 행원스님이 ‘선이란 무엇이냐’ ‘불립문자요 직지인심이란 말은 무슨 의미냐’를 이야기 하면 그 통역을 김교수가 하는데 의미가 바르게 전달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기야 ‘언어도단’과 ‘불립문자’의 뜻을 서로 다른 언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되지 못할 일이기도 했다. 불교를 가르치는 이야기판은 깨졌지만 학생들은 스님과 좀더 오래 만나며 조금씩 배우고 싶다고 청했다. 이미 미국포교에 뜻을 세운 뒤인데 무엇을 망설일 것인가.
행원스님은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얻었다. 그리고는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참선을 지도했다. 역시 말이 안통하는게 큰 어려움이었다. 스님이 아무말 없이 방석을 깔고 가부좌를 틀면 학생들도 그것을 따라했다. 죽비 소리에 맞춰 앉고 또 일어서 움직이는 것으로 참선을 지도하는데는 아무래도 답답한 그 무엇이 있었다.
왜 그렇게 앉고 앉아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설법을 해야 했다. 빈 깡통에 흙을 퍼 넣더라도 그 이유와 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 열의에 찬 학생들을 그저 멍청히 앉아 있게만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편법이긴 했지만 최면술을 조금씩 써가며 학생들에게 단전호흡법을 가르치는 한편으로 간단한 말로 선(禪)의 목적 등을 설명했다. 통역하는 김교수도 무척 힘들었겠지만 내색은 않고 늘 즐거운 표정이었다.
다시 흑인촌으로 아파트를 옮겼는데 참선을 배우러 찾아오는 신자가 30여명이나 됐다. 그곳에 브라운대학의 프르덴 교수가 찾아 왔는데 그는 일본말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동경대학에서 인도철학을 공부하고 하바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스님에게 참선을 배우고 싶다며 스스로 찾아 온 것이었다.
프르덴 교수가 일본말에 능했던 것이 스님에게만 반가운 일일 수 없었다. 30여명의 학생들에게도 해당되는 반가움이었다. 이제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스님의 설법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스님이 일본말로 뭔가를 얘기하면 프르덴교수는 담박에 그것을 영어로 옮겨 듣는 이의 귀를 열어 주었던 것이다.
매주 아파트가 메어지도록 사람들이 몰려왔다. 50명, 60명, 90명… 이렇게 참가자가 많은 법회를 열어 나가다 보니 살림살이가 궁핍해 질 수 밖에 없었다.
보시나 시주가 무엇인지 알 미국신도는 없었고 그것을 강요할 형편도 못 되었다. 할 수 없이 행원스님은 세탁소에 일자리를 얻었다. 영주권이 없다는 이유로 한달 품삯도 2백50불 이상을 받지 못했다. 영주권 있는 사람의 6백~7백불에 비하면 억울하기 짝이 없는 월급이었지만 달리 항변할 문도 벽도 없었다.
반년이란 시간이 그렇게 지나 갔어도 지루하지 않았다. 매일 찾아 오는 사람에게 참선을 가르치고 금요일 밤에는 정기법회를 가지며 지내는 동안 아예 스님의 법당에 들어 와 살겠다는 사람도 한 두 사람씩 생겼다.
“마음 자리를 하나로 하려는데 같이 못 살 것도 없지. 들어와 살도록 해요.”스님과 그들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와 함께 예불하고 참선하고 그렇게 단체생활을 했던 것이다. 입이 많다보니 먹거리의 소모도 만만치 않았다. 밥에 두부와 김치와 물을 넣고 끓여 주어도 그들은 맛나게 먹었다.
“스님, 오늘은 저희가 식사를 짓겠습니다.”
“그래 보시오.”
그들은 빵이니 우유등속을 장만하고 쌀을 구해다 밥을 짓기도 했는데 제법 밥이 잘 되었다. 함께 살면서 간단한 말과 몸짓의 의사 소통만 가능해 진 것이 아니라 밥짓는 일까지 배우게 된 것인가 싶었다. 그런데 그 잘된 밥을 그릇에 퍼담은 한 제자가 다시 물을 붓더니 끓여서 내왔다.
“아니 밥 잘 지어서 이게 뭐야.”
의아해 하는 스님께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전에 스님이 이렇게 끓는 물을 부어 드셨잖아요.”
“하하하, 그것은 찬밥이어서 그렇게 먹은 것이지….”
임연태 기자
Trackback URL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
Trackback RSS : http://www.fallight.com/rss/trackback/128
Trackback ATOM : http://www.fallight.com/atom/trackback/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