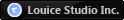내겐 뭔가 확실한 전기가 필요해. 죄다 끝내버리고 싶어. 이 어마어마하게 그로테스크한 농담을 너무 늦기 전에 모조리 끝장내고 싶어. 하지만 시나 몇 줄 긁적대고 편지 나부랭이나 써봤자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ㅡ p.51 내게는 이미 과도한 양심이 주입되어 있어, 파괴적인 후유증 없이는 관습을 파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시기심에 가득 차 한계선까지 몸을 쭉 뻗고는, 아무런 근심도 거리낌도 없이 성적인 굶주림을 해결하고 쉽사리 온전한 자아를 찾을 수 있는 남자애들을 증오하고, 증오하고, 또 증오하는 수밖에. 나는 이렇게 날마다 질척거리는 욕망에 질질 끌려다니며 욕구 불만에 시달리는데. 정말이지 이런 일 신물이 난다. … 네게 한때 지나가는 여자가 되는 것만은 참을 수 없기에 이젠 너를 끊어내려 해…. 내가 몸을 줄 사람은, 나의 사상과 정신과 꿈을 먼저 가져야만 해. 하지만 네겐 아무것도 줄 수 없었어. 짝을 찾아 헤매고, 시험을 하고, 시행착오를 하는 이 게임에서는 너무나 많은 상처가 생긴다. 그러다가 별안간 이게 게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깨달음이 뇌리를 강타하면,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는 거다. ㅡ p.53 이젠 고독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릴 고독감이긴 하지만. 고독은 자아의 형체 없는 핵심에서 나온다. 마치 핏속에 질병처럼 은근히 전신으로 확대되더니 이제 감염 경로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ㅡ p.58 이렇게 오랫동안 이 일기장에 글을 쓰지 않은 이유 중엔, 글로 적을 만한 일관된 생각을 단 한 가지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있다. 내 마음은, 역겨울 정도로 적나라한 직유를 들어보자면 마치 파지(破紙)와 머리카락, 썩어가는 사과 심들로 가득 찬 쓰레기통 같다. 너무나 많은 삶들에 접촉했는데, 그 중 너무나 많은 삶들이 흥미진진하고, 내 경험의 영역에 낯설다는 사실 때문에 우울한 기분이다.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면서 가장자리만 갉아먹어보는데, 그게 마음에 거슬린다. ㅡ p.61 나는 나보다 더 깊이 사유하고, 더 좋은 글을 쓰고, 더 그림을 잘 그리고, 스키도 더 잘 타고, 외모도 뛰어나며, 더 잘 사랑하며, 더 잘 살아가는 이들을 질투한다. ㅡ p.63 항상 능동적이고 행복할 것이냐, 내성적으로 수동적으로 슬퍼할 것이냐, 내게는 두 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다. 아니면 둘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미쳐버릴 수도 있다. ㅡ p.71 그래, 분명 너는 지난 18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들을 몇 줄의 문장들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네들의 인생과 그네들의 소망과 그네들의 꿈까지도 설명할 수 있을까? 해볼수야 있겠지만, 그들의 인생과 소망과 꿈도 결국 너와 다를 바 없을 텐데…. 너 역시 이 설명 불가능한 수수께끼 ㅡ 뒤틀린 긴장과, 비합리적인 사랑과 연대의식과 충성으로 뭉친, 한피를 나누어 출생하고 성장한 이 가족 집단의 일원이므로. 지금의 너를 만들어 낸 데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므로. ㅡ pp.74~75 그런데도 이만큼 완벽하고 흡족한 상대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이 또 고개를 든다. 만일 평생 동안 이 선택을 후회하면서 살아야 한다면? 지금 당장, 아니면 머지않아 결행해야만 할 선택인데, 과연 누가 먼저 용기를 낼 것인가? 마음 바쳐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날 수만 있다면, 헤어짐이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을텐데. … 나를 따뜻하게 감싸줄 또 하나의 육체가 얼마나 필요한지! 안식 속에 자리잡은 신뢰감은 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말이야! ㅡ pp.111-112 비록 일상의 쳇바퀴에 지독히도 저항하던 사람이라 해도, 반복되는 생활의 궤도에서 탈선하는 순간 불편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나 역시 그러하다.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어디로 돌아야 할까? 어떤 매듭, 어느 뿌리를 믿고 매달려야 할까? 집에 돌아온 나는 이렇게 낯설고 희박한 대기 속에서 어디에도 마음 붙이지 못한 채 공중에 붕 떠 있다…. ㅡ pp.123~124 어디 있는 누구든,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란 게 있기나 한 건가? 아니, 꿈속에서, 혹은 손수 만들거나 다른 이가 만들어준 인공 조형물 속에 살고 있지 않다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없다. … 도대체 어쩌다 어떻게 네가 성장해 스물한 살 생일에 이르게 되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 나는 사랑받고 싶기에 누군가 사랑하고 싶다. 토끼처럼 두려워, 불빛이 너무 무서워서 자동차 바퀴 밑으로 몸을 던지고 싶은 심정이다. 바퀴들의 맹목적이고 어두운 죽음 밑에 깔려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 아주 피곤하고, 아주 진부하고, 아주 혼란스러운 느낌이다. 오늘 밤에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쓰러질 때까지 걷다가 집에 돌아가는 불가피한 궤도를 완성하지 못한다면 좋겠다. … 나는 혼자 공부하고 혼자 사고한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행동한다. 두 가지 모두를 사랑하며, 두 가지 모두 내게는 소중하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안다면, 그가 누구인지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 사랑은 환상에 불과하지만, 진심으로 믿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 마음을 모두 바칠 텐데. 지금은 마치 깊은 협곡 밑바닥에 드리워진 그늘 한 점처럼 모든 것이 너무 멀고 서글프고 싸늘하게만 느껴지거나, 아니면 분홍색 층층 나무처럼 뜨뜻미지근하고 가깝고 생각 없는 것처럼 보인다. ㅡ pp.177~178 삶의 모든 건 빠짐없이 글로 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배짱만 두둑하다면, 또 즉흥적인 상상력만 있다면. 창조력에 있어 최악의 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야. ㅡ p.186 나는 항상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나를 찾는 발소리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실망하곤 한다. 어째서, 어째서, 나는 한동안만이라도 금욕하는 고행자가 될 수 없을까? 왜 항상 작업과 독서를 위한 철저한 고독의 문간에서 떠나지 못하고 서성이며, 또 한편으로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손길과 말, 그 몸짓을 이토록, 이토록 그리워하는 것일까? ㅡ p.235 더는 자포자기도 말고 위안을 찾아 명예를 내던지는 일도 말자. 술로 도피하거나 낯선 남자를 만나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도 말자. 약해지지 말고 날마나 속으로 피를 흘린다고 하소연하지도 말자. 날마다 핏방울이 뚝뚝 흐르고, 흐른 피가 모여 엉겨 붙는 고통을 하소연하지도 말자. … 내가 가장 쇠약해져 있을 때 나를 찾아오는 무수한 절망들 ㅡ p.261~262 ㅡ 실비아 플라스 (김선형 옮김),『일기』, 문예출판사 |
TAGS 발췌
Trackback URL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
Trackback RSS : http://www.fallight.com/rss/trackback/2100
Trackback ATOM : http://www.fallight.com/atom/trackback/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