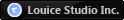그는 10여 년 전에 지바나코하고 정사(情死)를 하려고 한 일이 있었다. 그 무렵 그는 죽고 싶다, 죽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었을 정도이니까,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아무런 이유도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독신으로 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생활에 떠오르는 물거품처럼 덧없는 꽃과도 같은 상념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희망은 누군가가 다른 데서 가져다 주기라도 하는 듯이 멍하니 남에게 자기의 몸을 내맡기고 있고, 또한 그런 현실에서는 살아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지바나코는 같이 정사할 대상으로는 안성맞춤이라고 느껴졌다. 과연 지바나코는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여느 때와 똑같은 표정으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단 한 가지의 주문을 했다. “옷자락이 펄럭거린다고 하니까 발을 꽁꽁 묶어 주세요.” 그는 가느다란 끈으로 묶으면서 그녀의 발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새삼스럽게 놀라며, “그 녀석도 이런 아름다운 여인하고 죽었다고들 말하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드러눕더니 무심히 눈을 감고 목을 약간 폈다. 그러고는 합장을 했다. 그때 그는 번개처럼 허무의 고마움을 느꼈다. “아아, 죽는 게 아니야.” 그는 물론 죽일 생각도 죽을 마음도 없었다. 지바나코가 진정이었는지 장난하는 마음이었는지는 모른다. 그 어느 쪽도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한여름의 오후였다. 그러나 그는 무엇인가에 몹시 놀란 나머지, 그 후부터 자살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고 또한 입에도 담지 않게 되었다. 가령 어떠한 일이 있든지 이 여자를 고맙게 생각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때 그의 마음속에 문득 떠올랐던 것이다. ㅡ 가와바타 야스나리 (장경룡 옮김),「금수」,『설국』, 문예출판사, pp.225~226 |
TAGS 발췌
Trackback URL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
Trackback RSS : http://www.fallight.com/rss/trackback/2095
Trackback ATOM : http://www.fallight.com/atom/trackback/2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