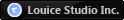그 사람 이름은 모른다.
4년전, 공익 시절,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다. 말끔한 차림이었는데 구청에 일이 있어 온 듯한 모습이었다. 자못 친근한 척 굴면서 요즘 공익 생활이 힘들지 않느냐, 자기는 해군 장교 출신이며 자기 때는 줄빠따를 맞고 때리고 했다며 위로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말을 하곤 가버렸던 사람이다. 대머리인 그의 뒷통수를 보면서 아마 빠따를 하도 맞아서 머리가 다 빠져버렸겠거니 생각했다.
그를 다시 본 건 몇 주 뒤였다. 역시 횡단보도에서 였지만 그는 나를 알아 보지 못했다. 처음에는 나도 그를 알아 보지 못했는데, 턱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어디서 열심히 굴렀는지 옷이 모두 얼룩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횡단보도를 마주쳐 지났지만 역시 날 알아보지 못했다.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다시 몇 주 뒤, 서류를 찾으러 1층 민원실에 내려갔다가 그를 다시 만났다. 수염은 덥수룩한데다 꼬였고, 얼굴은 새까맣게 탄 채로 거의 다 헤진 옷을 입고선 민원실 직원들을 향해 호통을 치고 있었다. " XX를 찾으러 왔다. XX는 나와 결혼할 상대다. "
이야기인즉슨, 원래 맛이 좀 간 사람인데 민원실의 직원을 짝사랑해서 잘 보이려고 항상 깔끔한 모습으로 구청에 와 추근대다가 그 여직원이 전근간 후로 완전히 사람이 거지꼴을 하고는 종종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것이었다.
그 후로 내가 구청을 떠날 때까지 그를 두 번 더 봤다. 한 번은 민원실에서 손님용 컴퓨터에 앉아 띄어쓰기도, 줄바꿈도 안 된 엄청난 분량의 메일을 쓰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만남에서, 그는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역시 횡단보도에서 였는데, 슬쩍 내 곁으로 와선 담배 한 개피를 '요구' 했던 것이다. 나에겐 그것이 '구걸'로 느껴졌는데, 그의 외모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명명백백한 거지꼴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한 개피를 꺼내 불을 붙여주었다. 그리고 1/3 가량 남아있던 담배를 모두 그에게 주고는 쫓기듯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렇게 헤어진 후 6개월 이상 구청에 다녔지만,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었다. 그가 애초에 정말 미친 사람이었는지, 여전히 구청에 찾아가 호통을 치고 수신자 불명의 이메일을 하루종일 쓰고 있는지 더 이상 알 수 없다.
갑자기 오늘따라 그가 보고 싶어진다….
그는 내 뒤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을까?
4년전, 공익 시절,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다. 말끔한 차림이었는데 구청에 일이 있어 온 듯한 모습이었다. 자못 친근한 척 굴면서 요즘 공익 생활이 힘들지 않느냐, 자기는 해군 장교 출신이며 자기 때는 줄빠따를 맞고 때리고 했다며 위로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말을 하곤 가버렸던 사람이다. 대머리인 그의 뒷통수를 보면서 아마 빠따를 하도 맞아서 머리가 다 빠져버렸겠거니 생각했다.
그를 다시 본 건 몇 주 뒤였다. 역시 횡단보도에서 였지만 그는 나를 알아 보지 못했다. 처음에는 나도 그를 알아 보지 못했는데, 턱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어디서 열심히 굴렀는지 옷이 모두 얼룩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횡단보도를 마주쳐 지났지만 역시 날 알아보지 못했다.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다시 몇 주 뒤, 서류를 찾으러 1층 민원실에 내려갔다가 그를 다시 만났다. 수염은 덥수룩한데다 꼬였고, 얼굴은 새까맣게 탄 채로 거의 다 헤진 옷을 입고선 민원실 직원들을 향해 호통을 치고 있었다. " XX를 찾으러 왔다. XX는 나와 결혼할 상대다. "
이야기인즉슨, 원래 맛이 좀 간 사람인데 민원실의 직원을 짝사랑해서 잘 보이려고 항상 깔끔한 모습으로 구청에 와 추근대다가 그 여직원이 전근간 후로 완전히 사람이 거지꼴을 하고는 종종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것이었다.
그 후로 내가 구청을 떠날 때까지 그를 두 번 더 봤다. 한 번은 민원실에서 손님용 컴퓨터에 앉아 띄어쓰기도, 줄바꿈도 안 된 엄청난 분량의 메일을 쓰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만남에서, 그는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역시 횡단보도에서 였는데, 슬쩍 내 곁으로 와선 담배 한 개피를 '요구' 했던 것이다. 나에겐 그것이 '구걸'로 느껴졌는데, 그의 외모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명명백백한 거지꼴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한 개피를 꺼내 불을 붙여주었다. 그리고 1/3 가량 남아있던 담배를 모두 그에게 주고는 쫓기듯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렇게 헤어진 후 6개월 이상 구청에 다녔지만,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었다. 그가 애초에 정말 미친 사람이었는지, 여전히 구청에 찾아가 호통을 치고 수신자 불명의 이메일을 하루종일 쓰고 있는지 더 이상 알 수 없다.
갑자기 오늘따라 그가 보고 싶어진다….
그는 내 뒤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을까?
Trackback URL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
Trackback RSS : http://www.fallight.com/rss/trackback/531
Trackback ATOM : http://www.fallight.com/atom/trackback/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