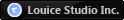모기가 난다. 아직도.
가을 모기는 죽이지 말랬다 불쌍하니까, 라는 다자이 오사무의 소설 한 구절이 생각났지만
죽였다.
귓가에서 앵앵되어 나를 잠에서 깨게 했으며 (이 정도면 죽이지는 않았다)
영원히 내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죽였다.
어제, 머리를 깎고 돈을 건네자 미용사가 하는 말,
살이 빠졌단다.
5년전부터다. 마치 주문에 걸린 사람들처럼 잠깐이라도 나를 안 본 이들은 나에게
살이 빠졌단다.
만약 실존이 여론에 의해 좌우된다면 나는 5년전부터 계속 살이 빠져 지금쯤 말라비틀어
죽었다.
그러나 오늘 미용사의 말은 조금 와닿았다. 정말 살이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근 한 달간 매일 술을 마셨다. 그 기간 술을 권하던 친구는 손이 떨려서 더 이상 못 마시겠다고 했다.
헬스를 시작한 그 친구의 금주는 일주일을 가지 못했다.
다시 술자리에 나타난 그는 술을 먹기 위해 헬스를 시작했다고 고백했다. 아 도대체 그게 무슨 논리인가, 싶지만
술이 들어가면 완벽한 논리가 된다.
티비를 돌리니 달라이 라마가 나왔다. 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뇌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인식하려 한다는 이야기였다. 자기에게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 고통을 함께 하려 한다는 것, 달라이 라마는 엉뚱하게도 그것을 용기라고 표현했다.
나는 아직도 달라이 라마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
왜 그는 술을 먹지 않는가.
Trackback URL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
Trackback RSS : http://www.fallight.com/rss/trackback/1232
Trackback ATOM : http://www.fallight.com/atom/trackback/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