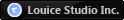자고 싶다.
그저 자고 싶다.
다싶 고자 저그.
다싶 고자.
절도를 잃은 다리는 흔들거리고
힘을 잃은 척추는 구부러지고
초점을 잃은 불쌍한 충혈안
이미 두뇌는 판단 감각을 상실 했다. (가끔 대가리, 대갈통이라 불리는 이유는 이래서다.)
자야 하는데 자야 하는데 자야 하는데 자야 하는데 자야 하는데 자야 하는데 자야 하는데 자야 하는데 자야 하는데 자야 하는데 자야 하는데 자야 하는데 자야 하는데 자야 하는데 자야 하는데 자야 하는데 자야 하는데 자야 하는데 자야 하는데 자야 하는데 자야 하는데 자아는 자야한다고 울부 짖는다.
랭보가 베를렌에게,
당신은 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지만-- 나는 시를 왜 써야 하는지를 압니다.
나는 잠을 어떻게 해야 잘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잠을 왜 자야 하는지를 아주 잘 압니다.
2005/09/04 00:03
2005/09/04 00:03
Trackback URL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
Trackback RSS : http://www.fallight.com/rss/trackback/427
Trackback ATOM : http://www.fallight.com/atom/trackback/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