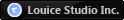브라자였어. 은색 브라자.
집에 오는 지하철 속, 22시 13분. 나를 밀치고 내 앞 구석에 비스듬히 선 아줌마. 50대일까. 60대일까. 큼직한 가죽 가방을 왼쪽 어깨에 매고 있는데, 흘러내린 가방끈 따라 어깻살이 보이더라. 그리고 그 어깻살 위로 느슨한 듯 걸쳐져 있는 끈.
브라자였어. 은색 브라자.
싸구려 큐빅이 붙은 검은 집게로 붙든 머리카락은 풀어 내리면 등까지 내려올 것 같더라. 머리가 얼마나 작았는지 집게가 무거워 보일 정도였어. 눈도 작고, 코도 작고... 어깨도 작았지. 그리고 그 어깨를 무심히 가로지르는 빛 한줄기.
브라자였어. 은색 브라자.
계속 소리를 내면서 껌을 씹더라. 가끔 조용할 때면 자기가 신은 빨간 샌들을, 빨갛게 칠한 발톱을 내려다 보고. 다시 소리를 내면서 껌을 씹어. 문이 열리고 사람이 나가고. 사람이 들어오고 문이 닫히고. 터널 속을 달리기 시작하면, 지하철 밖을 내다봐. 그러다 문득 차창에 비친 내 눈과 마주치지. 나는 시선을 피하다가 이제는 회색이 되버린 브라자 끈을 보게 된거야. 그 아줌마는 슬픈 여자니까.
TAGS 일기
Trackback URL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
Trackback RSS : http://www.fallight.com/rss/trackback/2004
Trackback ATOM : http://www.fallight.com/atom/trackback/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