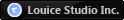<살벌한 고양이의 보은>을 읽다가 생각난 오래 전 여름.
예전 집 뒤편에 2층 사는 주인집의 작은 창고가 있었다. 공용으로 쓰긴 했지만 쓸데없는 철물이나 망가진 자전거 따위를 넣어놓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밤이면 그곳에서 가끔 고양이 울음소리가 났다. 어느 날은 대낮에 창고에서 재빠르게 나와 담벼락을 타고 오르던 도둑 고양이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바퀴벌레와 고양이, 개에게는 친절하게 말을 걸어준다. 물론 그 도둑 고양이는 내 말은 아랑곳없이 잠시 나를 쳐다보다 담 넘어 사라졌을 뿐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놈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한밤중에 다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고, 다만 이번에는 뒷편 창고가 아니라 열어 논 현관문 쪽이었다. 들어오지는 못하고 울고 있길래 왜 우느냐고 물어보았다. 대답은 야옹. 부엌에 있던 엄마가 나와서 물어보았다. 대답은 야옹. 야옹. 그러자 엄마는 현관문을 마주하고 있는 선반 뒤쪽을 뒤적이기 시작했고 곧 주먹만한 새끼 고양이 한마리가 들려나왔다.
그 일이 있은 후 창고 쪽에선 밤마다 고양이 울음소리가 났다. 낮에도 그놈은 수시로 담벼락을 타고 넘었다. 나는 어두운 창고 구석과 하수구 구멍 속에서 반짝거리는 작은 눈동자들도 보았다. 저녁마다 접시에 우유를 담아 창고 앞에 놓아주는 일이 시작됐다. 아침에 보면 말끔하게 남겨진 접시. 며칠을 그렇게 보냈다.
다소 이상한 공생이 계속되던 어느날, 학교에서 돌아와 뒷문을 열자마자 기겁ㅡ 우유 접시 놓는 자리에 쥐 한 마리가 찢어진 배를 위로 하고 널부러져 있었다! “고양이의 보은”이 바로 이런 것인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때론 진실이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그때 알았다. 그날부터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죽은 쥐 치우는 일도 해야 했다. 주로 엄마가 했다!
여름은 길었지만 우리의 공생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창고가 너무 오래돼 허물고 그 자리에 잔디를 깔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도둑 고양이에게 영원한 안식처란 없는 것. 철거가 막 시작될 무렵 접시 속 우유를 그대로 둔 채 도둑 고양이는 새끼들과 사라졌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 너무나 신속하게 조용히. 나는 그렇게 헤어지곤 했다.
예전 집 뒤편에 2층 사는 주인집의 작은 창고가 있었다. 공용으로 쓰긴 했지만 쓸데없는 철물이나 망가진 자전거 따위를 넣어놓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밤이면 그곳에서 가끔 고양이 울음소리가 났다. 어느 날은 대낮에 창고에서 재빠르게 나와 담벼락을 타고 오르던 도둑 고양이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바퀴벌레와 고양이, 개에게는 친절하게 말을 걸어준다. 물론 그 도둑 고양이는 내 말은 아랑곳없이 잠시 나를 쳐다보다 담 넘어 사라졌을 뿐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놈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한밤중에 다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고, 다만 이번에는 뒷편 창고가 아니라 열어 논 현관문 쪽이었다. 들어오지는 못하고 울고 있길래 왜 우느냐고 물어보았다. 대답은 야옹. 부엌에 있던 엄마가 나와서 물어보았다. 대답은 야옹. 야옹. 그러자 엄마는 현관문을 마주하고 있는 선반 뒤쪽을 뒤적이기 시작했고 곧 주먹만한 새끼 고양이 한마리가 들려나왔다.
그 일이 있은 후 창고 쪽에선 밤마다 고양이 울음소리가 났다. 낮에도 그놈은 수시로 담벼락을 타고 넘었다. 나는 어두운 창고 구석과 하수구 구멍 속에서 반짝거리는 작은 눈동자들도 보았다. 저녁마다 접시에 우유를 담아 창고 앞에 놓아주는 일이 시작됐다. 아침에 보면 말끔하게 남겨진 접시. 며칠을 그렇게 보냈다.
다소 이상한 공생이 계속되던 어느날, 학교에서 돌아와 뒷문을 열자마자 기겁ㅡ 우유 접시 놓는 자리에 쥐 한 마리가 찢어진 배를 위로 하고 널부러져 있었다! “고양이의 보은”이 바로 이런 것인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때론 진실이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그때 알았다. 그날부터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죽은 쥐 치우는 일도 해야 했다. 주로 엄마가 했다!
여름은 길었지만 우리의 공생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창고가 너무 오래돼 허물고 그 자리에 잔디를 깔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도둑 고양이에게 영원한 안식처란 없는 것. 철거가 막 시작될 무렵 접시 속 우유를 그대로 둔 채 도둑 고양이는 새끼들과 사라졌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 너무나 신속하게 조용히. 나는 그렇게 헤어지곤 했다.
TAGS 일기
Trackback URL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
Trackback RSS : http://www.fallight.com/rss/trackback/1808
Trackback ATOM : http://www.fallight.com/atom/trackback/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