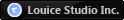학교 문예창작학과 초청으로 소설가 K가 왔다. 근래 어느 대학에 출강한다는 얘기와 함께 자기는 시를 쓰고 싶었지만 소설을 쓰게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인지 자신은 제목에 꽤 심혈을 기울인다고 했다. 지난번 국어국문학과 강연회의 소설가 P가 했던 말과 똑같았다. 그런데 실상 제목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 작가가 얼마나 될까?
자신이 하는 문학을 '순수' 문학이라면서 고정독자 만오천명을 위해 소설을 쓴다고 했을 땐 헛웃음만 나왔다. 요즘 학생들이 책을 안 읽는다고 '쉬운 소설' 부터 친구들에게 권하라는 말에선 어처구니가 없었다. 소설가 J가 D신문에 '한국 소설이 재미없다고요?' 라고 쓴 칼럼을 읽고 느꼈던 그 어처구니 없음을 그대로 K에게서 느낄 줄이야!
이 땅의 소설가들은 일반 독자들이 언제나 그들의 지고지순한 문학적 성과를 받들어줘야하고, 그들의 소설을 이해하지 못하는 독자들은 수준이 낮은 천민 대중으로 밖엔 생각지 못한다. 문단이라는 좁아터진 테두리 안에서 비평가와 작가가 그들만의 세계에서 짝짝꿍하며 서로 띄워주는 이 비정상적인 나라에서 독자는 하위층으로 계급지어졌다.
현대의 고전이라 불리는 문학은 결코 그 시대의 독자들과 괴리되어있지 않았다. 그들이 읽힌 이유는 그만큼 쉬웠기 때문이고, 그만큼 감동적이었기 때문이고 그만큼 재밌었기 때문이다. 요즘 같이 현학적이고 알아먹지도 못할 평론이 없어도 문학은 충분히 평가 받았다.
수준 낮은 독자 핑계, 감각적인 영화 핑계, 퇴폐해가는 사회 핑계…. 도대체 변명거리는 어디서 그렇게들 갖고 오는지. 소설가 답다. '순수' 문학? 요즘은 '순수' 문학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고? 아주 웃기고 자빠졌네. 자신들이 쓴 소설이나 다시 읽어보고 똑바로 본인의 주제를 아는 게 선행될 일이 아닐까.
자신이 하는 문학을 '순수' 문학이라면서 고정독자 만오천명을 위해 소설을 쓴다고 했을 땐 헛웃음만 나왔다. 요즘 학생들이 책을 안 읽는다고 '쉬운 소설' 부터 친구들에게 권하라는 말에선 어처구니가 없었다. 소설가 J가 D신문에 '한국 소설이 재미없다고요?' 라고 쓴 칼럼을 읽고 느꼈던 그 어처구니 없음을 그대로 K에게서 느낄 줄이야!
이 땅의 소설가들은 일반 독자들이 언제나 그들의 지고지순한 문학적 성과를 받들어줘야하고, 그들의 소설을 이해하지 못하는 독자들은 수준이 낮은 천민 대중으로 밖엔 생각지 못한다. 문단이라는 좁아터진 테두리 안에서 비평가와 작가가 그들만의 세계에서 짝짝꿍하며 서로 띄워주는 이 비정상적인 나라에서 독자는 하위층으로 계급지어졌다.
현대의 고전이라 불리는 문학은 결코 그 시대의 독자들과 괴리되어있지 않았다. 그들이 읽힌 이유는 그만큼 쉬웠기 때문이고, 그만큼 감동적이었기 때문이고 그만큼 재밌었기 때문이다. 요즘 같이 현학적이고 알아먹지도 못할 평론이 없어도 문학은 충분히 평가 받았다.
수준 낮은 독자 핑계, 감각적인 영화 핑계, 퇴폐해가는 사회 핑계…. 도대체 변명거리는 어디서 그렇게들 갖고 오는지. 소설가 답다. '순수' 문학? 요즘은 '순수' 문학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고? 아주 웃기고 자빠졌네. 자신들이 쓴 소설이나 다시 읽어보고 똑바로 본인의 주제를 아는 게 선행될 일이 아닐까.
Trackback URL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
Trackback RSS : http://www.fallight.com/rss/trackback/494
Trackback ATOM : http://www.fallight.com/atom/trackback/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