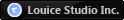|
한국문학의 깃대종 기형도, 김소진의 요절
글 |이경철_랜덤하우스코리아 주간, 문학과문화를사랑하는모임 부이사장. 1955년생.
자연 환경의 보존이나 복원의 정도를 살필 수 있는 지표가 되는 동식물을 가리키는 ‘깃대종’이란 환경용어가 있다. 반딧불이가 어둠 속 나는 것을 보고 그 심심산간은 청정지역임을 알 수 있고, 하수구 같았던 하천에 붕어 따라 피라미가 돌아온 것을 보고 그 하천은 이제 자연의 강으로 정화됐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젊은 문단에도 한국문학의 청정도를 알리는 깃대종 같은 시인, 소설가들이 있다. 발원지의 청정도 그대로 흘러 지류의 혼탁을 걸러내며 장강(長江)을 이루게 하는 한국문학의 강심수(江心水)는 고금(古今)을 초월해 오늘 이 순간에도 어느 젊은 문인의 펜 속 깊숙이 흘러내리고 있을 것이다.
1989년 3월 7일 밤 서울 서대문 네거리 적십자병원 영안실. 그날 새벽 시내 한 심야극장에서 전혀 예기치 않은 죽음을 맞이한 기형도 시인의 빈소에 문인들이 모여들어 끼리끼리 젊은 시인의 요절을 분통해하며 애꿎은 술잔만 씹어마시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젊은 문인들의 조문이 늘어 밖에 휘장을 더 쳐가며 마시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조문객들 사이로 검은 양복 정장 차림의 풍채 좋은 한 사내가 나타났다. 순간 한 시인의 입에서 “기관원이닷!”하는 외마디가 튀어나왔다. 동시에 술에 취해가던 일단의 젊은 문인들이 그 사내에게 몰려들어 ‘여기가 어딘데 감히 들어왔냐’는 듯 험악하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퍼부어댔다.
달려가 보니 당하고 있던 그 사내는 다름 아닌 박상천 시인이었다. 당시 박 시인은 시인협회 일을 맞아 열심히 순수시단 활동을 펼치고 있어 문단에 두루 안목이 있을 텐데 ‘기관원’으로 오인돼 몰매를 맞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람은 시인 아무개’라며 아무리 떼어놓고 말리려 해도 몰매질은 몇 분간 계속됐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한껏 상례(喪禮)를 갖춘 차림에 난데없는 봉변을 당한 박 시인을 휘장 한쪽으로 안내, 상을 따로 마련해 분을 삭이게 했고 몰매질에 가담한 시인들도 한둘씩 자리로 와 사과하게 했다. 그렇게 술잔을 기울이다 자정 무렵 빈소 옆 호프집으로 옮겨 자리는 계속됐다.
그곳에서 또 사단은 벌어지고 말았다. 몰매질 했던 시인들의 사과에 어떤 비아냥이 들어있었던지 분을 잘 삭이고 있던 박 시인이 이번에는 술집 집기 아무 것이든 흉기로 들고 무섭게 그들을 몰아붙여 젊은 시인들은 뿔뿔이 도망치기에 바빴다. 다시 진정, 화해시켜 기형도 시인의 빈소에서의 난데없는 난투극은 그렇게 끝났다. 그 난투극이 내겐 1980년대 젊은 문단 풍경의 한 전형이요 그런 80년대 문단 종식의 한 상징으로 기억된다.
‘억압된 현실에 찍소리도 못하는 비겁자, 군사독재정권의 어용문인’, ‘어중이 떠중이 투쟁 목소리만 높이면 다 시인이냐’는 식으로 진보와 보수로 확연히 갈려 한 술집에 같이 있으면서도 서로 소 닭 보듯 하고 수틀리면 싸움박질로 이어졌다. 독재정권에 대한 비분강개와 좌절, 그런 현실에서도 문학의 문학성, 순수는 지켜내야 한다는 다짐과 현실적 좌절감. 그리하여 괴롭고 술로 풀고 싸움질로 풀던 젊은 문단 시대가 80년대였다.
중앙일보에 입사해 타계하기 전 몇 년간 문학담당 기자였던 기형도 시인은 직무상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며 문단 사람들과 어울려 그 양 진영 문인들이 조문을 와 난투극을 벌인 것이다. 촉망받는 신예 시인, 두루두루 문단과 잘 어울렸던 젊은 시인 기자의 요절에 대한 비감이 처절한 몸부림, 울부짖음으로 화해 1980년대 젊은 문단의 외면적 풍경이었던 반목의 장은 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1주기를 맞은 1990년 3월 6일 밤 오래된 분수대가 있던 서울 혜화동 로터리 시문화회관. 젊은 시인 50여 명이 모여 8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당선된 이후 4년여의 짧은 문단생활 중 기형도 시인이 발표한 61편의 시를 모아 유고시집으로 펴낸 『입 속의 검은 잎』을 낭독하고 평가하는 그 조촐한 자리가 80년대 문단에서 90년대 문단으로 넘어가는 내면적 풍경이었음이 얼마간의 세월이 흐른 후 각인돼 왔다 .
그 모임을 주최한 단체는 기 시인도 참여했던 시동인 ‘시운동’. 광주민주화운동의 참화로 인해 시 쓰기 조차 부끄러웠던 80년도에 젊은 시인들이 모여 민중시의 격랑 속에서 시의 시성(詩性), 순수성을 힘겹게 지켜내고 있는 동인들이었다. 그리고 그 막내 격으로 기 시인이 들어와 우울하면서도 휘황찬란한 상상력과 언어로 ‘시운동’ 선배들을 뒤에서 떠밀며 순수시세계로 나아가다 요절했다.
그의 1주기를 맞아 그 말에 빚이라도 갚듯 추모 모임을 갖고 ‘시운동’ 시인들은 그 후 별다른 동인활동이 없었던 것 같다. ‘참여·진보의 진영 간, 문학·문화 장르 간 길트기’란 명분으로 몇몇 동인들은 돈과 명성을 좇아 소설로, 다른 문화 장르로 이동하며 90년대를 순수문학적인 저항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상업문단으로 치닫게 하는데 일조했다는 지적도 면키 힘들게 됐다.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 창밖을 떠돌던 겨울안개들아 /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빈집」 전문)
죽음을 예감했음인지 기 시인은 밤, 겨울안개, 촛불, 흰 종이, 눈물, 열망 등 자신의 익숙한 시적 이미지들에 이별을 고한다. 처절하리만큼 냉혹한 자기성찰로 비인간적 산업사회에서 인간성의 깊이를 지켜내던 기 시인을 떠나보내고 90년대 젊은 시단은 문학적 양심의 가책도 없이 상업주의에 함몰돼 갔다.
기 시인의 죽음이 젊은 시단의 한 분수령이 됐다면 1997년 4월 22일 소설가 김소진 씨의 34세의 갑작스런 죽음은 젊은 소설계의 한 분수령이 된 상징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91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문단에 나온 김 씨는 죽기 한 해 전 잘 다니던 한계레신문 기자직마저 팽개치고 소설에만 전념, 가장 주목받은 작가로 떠오르며 그해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도 수상했다.
스스로도 전업작가로 돌아서길 잘했다며 한 해 세 권의 소설집을 펴낼 정도로 창작욕에 불타오르던 김씨는 이듬해 초 췌장암으로 손 한 번 제대로 못써보고 “형, 먼저 가서 미안해”라는 말만 남기고 숨을 넘기고 말았다. 김 씨를 96년도 가장 주목받은 작가로 선정, 기사도 다루고 본격소설의 위의를 지켜달라고 격려했던 나 역시 그의 죽음이 쓰렸지만 내심 아프고 당혹스러웠을 사람들은 김 씨보다 앞서 전업의 길을 택한 작가들이었을 것이다.
민주화도 눈에 띨 정도로 진척되고 경제도 95년 1만 불 시대로 나아가던 1990대에 접어들자 신예작가들이 ‘이제 글만 써도 먹고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에 직장도 팽개치고 하나 둘씩 전업작가의 길로 들어섰고 김 씨 또한 그러했다. 본격소설의 위엄을 지키며 한국소설의 대들보로 떠오르던 김 씨는 선배 전업작가의 창작욕을 부추겼을 뿐 아니라 돈 등에 딴눈 팔지 말고 본격소설을 지키게 하는 하나의 항체로 작용했을 것이다.
김 씨의 요절 직후 IMF 외환위기를 맞아 경제가 거덜 나 많은 잡지, 사보 등이 폐간될 수밖에 없었다. 중앙일간지들의 연재소설 지면과 문예지의 페이지도 줄어들고 원고료도 인하돼 고료수입도 거덜날 수밖에 없었다. 거기다 뒤에서 본격문학의 양심으로 무섭게 추동해대던 김 씨마저 죽고 없는 젊은 전업소설계는 상업화의 유혹을 견뎌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요절한 예술가들은 그들의 삶이 신화화되거나 작품이 과대평가 되는 경향도 있다. 긴 생애에 변질될 수도 있는 첫 마음 그대로의 삶과 예술을 불꽃처럼 살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하면 신화화나 과대평가는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기형도, 김소진의 요절은 거기에 더해 한국문학 창작 현장을 강심수로 흘러내리며 젊은 문학의 위의를 지키게 한 문학사적 위상까지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