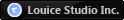결국 그들은 필요에 의해서 헤어졌다. 누구도 누구를 탓할 자격이 없다.
이상하게 화목한 이 집안은 슬픈 희극의 무대. 나는 슬프지도 웃기지도 않은 삼류, 사류 배우쯤 된다.
가을, 피부 껍질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얼굴에 난 상처들도 예전처럼 쉬이 아물질 않는다.
자꾸 입술을 물어뜯게 된다. 자꾸
노란 고무줄로 머릿단을 하나로 묶은 뒷모습을 볼 때면 왜 매번 그렇게 애처롭고 사랑스러운지.
큰 비눗방울 안에 작은 비눗방울을 만들고, 거대한 꿈속에서 아담한 꿈을 꾸었지요. 큰 비눗방울이 터지고 깊은 꿈에서 깨어나면, 작고 아담한 것들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답니다.
연필을 한 자루 쥐고는, 따박따박, “현실을 직시하다.”
TAGS 일기
Trackback URL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
Trackback RSS : http://www.fallight.com/rss/trackback/2208
Trackback ATOM : http://www.fallight.com/atom/trackback/2208